나의 아침 루틴은 커피와 체스 게임으로 시작한다. 승리하는 날은 컨디션이 좋다는 신호이므로 하루를 즐겁게 맞이하면 된다. 패배하는 날은 머릿속에 잠투정을 부리는 세포들이 증식하고 있다는 찌뿌둥함을 남긴다. 이날은 이마에 삶은 달걀을 부딪치는 벌칙을 받는다. 느슨해진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다. 게임이 잘 풀리지 않은 이유는 밤잠을 설쳐 피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스는 체중계처럼 몸을 돌보는 체크 도구로도 쓸모가 있다.
아름다운 기보를 위한 – 핸드메이드 체스
체스의 세계를 기웃거리던 초짜 시절, 안목을 기르기 위해 고수들이 득실거리는 체스클럽을 찾아갔다. 클럽에서는 당일 게임 참가비를 걸고 토너먼트가 열리는데, 상금은 우승자가 몽땅 가져간다. 굴욕적이게도 나는 첫판에 나가떨어지는 수모를 매주 견뎌야만 했다. 그러나 정작 나를 괴롭히는 것은 고급진 체스 세트였다. 시시때때로 눈에 아른거릴 뿐만 아니라 왠지 선수용으로 공부하면 금세 일취월장할 것 같은 환상에 젖어 눈을 멀게 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좀 귀찮고 수고스럽겠지만, 좀 더 멋지게 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직업병이 충동구매의 사치스러움을 제어하고 있었다. 어쩌면 내 손은 이미 만들고 싶어 근질거렸는지도 모르겠다.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뭔가를 만들 생각을 하자 작업실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도구들은 시장경제 시스템을 거슬러 보기로 마음먹은 혁명군으로 탈바꿈되었다.
‘핸드메이드’라는 세계로 들어서자 나는 또 이상한 꿈이 생겼다. 결승 무대에 오르고 싶은 욕망을 실력에서 도구로 치환한 것이다. 내가 만든 체스 세트로 결승전이 펼쳐진다면, 나도 그 자리에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할 일은 나의 미의식과 품격을 갖춘 디자인으로 두 명의 선수가 남길 아름다운 기보를 위해 기물을 만드는 것이다. 나의 체스는 선수에게 경의를 표하고 선수는 화답하듯이 신의 한 수를 찾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려볼 때마다 나는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나만의 체스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스터의 우아한 매너 – 체스 대국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새로운 디자인에 낑낑대고 있을 무렵, 운 좋게도 이란 노마딕 레지던시(2012)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란은 인도 못지않게 체스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다. 놀라운 일은, 아니 영광스럽게도 체스를 궁금해하는 한 명의 한국 작가를 위해서 이란체스협회장님이 직접 지도 대국을 해주었다. 생애 처음으로 마스터와 게임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설렘보다는 쪼그라든 심장을 감추려고 첫수를 호탕하게 두었다. 마스터의 손놀림은 슬로비디오처럼 움직였다. 어! 말을 쥐고 움직이는 손과 팔의 연속동작이 이토록 멋있을 줄이야! 좀 전의 내 움직임은 어땠지? 어린아이의 치기 어림과 허세 가득한 몸짓이 재생되었다. 아이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창피함이 몰려들었다. 마스터의 제스처는 위화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나의 세계를 존중하며 자부심을 품고 매진해온 사람에게서만 드러나는 철학, 기질, 교양, 태도 등등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두 번째 수를 두기에 앞서 말은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를 난생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손바닥에 차오른 땀방울 때문에 미끈거려 놓칠까 봐 두려웠다. 좋은 수를 찾아도 모자랄 판국에 말 하나 들어올리기가 이렇게나 힘든 일이었다니…. 나도 우아한 매너로 응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체스에 입문한 지 100일도 안 된 풋내기가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온라인 게임으로 훈련된 몸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문제였다. 그립감과 중량감 그리고 말이 판에 닿는 소리의 진동이 손마디를 타고 올라와 뇌 신경을 자극하는 사건은 잃어버린 감각일까 아니면 무뎌진 감각일까. 내 앞에 사람이 앉아있다는 조건 하나가 얼마나 인간다움을 요구하는지 잊고 있었다.
사람의 본성과 미지의 기술 – 체스 점술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길거리를 오가다가 눈에 띄는 사물 중에서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크기의 것들을 줍는 습성이 생겼다. 길바닥에 뒹굴고 있는 작고 볼품없는 것, 쓸모없는 것, 그냥 버려진 것, 하찮은 것, 무언가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 누군가에게 내동댕이쳐진 것, 경쟁에 뒤처진 것, 오래되고 낡아서 새것에 밀려난 것, 의도치 않은 사고로 부서지거나 튕겨 나간 것 등등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왔다. 대부분의 질료는 플라스틱 파편들인데 깨진 유리, 녹슨 철, 돌, 뭉개진 병뚜껑, 나뭇조각, 실, 깃털, 씨앗들로 기름때가 묻거나 흙투성이인 채로 수집되기 때문에 더러움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길바닥은 체스 신이 흩뿌려놓은 파편을 찾아 나서는 순례길로 느껴질 때도 있다. 나는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의 기쁨을 만끽하며 줍줍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고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을 줍지는 않는데, 가끔 지인들이 오다 주웠다며 선물 주듯이 건넬 땐 표정 관리가 안 된다. 나의 선택을 받는 사물들은 미미한 신음, 은은한 향기, 때론 찰나의 번뜩거림과 같은 찌름, 체념의 구호와 같은 한숨으로 말을 걸어오는 사물들이다. 한마디로 사연이 있을 법한 느낌을 받아야 구원의 손길이 닿는 것이다. 이렇게 모아 온 오브제들은 분해-조립-결합의 과정을 거쳐 브리꼴라쥬 작업으로 탈바꿈된다. 그런 다음 선반 위에 진열해 놓고 한동안 관찰과 해석의 시간을 가지며 이름을 붙인다. 예를 들면, 매일매일 폰, 톡톡톡 나이트, 실천의 갈등 비숍, 꼬리 잃은 후광 룩, 꿀렁꿀렁 퀸, 텅 빈 올가미 킹 등등. 나의 놀이는 여기까지였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세계의 문이 열렸다. 나와 오브제 둘만의 대화를 엿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체스 말의 상징과 행동 패턴이 어떻게 개개인의 숨은 이면을 들춰낼 수 있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느새 나의 체스 디자인은 ‘체스 점술’이란 상담 도구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체스 말을 펼쳐놓고 사람의 본성을 읽어내는 미지의 기술에 마음을 쓰고자 한다.

- 임체스
- 미술작가. 체스 실력은 아마추어 B급(체스닷컴 레이팅-1672)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출간물로는 체스의 예절과 이름에 관한 「귀띔 체스」, 교육예술 워크숍 에세이 「날달걀 세우기」, 탄소 저감 환경캠페인 동화 「방귀새에게 환경세 받기」가 있다. 그 외 교육예술연구팀 ‘잔꾀’ 대표, 웹진 [아르떼365] 편집위원장, 해양문화예술교육랩 ‘보물섬 영도’ 디렉터, 부천마을프로젝트 ‘볼록뽈록’ 총괄 PM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
홈페이지 zanque.modoo.at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7 Comments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코너별 기사보기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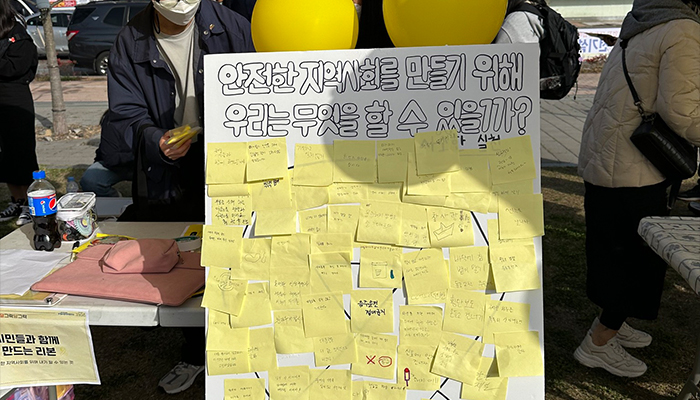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2편은 언제 뜨나요? 상담 이야기도 너무 궁금해요!!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두시면 제가
2부 체스 점술은 복채가 필요합니다 ㅎㅎㅎ
이게 뭐예요 궁금하게 ….2부 기다립니다
체스에 미친 분을 45년만에 처음 접해서 너무 신선합니다.
어릴 때 종이인형, 고무줄, 돌공기에 미쳐있던 제가 생각났어요
저도 미칠 수 있었던 인간이였네요
미칠 도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뛰어나가고 싶어지네요
한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와다다다
담엔 복채들고 갑니다요~^^
임체스님, 방귀새에게 환경세받기 동화 궁금해요 ㅋ
선생님 체스 전시회를 보고 체스점도 봤어요. 굉장했습니다. 카드 2장 뽑았는데 그 안에 제가 읽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