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입체적인 비주얼과 풍성한 사운드로 감동을 극대화하여 느끼고자 영화관을 찾는다. 그것은 때때로 영화와 영화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한 영화들이 있다.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가진 이들과 함께 즐기는 영화, 배리어프리 영화다.
얼마 전 동대문디자인프라자에 다녀왔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서울 한복판에 지은 소우주 안을 걷고 있자니 기분이 묘했다. 하지만 걸음이 계속될수록 이내 편안한 발걸음에 놀라는 순간이 찾아왔다. 유심히 살펴보니 온통 곡선으로 지어진 건물엔 ‘턱’이 없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모토로 삼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국내에 서서히 자리 잡고 있음을 체감하니, 문득 몇 년 전 한 극장에서 마주했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다. 시각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 <블라인드>의 스크린엔 평소 볼 수 없었던, 영화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친절하고 다정하게 설명하는 자막이 덧붙여졌다. 배리어프리 영화와의 첫 만남이었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말 그대로 장벽(barrier)으로부터 자유로운(free) 영화다. 여기서 장벽은 ‘비주얼’과 ‘사운드’를 가리킨다. ‘어떻게 영화가 비주얼과 사운드를 포기할 수 있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겠으나 영화를 이루는 중심축인 이 두 가지 요소가 사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님을 인지한다면 접근은 훨씬 쉬어진다.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본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겐 불가능한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 시각과 청각의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비주얼과 사운드는 넘기 힘든 벽이다.
그래서 그 벽을 허물어 주는 것, ‘모두’를 위한 영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배리어프리 영화’의 지향점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배리어프리 영화가 국내 도입된 것은 2011년, 이제 세 살배기 걸음마 단계다. 하지만 다행히도 많은 영화인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에 나서고 있어 꾸준히 제작이 진행 중이다. 현재 (사)배리어프리영화협회에서 보유한 라이브러리는 총 18편이며 현재 제작 중인 <변호인>과 <늑대아이>가 4월 중 완성 예정이니 곧 20편을 갖추게 된다.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장벽을 허무는 일이다. ‘비주얼’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성우(혹은 배우)가 영화의 흐름에 맞춰 이야기에 소리를 더하고, ‘사운드’에서 자유롭지 못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영화의 소리를 자막으로 입힌다. 비주얼을 사운드로, 사운드를 비주얼로 변환시키기 위해선 영화 텍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실제 배리어프리 영화감독을 맡은 <블라인드>의 안상훈 감독은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서 다른 차원의 재미를 전달하려고 했다.”며 제작의 변을 밝힌 바 있다.
극장에는 특별한 기운이 있다. 불이 꺼진 깜깜한 극장에 앉아 스크린이 환하게 켜지고 이야기가 들려오는 순간의 황홀경을 감히 누가 마다하겠는가. 하지만 누군가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황홀경이 누군가에겐 간절한 꿈이라는 것을 알아챌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배리어프리 영화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본격화된 지 십 년이 채 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갈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것도 많다. 무엇보다 이건 ‘복지’ 혹은 ‘서비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영화는 대중과 만나기 위해 태어난 매체다. 그러니 지금보다 더 많은 관객을 만나고자 노력하는 건, 영화라는 매체가 관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을 고민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이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도다. 지난해 한국영화 관객 수는 2억 1만 명을 돌파했다. 놀라운 수치지만 이 놀라운 수치가 ‘모두’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한다. 한 편의 영화에 수백 개의 스크린을 내어주는 극장들이 배리어프리 영화에게 상영의 기회를 넓혀주면 어떨까. 개인적 바람을 넘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간절하다.
글 이유진 (칼럼니스트)
영화 전문지 기자로 시작해 지금은 다양한 매체에 주로 영화와 공연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공연 현장에서 프로듀서를 하기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에서도 일했다. 복잡한 이력이지만 그저 ‘문화’ 안에 있으면 그만인 단순한 사람이다.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코너별 기사보기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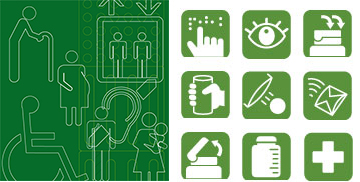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