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적이라고? 아니다. 사람들은 예술을 느끼듯 생생한 감각으로 지역을 경험하며 관계 맺기를 한다. 뇌과학자이자 신경과학자 마이클 가지니가(Michael Gazzaniga)는 인간의 뇌는 근거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결정을 다가갈까 물러날까(approach or withdraw) 모드로 검토한다.”라고 한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느끼고-행동하고-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역은 어떻게 환대해야 할까?
‘래디컬 헬프(radical helf)’ ‘래디컬 데모크라시(radical democracy)’, 경험적으로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근본을 제목으로 달고 나온 책들이 자주 눈에 뜨인다.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금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의 반증일 텐데 실제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다 보면 제자리에서 맴돌 뿐 도무지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역도 받은 기대와 우려, 가진 잠재력과 달리 적지 않게 들인 노력이 무색하게 수도권 밖은 ‘지방소멸’이란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럴 때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지역이 지역인 이유?’ ‘지역이 있어야 할 이유?’를 궁리하며 근본(시원 始原)으로 돌아가 보는 래디컬 지역(radical region)이 필요하다. 세상 중요한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맞춘 행정구획선이나 연구자들의 현학적인 수사를 지우면 지역은 생명활동(생활)의 장(場)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은 지역을 구성하는 고유한 풍토(자연환경)와 제도(사회환경) 안에서 순환성, 관계성, 다양성을 지키며 살아왔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역은 생명활동의 장이다. 다만 시간으로부터 분리된 평면적인 2차원의 공간이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시간의 경험들이 공간으로 연결되며 새로운 시공간이 비선형적으로 융합된 입체적인 3차원의 세상이다. 어렵다면 지역은 복잡하다고 얘기해도 된다. 정말 지역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 사이만큼의 복잡계(complex system)로 작동된다. 이렇게 지역의 복잡계가 만들어낸 기본적인 식·의·주부터 확장되는 삶의 양식이 지역마다의 고유한 문화다. 삼척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성된 문화와 진안 느릿한 햇살로 생성된 지역문화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은 고궁(古宮)과 고층건물 틈으로 생성된 나름의 문화가 있다.
예술가가 등장하기에 적절한 때가 되었다. 오랜 시공간을 지나며 삶의 양식으로 형성된 지역문화는 닫힌계이면서 고정계로 고유한 자기만의 특이성을 갖게 된다. 익숙하고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역설이지만 이때부터 지역은 예술과 함께 혼란을 즐기며 다시 변화의 기회를 받아들여야 한다. 예술가들은 익숙한 지역문화를 해체하고 해체된 지역문화의 조각들과 교합하며 지역문화 창조자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 그들은 내면의 자유와 영성의 명령에 따라 창작하는 존재다. 그래서 어디서든 내용과 형식에 구분 없이 창조하지 않는 예술가들은 있을 수 없다. 예술가들은 아무렇지 않게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쇠락에 익숙한 지역을 매력적인 지역으로 재배치한다. 이래야 하는 것에 매이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경계를 허무는 초 맥락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향토적인 맥락만은 감각적으로 끌어와 과거로부터 꾸준히 지켜오면서 미래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어센티시티(authenticity, 진정성)를 펼쳐낸다. 예술가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아이디어로 매력적인 지역을 재창조해 내는 즐거운 시지프스(Sisyphus)일지 모른다.
지역문화와 예술은 분절(分節)도, 수평적이지도 않으면서 어울리듯 안 어울리는 상호보합적인 순환의 기본관계축이다. 예술가가 고정된 틀(frame)에서 벗어나는 탈 동조화(同調化)의 본능에 따라 다른 상상력으로 변화의 틈을 만든다면 문화는 변화의 틈을 넓히고 이 사이에서 생겨나는 흐름들로 새로운 지역 문화양식을 구조화한다. 구조화된 문화는 다시 다른 상상력을 가진 예술로 해체되고 문화도 재구조화하는 차이 나는 반복 순환으로 나선형의 진화를 해간다. 이럴 때 한 지역은 지역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생동할 수 있다. 문화와 예술은 차이가 있지만 부즉불리(不卽不離)다. 이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술교육은 구조화된 지역문화 패턴에서 특이점들을 재발견하고 이 특이점들을 재배치하며 지역을 재발명할 수 있게 감각의 날을 벼려야 한다.
지역을 재발견하는 안내
관성적이면서 복잡다단한 지역문화(생활양식)의 패턴 안에서 규칙적인 맥락(context)과 규칙에서 탈주하는 특이성(singularite)을 포착해내는 일이 ‘발견’이다. 발견은 지역문화의 문제 및 기회가 되는 잠재성과 현실성을 드러내고 발명을 위한 ‘우연한 사건’이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을 디자인할 수 있게 한다. 발견의 능력은 이론적 학습과 함께 경험적 학습의 병행으로 양성되는데 중요한 건 학습 과정에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같은 사고의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
인사이트(insight)는 통찰력이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닌 행동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일이다. 인사이트를 위해 우리는 ‘왜(why)’라는 질문의 답에 다시 ‘왜’라는 질문을 하는 ‘5번의 왜’로 부르는 방법을 사용한다. 마이닝(mining)하듯 문제의 본질로 접근하는 것이다.
정리된 자료에 앞서 지역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오감으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자료에는 정보는 있지만 비릿한 공기도 없고 제각각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을 떠난 발견은 있을 수 없다. 낮과 밤의 지역이 다르며, 흐린 날과 맑은 날의 지역도 다르다.
관찰은 발견의 중요한 도구이다. 감각적 경험과 인사이트를 잇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행동을 관찰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관찰하기도 한다.
질문이 활동의 방향과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터뷰는 질문 이상으로 인터뷰어의 태도가 중요하다.
지역을 재발명하는 안내
발명은 논리적이나 단계적으로 기획되지 않는다. 마케팅이 약 20년 전 영감(inspiration)을 아이디어 발상 방법으로 채택하고 경험과 공감(empathy)으로부터 시작하는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모델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아르키메데스(Archimedes)의 ‘유레카!’의 순간처럼 발명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건처럼 다가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연한 디자인’의 순간을 위해 최적의 환경을 준비하는 일이다. 혼돈적 질서인 카오스모스(chaosmos)를 위해 익숙한 배치를 재배치로 바꿔놓고 예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 순간을 기다리면 된다.
의도적으로 모든 상황(공간, 시간. 관계, 의미 등)을 낯설게 배치(agencement)한다. 배치는 관계망이며, 내가 선 자리이다. 배치는 위치, 자리, 위상, 동선, 배열 등과 같으며 장소, 관계, 의미가 만든 자리이다. 배치는 자리바꿈을 통해 재배치될 수 있다. 배치의 강렬도가 높아지면 색다른 생각이나 아이디어, 실천할 의지가 생기고, 배치에 기반해서 말과 행동이 나온다.
쉽게 바뀌지 않는 사고의 틀을 해체하기 위해 극단적 결합(radical collaboration)을 계획적으로 강제한다. 학습된 맥락과 인과(因果)에 익숙한 사고에 대항하기 위해서이다. ‘8월의 크리스마스’와 같은 비상식적인 관계를 설정하여 초 맥락적 스토리를 구성하기를 요구한다.
집단관계 속에서 아이디어가 생성되는 서클(circle)을 활용해 발상부터 결정, 개선, 포기, 타협 등 전 과정을 개인과 팀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한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한하고 멘토와 코치, 참가자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픽사(Pixar)의 회의방식인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 ‘Yes, And’ 모델을 사용한다.
팰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의 거리조절의 미학 ‘횡단성(橫斷性) 계수’를 적절히 사용한다.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지도 않은 횡단성 계수를 활용해 참가자들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적당하게 거리를 조절하며 끊임없이 ‘무엇(what)’이 아닌 ‘어떻게(why)’를 묻고 단일한 지침이 아닌 복수의 의견을 제시한다.
더 늦지 않게 예술로 지역마다 특이한 장소애(topophilia)와 장소감(sense of place)을 생성해야 한다. 예술교육은 무뎌진 감각의 끝을 곧추세우는 일이다. 욕망의 껍질은 서울을 향하더라도 깊은 욕망은 지역 고유의 아름다움과 공명을 원하고 있다.
- 이무열
- 20여 년 마케팅 경험으로 전환 담론을 실험하는 전환스튜디오 ‘와월당(臥月堂)’에서 지역, 문화, 생업을 주제로 『지역의 발명』 『예술로 지역활력』(공저) 『전환의 시대 마케팅을 혁신하다』 『협동조합 마케팅기술』 『돌봄의 시간들』(공저) 등의 글을 쓰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특히 예술가들을 추앙하며 이들과 함께하는 작업을 즐긴다. 무엇보다, 내일만큼 아름다운 오늘을 살고 있다.
happyyeori@gmail.com
페이스북 @happyyeo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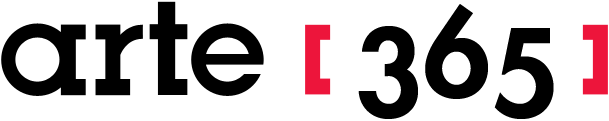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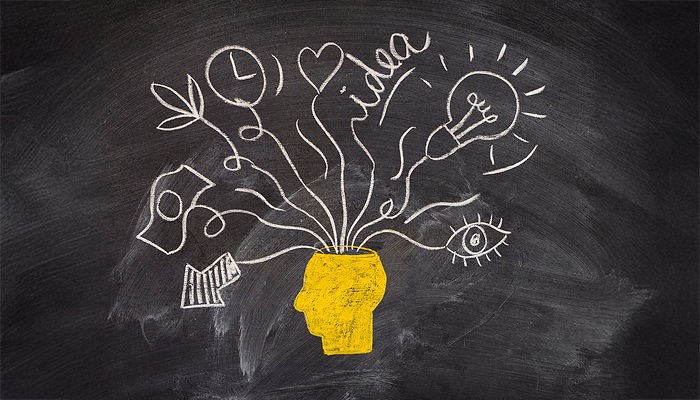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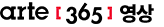
이 짧은 글에 지역을 이렇게 깊게 설명하다니… 많이 배우고 공감합니다.
와~ 글이 너무 좋습니다.
느낌 있는 예술이 지역을 구원하리니
감각적으로 생성되는 지역의 고유성
공감이 갑니다
느낌 있는 예술이 지역을 구원하리니
감각적으로 생성되는 지역의 고유성
기대만점입니다
풍토에서 축적된 삶의 지혜는 지역의 문화가되어 독자적인 개성으로 자리잡았다. 그 깊이와 다양성을 예술이라는 방식으로 소통하면 어떨까. 판에 박힌 나열에서 벗어나 몰랐던 지역의 맥락과 축적에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로컬의 새로운 관광이 예술을 만나 새로운 앎과 발견을 가지게 되는 날을 기대하며. 좋은 글 나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