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시업(push-up)은 몸을 엎드려 팔을 굽혔다 펴기이고, 스쿼트(squat)는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 동작이다. 어떤 느낌이 떠오를 듯 말 듯 할 때, 생각이 복잡해서 정리가 잘되지 않을 때,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푸시업이나 스쿼트를 한다.
익숙하면서도 정교한 움직임
양손, 양발로 바닥을 짚고 몸통을 곧게 펴서 엎드린 후 크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잠깐 숨을 참으며 팔을 굽혀 몸을 낮춘다. 다시 팔을 펴면서 숨을 길게 후~ 하고 내쉬며 원래 자세로 돌아온다. 여덟 번이나 열 번 아니면 열두 번 정도씩 컨디션에 따라 무리하지 않는 정도로 푸시업을 하고 나면 얼굴이 살짝 빨개지면서 몸 한구석에서 멈춰 있는 듯했던 혈액이 다시 돌아 머릿속까지 산소가 풍부해진 기분이 든다. 스쿼트는 푸시업보다 집중해서 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기 전까지 수십 번을 반복하는 ‘앉았다 일어나기’는 너무 익숙해서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의외로 정교한 움직임이다. 먼저 양발을 골반너비로 벌린 후 발끝을 브이(V) 모양으로 만든 후 고관절과 무릎을 동시에 접어 앉는다. 이때 양 무릎은 발바닥과 같은 브이(V) 각도로 벌리면서 앉아야 한다. 무릎이 발바닥 간격보다 좁게 오므라지거나 하면 괜히 무릎만 아플 수 있으니, 두 번째나 세 번째 발가락 방향 정도의 넓이로 무릎을 벌리며 앉으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일어날 때도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무릎을 펴면서 일어난다고 여기지 말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일어난다고 여기는 게 좋다. 뒤꿈치나 발가락이 바닥에서 뜨지 않게 꾹 누르면서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잘 앉았다가 잘 일어나는 데만 집중하여 몸을 움직이고 난 후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내가 써 둔 걸 보면 수사 가득한 말의 향연뿐인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푸시업과 스쿼트를 하며 내 감수성과 사고를 명료하게 하는 습관을 갖게 된 건 ‘운동 트레이너’라는 업 덕분이다. 나는 현재 문화기획자이자 운동 트레이너라는 두 가지 직업을 병행하고 있다. 먼저 시작한 건 문화기획 일이다.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정책의 한 분야로 수립하는 업무가 출발점이었으니, 문화기획자로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아 왔다. 맡은 일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공정책에 관여할 때 행정력보다는 기획력이 반 발짝 정도라도 앞서야 한다. 특히 새로 기틀을 닦고, 정책 방향에 맞는 신규 사업을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당위성을 서술하고, 그에 따른 사업 내용을 제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짜서 실행하기를 수년간 반복했었다. 이 경험을 살려 정부나 지자체가 새로 추진하는 정책사업 기획이나 연구, 기업 사회공헌사업 기획을 꾸준히 해 왔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의구심이 들었다. 실제보다 말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지향점에 비해 구체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 사업을 하면 진짜로 모두에게 좋고, 어떤 분야의 ‘생태계’가 ‘구축’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어떻게 좋았던 건지 불분명한 채 ‘의미 있었다’로 결론 내는 사업을 하느라 쓰는 거창한 표현들이 내 몸을 꽉 채울 것 같았다. 실체를 좀 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움직이며 체득한 감각
아, 그럼 몸 쓰는 일을 하자. 뭐가 있지? 도배? 전기? 요리? 나한텐 어림없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문턱이 낮아 보이는 일로 선택한 것이 운동 트레이너였다. 지금 와 말하건대, 해부학·생리학·운동 역학·영양 등 공부할 게 끊임없이 있고 몸에 익혀야 할 동작이 수도 없이 있다는 걸 당시 알았다면 그냥 하던 일이나 계속하자고 했겠다 싶긴 하다. 웨이트 트레이닝법을 배웠고, 다행히 회원으로 운동을 했던 곳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내 몸이나 다른 사람의 몸을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일을 마치고 나면 기획자 모드로 전환해 책상에 앉아 문서 작업을 하거나 회의를 했다. 그렇게 두 일을 오가다 보니 뜻밖의 효과가 나타났다. 앉았다 일어나기를 잘하는 데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 뇌에 어떤 여유 공간이 생기는 기분이 들곤 했던 것이다.
꽤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할 일을 쉽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겉으로 보이는 데 신경 쓰느라 본질을 놓치진 않았는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해야 할 일을 한두 번 만 해도 될 듯이 구상한 건 아닌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번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역으로, 매번 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데 마치 차이가 있는 듯 말하고 있진 않은지. 몸을 움직이다 보니 자연스레 체득하게 된 감각이 프로젝트 기획을 할 때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되어 생각의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그때부터 책상에 앉아서 일하다가 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거나 이건 아닌 거 같다 싶으면 푸시업과 스쿼트를 했다.
사실 이 글을 청탁받기 전까진 푸시업과 스쿼트를 ‘감성’이라는 단어와 연결 지어 본 적은 없다. 서로 반대말에 둬야 할 것 같은 느낌의 이질적 조합 아닌가. 하지만 “자극에 대하여 느낌이 일어나는 능력”이라는 사전 뜻풀이를 찾아보고 나니, 푸시업과 스쿼트야 말로 나의 감성템이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나 행위를 보다 선명히 하기 위해 나에게는 푸시업과 스쿼트가 필요하고, 이 글을 쓰는 중에도 이미 푸시업을 여러 차례 했더랬다.

- 달라라
- 본명은 서민정이며 운동 트레이너와 문화기획자 두 업을 같이 하고 있다. 예전에는 가장 지루하다고 여겼던, 단순한 사고와 반복적 행동이 주는 가치를 매일 새롭게 깨달아 가는 중이다.
dahllala@dahnsoon.com - 사진제공_달라라 문화기획자·운동 트레이너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6 Comments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코너별 기사보기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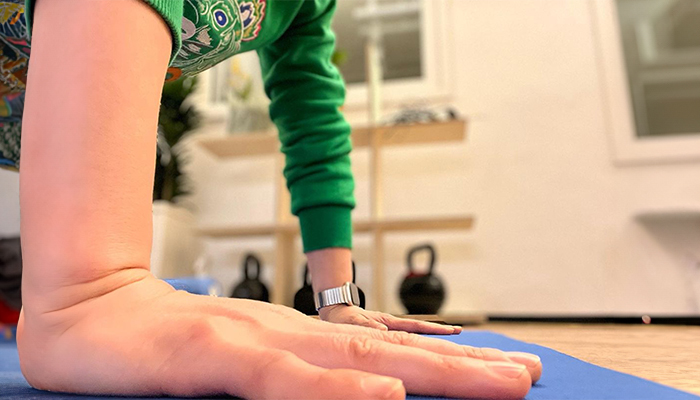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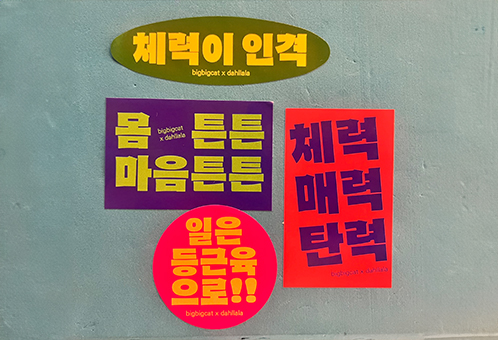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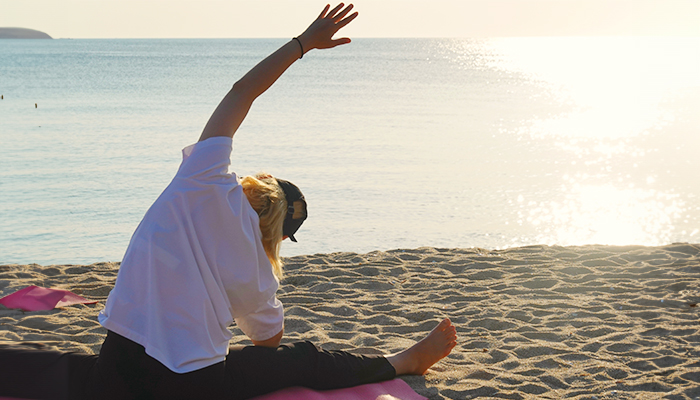










푸시업과 스쾃!! 멋지네요~!! 저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다짐이 듭니다~!!
나를 명료하게 하는 동작
예술가의 감성템⑲ 푸시업과 스쿼트
공감이 갑니다
나를 명료하게 하는 동작
예술가의 감성템⑲ 푸시업과 스쿼트
기대만점이네요
실제보다 말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지향점에 비해 구체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대박…
그 시절^^ 탕샘과 함께 뵈었던 서민정선생님! 시원한 웃음이 그대로시네요!^^ 너무 반가워 미소짓고 지나갑니다~
기획의 틀을 의심해 보는 시간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