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변화 과정이 놀랍다. 인간의 창의력은 호모 사피엔스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너지고 있다. 알파고에서 시작된 충격은 미드저니(Midjourney)나 챗GPT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고 있다. 생각하는 능력을 넘어서 창조력, 심지어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역량까지 인공지능이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조물’을 인간의 것과 구별하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질 것이다.
인간의 자리는 어디일까? 이 자리를 찾기 위해 ‘인간’이 상투적으로 집착하는 말이 있다. ‘절대’다. 동물이 ‘절대’ 못하는 것. 인공지능이 ‘절대’ 못하는 것. 심지어 인간은 신이 ‘절대’ 못하는 것을 찾아서 인간만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했다. 그 인간만의 자리가 바로 다른 종들은 넘보지 못할 인간만의 고유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인간만큼 ‘고유성’이라는 말에 집착하는 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다.
잠시 우회하여 설명하면 신과 비교할 때 인간만의 고유성은 ‘결핍’이었다. 그러자 신과 인간의 지위와 역전되었다. 충만한 자인 신이라는 존재가 결핍을 결핍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결핍은 결핍보다 더 문제적인 결핍이 되었고 급기야 신은 인간을 질투하게 된다. 결핍 없이 충만한 신으로서는 인간이 결핍으로 누리는 사랑과 같은 충만함을 결코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 순간 만족만을 아는 신은 동물과 동등한 존재로 추락하게 되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인간 고유성의 핵심이었다. 언어로 한순간에 존재를 역전시켜버리는 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이다. 신을 동물로 동급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충만함을 ‘결핍을 결핍한 것’으로 정의(define)하는 언어의 힘이다. 물론 이때 언어의 힘이란 그저 말이나 고립되거나 파편적인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하는 힘, 그것도 개념을 정의하여 존재를 포획하는 것을 말한다. 충만함을 ‘결핍의 결핍’으로 개념화하여 정의함으로써 그 존재를 동물과 같은 위상으로 포획해버리는 것이다.
‘아직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은 이 언어 구성력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다. ‘단적으로 큰’ 언어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문장을 구성한다. 질문을 구성하는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 그리고 C라는 단어가 병렬될 때 확률적으로 어떤 배치가 가장 많은지를 찾아내어 문장으로 생성해낸다. 인공지능이 참조할 수 있는 문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압도적이다. 물론 그 뒤에 더 유려한 문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저개발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인간의 개입’이 있지만 말이다. 언어를 생성적으로 구성해낼 수 있다는 것은 개념 정의를 통해 존재를 역전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물론 ‘아직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문장 구성의 효과로 그렇겠지만 말이다.
언어 생성에 인공지능이 밀고 들어온다면 인간의 고유한 자리는 어디일까? 창의력의 자리에 이어 창의력에 대한 개념 정의의 자리, 인공지능이 개념 정의를 효과라는 측면에서 생성해낼 수 있게 되면 인간의 고유한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사실 문화예술계에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직접 위협받는다고 말하는 ‘창의력’의 문제보다 이 ‘개념 정의’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 더 근본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자리에 대한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인간의 자리를 신이든 동물이든 기술이든 그들이 ‘절대’ 못하는 것에서 찾았다면 지금부터는 인간의 자리를 그들이 ‘아직은’ 못하는 것에서 찾으면 어떤가. 대화형 인공지능은 질문에 대해서는 인간을 뛰어넘는 답변을 생성해내고 있지만 ‘아직은’ 질문에 대해 머뭇거리고 있거나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을 걸지는 못한다. 즉 질문된 것에 훌륭한 답변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아직은’ 인간에게 말을 거는 존재는 아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말이다. 인공지능은 ‘아직은’ 인간의 침묵에 먼저 말을 걸지 못한다.
이 ‘아직은’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인간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한다. 해야 할 것이 바로 눈에 보이니까 말이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과제를 낼 때 미드저니나 챗GPT를 얼마나 참조했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챗GPT에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과 자신이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보는 것은 ‘아직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는데요?”라고 할 때 “자, 네가 모른다고 말하는 그 ‘하나’가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보자”라고 말을 거는 것은 ‘아직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곧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비어있는 자리
미디어에 대한 이해는 아마도 이런 점에서 가장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시각적 매체이건 혹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건 ‘아직은’ 그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기술 사이에 있는 인간들끼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기술/기계가 아직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기계와 내 ‘관계’가 아직 못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전자로만 본다면 그것은 기술/기계의 문제이지만 후자로 본다면 그것은 ‘관계’의 문제이며 여기서 아직 대체되지 않는 ‘관계’로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와 인간 사이에서 아직 미디어(매개)되지 못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에서 아직 미디어가 인간과 미디어(매개)되지 못하고 아직 인간의 자리로 비어있는 것이 서로에게 ‘신중한 독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문제가 첨예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배움의 과정이 개별화되면서 문화예술교육에서 합평 형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학생들은 합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디어 등이 다른 사람에게 도둑맞는 것을 두려워하여 공개적으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피하려는 경향도 있다. 더하여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교육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개별화됨으로써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만’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인간 자리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지만 시장의 영역에서 ‘신중한 독자’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그 자리는 즉각적인 소비자들이 대체하였다. 이 소비자들은 작품을 스낵컬쳐(snack culture) 상품으로 소비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신중함도 보이지 않는다. 조금만 이야기가 지체되는 느낌만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돌변하여 공격하며 작품을 ‘망친다’. 서사 구조의 치밀함을 위한 전개는 ‘고구마’이며 돈을 벌기 위한 늘리기 ‘수작질’로 비판한다. 여기에는 그 어떤 ‘신중함’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라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신중한 독자가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관계는 다른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신중한 관계’다. 신중한 독자들끼리의 대화는 작품에 대해, 그리고 작품을 통해 서로를 타자로 발견하게 한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타자를 타자화하거나 혹은 손쉽게 자기 앎으로 타자를 동일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타자성을 발견하고 존중하게 한다.
창작자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창작자들이 서로에게 신중한 독자가 되는 관계를 교육 현장에서 구축해야 한다. 이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는 급속도로 사라지고 인간과 기술/기계의 관계에서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자성의 사이가 아니라면 문화예술이 숨 쉴 곳이 어디란 말인가?

- 엄기호
-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며 그 기쁨에 보탬이 되는 것이 사람의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고 믿는다. 사람의 성장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가장 끔찍한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저서로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단속사회』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등이 있다.
uhmkiho@gmail.com
1 Comments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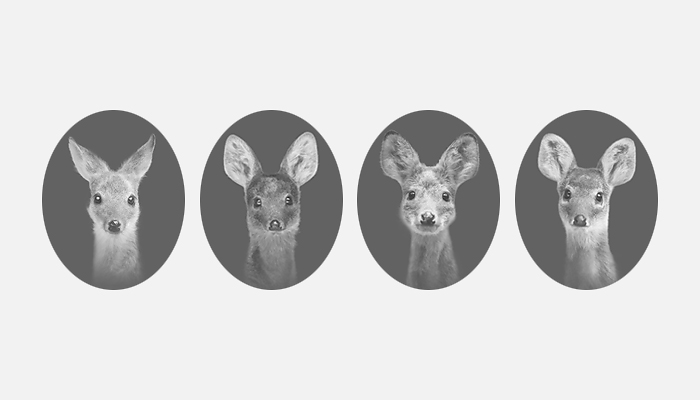




글 좋네요….저는 ‘반려의 감각’이라고 표현 하는 지점을 ‘신중한 독자’ 라고 표현하셨는데 의미가 닿아 있어 보입니다….언제 한번 뵙고 싶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