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프랑스의 퐁텐블로 성에서 경매가 개최되었습니다. 관심의 대상은 숫자 암호 편지이었습니다. “10월 22일 오전 3시에 크렘린을 폭파하라.”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편지를 차지하려는 프랑스와 러시아의 수집가들의 치열한 경쟁 끝에 문제의 서신은 18만7500유로(2억6400만원 상당)에 낙찰되었습니다. 예상가의 10배를 훌쩍 뛰어 넘는 가격이랍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편지의 값어치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프랑스 군대의 러시아 원정 상황이 담긴 편지 내용의 기록적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려한 필체로 서신을 써내려 간 작성자이었습니다. ‘나프(Nap)’라 편지에 서명한 장본인은 ‘전쟁 영웅’, 나폴레옹이었거든요. 그는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으로 불리기도 하는 다비드(Jacques-Louis David, 1748~1825)의 〈성 베르나르 협곡을 넘는 나폴레옹〉을 통해 모습이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위풍당당한 주인공 나폴레옹의 모습 때문일까요. 다비드 그림은 영웅이 만들어 낸 기념할 만한 역사의 한 순간을 거짓없이 담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이 그림은 화가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알프스를 넘을 당시 나폴레옹은 백마를 타지도, 선봉에서 부대를 진두지휘하지도 않았답니다. 농부가 이끄는 노새를 타고, 부대의 후위에서 알프스를 넘었다지요.
다비드는 프랑스 혁명기 활약했던 정치적 성향이 강한 화가였습니다. 혁명 정부에 관여하면서 그는 국민공회 의원 자격으로 루이 16세의 단두대 처형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에 가담했던 인물이었지요. 그런 그는 미술을 통해 시민의 교화를 꿈꾸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실을 기록하고자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그림이 관객들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했지요. 이를테면 그가 원한 것은 그림을 본 관객들이 스스로 파편화된 개인이 아니라 정치적 혼란기 공동체의 의식 있는 일원임을 자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웅, 순교자, 희생자 등. 다비드는 자신의 예술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상화된 존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나폴레옹을 그릴 당시 노새보다는 백마가, 전투의 후위보다는 선두가 위엄 있는 정복자의 모습을 더 설득력 있게 관람자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결핍과 단점을 지워 버린 영웅들이 등장하는 그림들은 다비드에게 ‘권력의 정당화에 붓을 사용한 화가’라는 오명을 안겨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과 별개로 〈성 베르나르 협곡을 넘는 나폴레옹〉은 ‘뛰어난 지혜와 재능 그리고 용맹함으로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 낸 사람’이라는 영웅의 사전적 정의를 붓으로 구현해 낸 것만 같습니다.

나폴레옹의 미공개 편지와 〈성 베르나르 협곡을 넘는 나폴레옹〉을 오가는 중에 몇몇 인물들을 떠올렸습니다. 다비드 그림의 또 다른 주인공들이기도 한, 원칙을 깨지 않기 위해 흐트러짐 없이 독배를 들이키는 소크라테스나 공화정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아들의 사형을 명한 브루투스가 떠올라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 속을 쏜살같이 스치고 지나간 것은 친정 엄마, 경비아저씨, 한 남학생이었습니다.
의외의 인물들이 영웅을 생각하다 떠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제 삶은 평범했습니다. 빛나는 업적도 뚜렷한 성취도 없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위기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없이 기권을 외치며 삶의 무대에서 뛰어 내려 오고 싶기도 했고, 어김없이 사소한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가차 없이 하찮은 일에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그 때마다 제 삶 앞에 특별한 것들이 놓여 졌습니다.
패배를 인정해야 했던 순간 친정 엄마가 손에 꼭 쥐어주었던 숟가락,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휘청거릴 때마다 경비 아저씨가 말없이 열어주었던 아파트 현관문, 여섯 시간 동안 추위 속에 강행해야 했던 강의 중간 한 남학생이 쑥스럽게 건넸던 손난로.
또 패배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나갈 용기, 다시 버거움을 견뎌보고자 하는 다짐,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짠~’하고 제 앞에 나타나 도움을 주고 수줍게 사라진 주변인들이 없었다면요.
역사가 아닌 제 삶의 현장을 따뜻하게 했던 영웅들을 떠올리며 기분 좋게 새 해를 맞이했습니다. 강력한 초능력도, 특별한 코스튬도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 가치를 나누고자 하는 이웃들이 곁에 있다면, 또 누군가에게 그런 지인으로 남는다면 값어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불가능’만 가득한 사전을 들고 살아야 할 올 한 해도 말입니다.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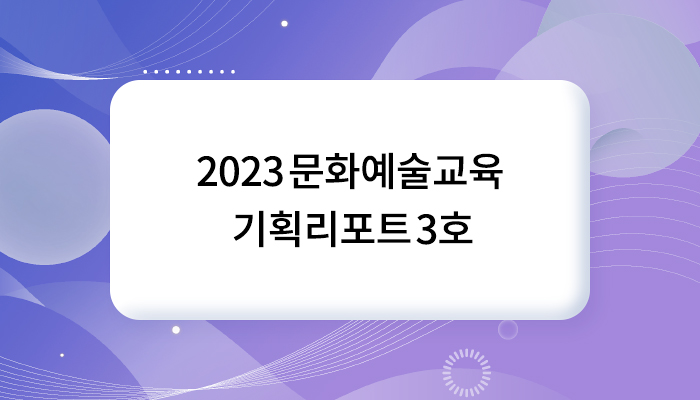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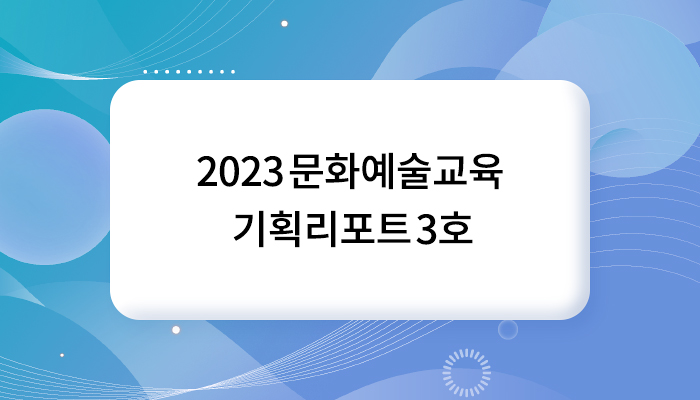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