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사에 대해 그 고장의 신령에게 물어보라(Consult the genius of the place in all).” 영국 시인 알렉산더 포프(1688-1744)가 어느 시에서 표현한 말이다. 알렉산더 포프가 언급한 ‘신령’이라는 말은 이른바 주술성의 의미를 강조한 맥락이 아니라 지역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며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 언명으로 보아야 옳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주민 주도성을 강조하는 자발적 ‘문화자치’ 공동체의 형성과 강화가 정책사업의 새로운 화두라고 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을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 사는 지역에는 문화 인프라가 절대 부족하고, 인적 자원 또한 결여되어 있는 ‘결핍의 공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사는 지역을 개조(改造)해야 하는 공간으로만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역을 이런 시각으로 보려는 관점으로는 지역을 제대로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구현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또한 공급자의 시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구나 안전한 마을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런 안전한 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 중앙정부/지방정부에 의해 행정이 투입되고 재정이 집행되는 정책사업으로 절대 구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을 비롯해 지역에서 구현되는 정책사업을 진행할 때 “마을은 사람이다”라는 관점으로 전환을 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하나 흥미로운 점은 스페인어 푸에블로(pueblo)라는 말은 원래 ‘마을’을 뜻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중의 의미를 품고 있는 푸에블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풀어보자면 “마을은 마을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함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셈이다. “마을은 사람이다”라는 명제는 지역의 결정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사가 십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발효(醱酵)될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하며, 그런 관계의 발효는 결국 시간 속에 의미를 넣는 숙성의 과정에서 생성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출간된 『시가 뭐고?』에 이어 칠곡 할매들이 쓴 시집 『콩이나 쪼매 심고 놀지머』와 월간 [전라도닷컴] 발행인인 황풍년이 16년간 전라도 오일장 등지를 누비며 기록한 『전라도, 촌스러움의 미학』은 “마을은 마을 사람이다”라는 명제에 값하는 훌륭한 텍스트라고 확언할 수 있다.
70~80대 칠곡 할매들이 쓴 시집 『콩이나 쪼매 심고 놀지머』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흙의 리듬에 맞추어 산다는 것이 갖는 유구한 문화적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시집이다. 시집 속 할매들의 삶이 ‘살아남기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기의 시간’을 보여주는 시집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또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나는 특히 신위선 할매가 쓴 시 「봄이 오는 소리」에서 그런 징후를 보게 된다.
봄이 오는 소리에 놀라
씨감자가 뿔이 났어요
밭에다 심었더니
새삭이 잘 자랏다
연보라색 꽃이
예쁘게 되었다
다 자랏다는 신호인 것 같다
토실토실한 감자가 얼마나 열였을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다
_ 신위선 시 「봄이 오는 소리」 전문
씨감자가 뿔이 났어요
밭에다 심었더니
새삭이 잘 자랏다
연보라색 꽃이
예쁘게 되었다
다 자랏다는 신호인 것 같다
토실토실한 감자가 얼마나 열였을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다
_ 신위선 시 「봄이 오는 소리」 전문
신위선 할매가 쓴 표기법을 그대로 살린 위 시에서 “봄이 오는 소리에 놀라 / 씨감자가 뿔이 났어요”라는 구절이야말로 땅에 뿌리박고 평생을 살아온 농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생생한 표현이다. 그것은 일종의 ‘씨감자-되기’의 입장이라고 간주해야 옳을 터이다. 이처럼 할매들이 쓴 시집에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생활인으로서의 당당한 욕망을 엿보는 것은 어렵지 않으리라. 이런 당당한 삶의 태도는 도시에 사는 할매/할배들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점이다. 어쩌면 할매들은 칠곡 땅의 ‘신령들’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하리라.
황풍년의 『전라도, 촌스러움의 미학』은 16년간 전라도 오일장 등지를 누비며 순정한 전라도 이야기를 채록한 우리 시대의 패관(稗官)문학이다. △전라도의 힘, △전라도의 맛, △전라도의 맘, △전라도의 멋이라는 네 개의 범주로 묶은 이 산문집은 우리 시대 ‘지역연구’의 모범이 될 만한 책이랄 수 있으며, 이 이야기들을 채록한 황풍년은 당대의 패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으리라고 확언한다. ‘촌스러움’에 바치는 헌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을 보며 나는 지역은 위정자들의 눈이 아니라,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역설한 바 있는 ‘낮은 이론가’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제대로 보인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낮은 이론가는 누군가의 사연을 잘 헤아려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3부 전라도의 맘과 4부 전라도의 멋에 수록된 글을 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묵직한 감동을 받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남 순천 왕대마을에 사는 팔순의 윤순심 할매가 구술(口述)하는 내용은 지역을 누구의 눈으로 보고, 지역에서 일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귀한 가르침이라고 단언한다.
“우리 손지가 공부허고 있으문 내가 말해. 아가,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다 도둑놈 되드라. 맘 공부를 해야 헌다. 인간 공부를 해야 헌다, 그러고 말해. 착실허니 살고 놈 속이지 말고 나 뼈 빠지게 벌어묵어라. 놈의 것 돌라먹을라고 허지 말고 내 속에 든 것 지킴서 살아라. 사람은 속에 든 것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벱이니 내 마음을 지켜야제 돈 지키느라고 애쓰지 말아라.”
그렇다. “사람은 속에 든 것”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법이다. 그리고 우리 사는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알알이 박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을 비롯해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교육철학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단순한 기능주의자가 아니라 의미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는 진실인 것이다. 고등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똑똑한 나쁜 놈’이 되어버리는 지금의 근대교육 시스템 너머를 상상하며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으며, 그런 사람들의 사연을 청취하려는 활동들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황풍년이 시골 장터를 누비며 이 땅에 사는 장삼이사들의 삶에 주목한 이유가 여기 있을 법하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을 비롯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두 권 책을 나침반 삼아 마음 공부, 인간 공부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미지 제공 _ 삶창, 행성B잎새

- 고영직
- 문학평론가. 문화예술교육 웹진 [지지봄봄] 편집위원을 역임했으며, 경희대 실천교육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자치와 상상력』(공저)이라는 책을 펴냈다.
gohyj@hanmail.net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코너별 기사보기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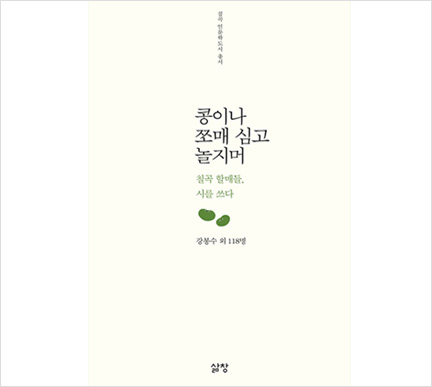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