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량도 섬마을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통영시 사량도 능양마을.
그곳에 거침없는 시인들이 있다.
그 이야기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이 지면에서 무슨 일 때문에 능양마을에 거침없는 시인들이 탄생했는지 구구절절 얘기할 생각은 없다. 이미 많은 매체에서 그간의 일들이 보도됐을 뿐더러(행여 그 과정이 관심 있는 사람은 국민일보 박유리 기자의 글-11월 18일자, ‘섬마을에 이야기가 시작됐다 그 마을에 무슨 일이……’-을 참고 하기 바란다) 그 얘기를 모두 풀어 놓기에는 한정된 지면이 필자를 압박하기 때문이다. 대신 능양마을 냉동고에 전시된 시 한 편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 시로 그곳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를 대신하고자 한다.
주민여러분!
오늘,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모임이 있으니
마을 노인정에 모여 주십시오.
마을이장이 방송한다.
무슨 소리냐,
뱃일, 밭일에 지친 사람들,
일찍 자도 잠이 모자라는 판인데
밥 나오고, 떡 나오는 일도 아닌데
방관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잤다
그러는 사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화’가 되어
무지개 색으로 변한 냉동고에 붙는다.
(중략)
문화를 통하여 생동감 있는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김형도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지난 19일, 필자는 능양마을 냉동고 앞에 서서 위의 시를 읽었다.
명쾌했다.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숨김이 없었고, 그래서 묵직했다. 이 시는 능양마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생활문화공동체 시범사업이 그네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꾸밈없이 드러내주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곳에 서 있을 수는 없었다. 시 몇 편을 읽고 나자, 어느새 생활문화공동체 시범사업 종합발표회 시간이 임박해 있었다.
“웃 섬에서 친구랑/한잔, 취하여 기분 좋게 고개 넘어 걸었던/추억의 지름길……” 이대영(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뒤 시 한 편을 낭독하며 이색적인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렇게, 종합발표회는 시작됐다.
“에~야 디~야, 에헤야 디~ 야” 주민들의 합창으로 문을 연 종합발표회는 시낭송을 중심으로 낭송 사이사이 시극(무용극, 꽁트)을 공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리 고백하자면,
필자는 종합발표회가 진행되는 동안, 뜨겁게 차오르는 눈시울을 감추기 위해 여러 번 사진기를 들고 뷰파인더 속으로 눈을 감춰야만 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섬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시를 들고 나와 낭송을 했다. 그들의 삶이 시가 되어 피어났고, 그 시가 그네들의 육성으로 회장에 낮게 깔렸다. 반세기를 훌쩍 넘게 살아낸 사람들의 육성은, 묘한 울림을 자아냈다.
“노을과 함께/석양이 질 때면// 어둠 맞이 불빛/하나 둘 켜지고//무전기 스피커엔/삶의 목소리들// 언제나 저 석양/ 같은 인생이라면” (오호권 ‘밤 낙지잡이’)
“일제강점기시절/꿈 많고 꽃다운 열일곱 소녀를/처녀공출 당하지 않기 위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행근무도 그만두게 하고/부모님이 억지로 결혼시켜/육지에서 섬으로 시집보냈다.//밥 할 줄 모르는 새색시는/시댁 식구들이 내던지는/밥사발에 이마가 터지고/가냘픈 몸매에 큰 물독을 이고/ 지게지고 나무하느라 고운 손은 거북이 손으로 변했다.//신랑이 어장배 타고/떠난 밤이면//피곤함과 외로움이 온몸을 쑤시어/열손가락 마디마디가 더 아리게 했다.”(장석순 ‘열일곱 소녀’)
20여 편의 시가 낭송되는 동안 누구 하나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사람들은 회장에 낮게 깔리는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였다. 그들의 시에는 섬마을 사람들의 애환, 삶과 죽음, 고독과 사랑 그리고 화해의 시구들이 넘실거렸다. 낭송을 듣던 사람들은 가만가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꾹꾹 눈가를 찍기도 했으며, 다시 환하게 웃기도 했다.
그랬다. 그들의 인생을 시로 풀어낸 사람들. 그들은 이미 시인이었다.
“어허라넘자 어허라넘자 바다로 넘자 바다로 넘자/ 어허라넘자 어허라넘자 바다로 넘자 바라도 넘자” 시낭송이 끝난 후, 주민들이 공동 창작한 선바위 노래를 합창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종합발표회는 끝이 났다.
“담배 한대 빌릴 수 있을까요?”
비니를 쓴 남자 한명이 다가와 필자에게 물었다. 필자는 흔쾌히 담배 한 대를 건넸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며 “끊었던 담배가 다 피고 싶네요.” 말을 보탰다. 먹먹한 감동을 느낀 것은 필자만이 아닌 듯했다. 주민 60여 명의 섬마을에 생활문화공동체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시를 짓고 시화를 붙이고, 시극을 연습하며 두 계절을 보냈다. 그들의 삶과 두 계절의 시간이 온몸으로 부딪쳐온 것이리라.
그때 먼발치에 걸려 있던 플래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섬마을에 웃음꽃이 활짝 피네
관련 뉴스 보기[국민일보] “섬마을에 이야기가 시작됐다. 그 어르신들에게 무슨 일이…”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좋아요
0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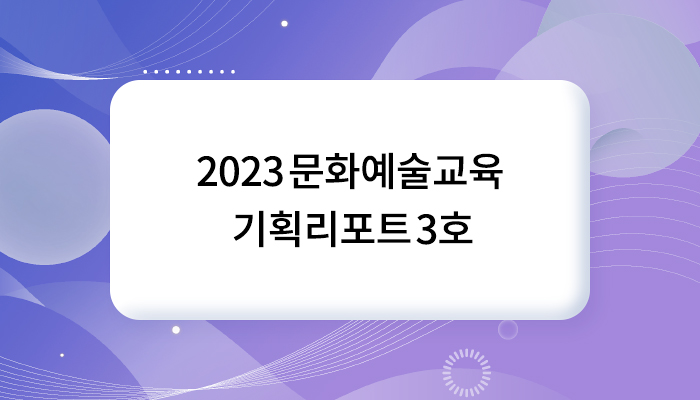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