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장 감독은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1980년대 한국의 스티븐 스필버그라 불리며 최고의 흥행감독으로 이름을 날렸던 배창호 감독이 다시 독립영화의 길로 컴백했다. <여행>이란 제목의 새 작품은 총150분짜리로 ‘단 돈’ 1억6천만 원으로 찍은 저예산영화다. 노장 감독 배창호 감독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창작욕에 불타있다. 그는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현재진행형 감독이다.

1980년대 한국의 스티븐 스필버그라 불리며 최고의 흥행감독으로 이름을 날렸던 배창호 감독은 전설의 명감독으로 잊혀 지길 거부하며 끈질기게 지금껏 현장에 남아있는 몇 안되는 인물에 속한다. 실제로 배창호급 감독은 현재 충무로에 남아있지 않다. 그의 위급으로 유일하게 임권택 감독이 활동하고 있을 정도다.
배창호 감독은 영화계가 자신에게 공룡 화석이 되라며 자꾸만 등을 떠밀어도 악착같이 원 안에 남아 영화를 만들어 왔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 그는, 이때껏 자신이 만들어 왔던 상업영화 방식을 버리고 새 길을 선택했다. 1998년부터 지금껏 그는 네 편의 영화를 만들어 왔는데, <러브 스토리>와 <정> 그리고 <흑수선>과 <길> 등이 그것이다. <흑수선> 때 잠시 상업영화권으로 외도를 했다가 다시 독립영화의 길로 컴백한 배창호는 최근 또 다른 비상업, 저예산영화 한편을 완성했다. 새 영화는 다소 고답적이고 옛스러워서 고색창연한 느낌이 드는데, 바로 <여행>이란 제목이기 때문이다. 총150분짜리로 상업영화권이라면 깜짝 놀라게도 ‘단 돈’ 1억6천만 원으로 찍었다. 이 작품은 내년 2월 적은 스크린 수이긴 하지만 CGV 등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감독의 창작정신, 예술적 영혼을 담는 영화를 만든다
– 언제부턴가 당신은 고집스러운 저예산주의자로 읽힌다.
“그렇지 않다. 다만 영화를 만드는데 있어 자본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졌을 뿐이다. 큰 영화라면 <흑수선>이 있었지 않나. 물론 앞으로 상업영화도 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영화 풍토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돈, 돈 한다.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감독의 창작정신, 예술적 영혼을 자본에 종속시키게 만든다. 인간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정서와 주제를 담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이다. 그렇다면 독립영화 방식의 영화 만들기가 지금의 내게는 맞다고 본다.”
– 이번 영화는 어떤 작품인지 독자들을 위해 직접 설명해 달라.
“제주도에 대한 영화다. 제주도 홍보영화가 아니고 제주도가 배경인 영화. 원래 제작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기금에서 나왔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돈을 댄 사람(정부)은 공간에 대한 영화를 생각했을 것이다. 이번 영화의 목적성은 사실 그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랬다면 작품을 찍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1억6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전혀 창작의 제한이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냥 제주도를 로케 장소로만 사용해 달라고 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제주도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찍었다. 공간은 뒤로 가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에 나왔다. 자본의 당초 목적이 무엇이었든 보통 우리가 해왔듯 극영화 한편을 만들었다.
– 공간은 뒤로 가고 스토리가 앞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이 영화는 사실 3부 옴니버스다. 50분씩 세편. 1부는 젊은 연인이 제주를 여행하며 사랑의 교감을 하는 내용이고 2부는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는 심리를 담았다. 마지막 장은 홀로 제주를 찾은 중년 여인의 외출을 다뤘다.”
– 사실 세편 모두 미리 봤다. 마지막 장에서 여주인공이 홀로 벤치에 앉아 읽는 워즈워드의 시 <초원의 빛>이 인상적이었다.
“아마도 대부분은 시 구절 중에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정도를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의 전문 가까이를 주인공의 독백으로 낭송하게 했다. 의외로 좋지 않던가. 한때는 그리도 찬란한 빛으로서/이제는 속절없이 사라져가는/돌이킬 수 없는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우리는 서러워하지 않으며/뒤에 남아서 굳세리라 등등. 어때? 좋지 않은가?”
– 문어적인데도 좋다. 사람들은 종종 문어적으로, 문예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영화는 일깨워준다. 당신의 영화의 실체는 그래서 ‘퓨어리즘(Purism)’이다.
“(웃음) 그런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돌이켜 보면 그런 게 좋은 것이다. 그런 게 오래 남는 것이다. 우리는 오래 남는 영화를 만들고 오래 남는 영화를 봐야 한다.”
<길>은 영화 만들기의 고독에 대한 얘기
2004년에 배창호 감독의 만든 영화 <길>은 대중들로부터 외면 받았지만 신시대 최고의 구식영화이자 그래서 걸작이다. 감독 스스로 (순전히 예산 때문에) 시나리오에서부터 감독과 주연까지 도맡은 영화 <길>은 대장장이 태석의 인생유전을 그린 내용이다. 태석은 20년 동안 각지의 장터를 떠돌며 살아 왔으며 그에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만 그녀가 친구인 득수와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하곤 오래 전 집을 떠난 상태다. 영화는 자꾸, 그리고 자주, 태석이 다니는 ‘길’을 보여준다. 이 영화의 명장면은 그렇게 떠돌던 태석이 또 어느 하루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 뒤를 바라보는 시점 샷이다. 힘겹게 올라 온 태석의 등 뒤로 산 아래 길이 굽이굽이 휘어져 있다. 배창호 감독은 그 길의 모습을 롱 샷과 롱 테이크로 보여준다. 그 장면이 그렇게 마음을 칠 수가 없다.
영화 <길>에서의 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길’, 그러니까 ‘방법(way)’을 가리키는 것임을 궁극적으로 드러낸다. 영화 속에서 거의 부감 샷으로 찍힌 배창호 의 길이 직선인 적이 한 번도 없는 건 그 때문이다. 그의 영화 속 길은 한국의 토속성을 보여주듯 늘 구불구불하게 휘어져 있다. 산등어리를 휘감는 길들을 그는 먼발치 눈길을 통해 관객들에게 보여주려 한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돌아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거기엔 숨어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문득, 이건 대장장이 태석의 얘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확 밀려온다. 이건 배창호 자신이 행해왔던 영화 만들기의 고독에 대한 얘기다. 20년 동안 저잣거리를 돌며 칼을 갈고 낫을 갈았던 주인공 태석처럼 배창호 역시 30년 가까이 곳곳의 영화판을 돌며 이 영화를 갈고 저 영화를 갈아 왔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움직이는 건 그 과정에서 겪었을 한 작가의 밤샘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배창호 감독은 현재진행형 감독이다. 노장 감독은 죽지 않는다. 사라지지도 않는다.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을 뿐이다.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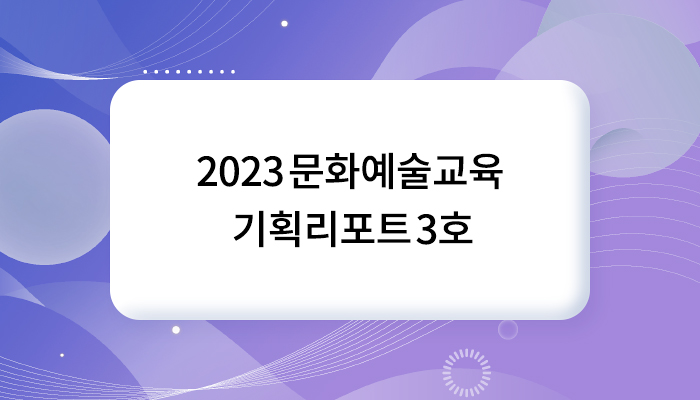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