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없이 칭찬함으로써 스스로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라!
앞으로 더 잘할거라 믿어주고 치켜세워주며, 제자들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 기뻐해주라!
이것이 오늘날의 대관령국제음악제와 마스터클래스를 성공으로 이끈 가장 밑바닥의 토양이다.
# 얼마 전 내가 사는 집으로 몇몇 사람이 모였다. 그 중에는 미국 뉴욕의 줄리아드 음대와 예일대 음대에서 40여년간 제자들을 길러낸 강효 교수도 있었다. 그는 7년간에 걸쳐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술감독으로 활약하며 대관령음악제를 한국판 아스펜음악제로 정착시켜낸 주역이었다.
몇 해 전 뉴욕 줄리아드 음대의 강효 교수 강의실에 들어가 본 기억이 있다. 강의실이라고 해야 5~6평 남짓한 공간에 소파 하나와 책상 하나가 놓인 소박한 곳이었다. 강효 교수 본인의 연구실 겸 연습실로 쓰이는 이 곳에서 그는 1975~6년경부터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여럿을 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학생과 마주해 그 학생의 연주를 듣고 코멘트 해주는 식의 강의를 40년 동안 해온 것이다.
# 강효 교수는 학생의 연주에 대해 혹평을 하거나 신랄한 어조로 다그치지 않는다. 그 어떤 권위도 내세우지 않는다. 그저 지긋한 눈빛으로 혹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학생의 연주가 끝나면 박수를 보내거나 “정말 잘했어”라는 말을 함박 미소와 함께 건네는 것이 그가 하는 강의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 정도다. 강효 교수의 책상 위에는 바이올린이 한 대 놓여 있지만 그는 여간 해서 그것을 직접 손에 들고 학생 앞에서 시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라, 나를 따라 해봐라. 이게 잘못됐잖니!” 하는 식으로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굳이 지적할 점이 있으면 학생이 연주하는 것을 끝까지 듣고 난 뒤, 자신의 빈손에 바이올린을 올려 쥔 포즈를 취하고는 허공에서 손의 운지법을 시범해 보이는 것 정도가 전부다. 사실 적잖은 레슨에서, 선생들은 학생의 연주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 대개 학생의 연주를 듣다 말고 “그게 아니잖아. 여기서 또 틀렸잖아.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줘야 하니!”하며 다그치기 일쑤다. 사실 그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제품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 학생의 연주 세계를 존중하고 늘 그렇게 학생보다 겸손하게 가르침에 임했던 덕분인지 강효 교수의 제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연주자들로 자라났다. 그것도 각자 자기 자신만의 뚜렷한 음악 세계를 갖고서 말이다. 결국 가르치지 않는 듯 가르치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하고 멋진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된다.
언젠가 강효 교수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크지 않더라도 아주 미묘한 발전이 있으면 그게 큰 기쁨을 주고, 또 내일을 위한 희망과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강효 교수는 늘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 칭찬을 통해 학생 스스로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람이다. 그는 또 늘 최고라고 치켜 세워주는 사람이고, 앞으로 더 잘할 거라 믿어주는 사람이며, 제자들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듯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이런 교수법으로 학생들이 교만해지거나 우쭐대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이지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 역시 강효교수의 진심을 알아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일까? 바이올린을 배우려는 전세계의 학생들이 가장 사사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름아닌 강효 교수다.
# 강효 교수의 이런 예술교육관을 바탕으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4년, ‘대관령국제음악제’와 음악스쿨캠프인 ‘마스터 클래스’가 처음 열렸다. 지금이야 해마다 7월이 되면 음악도와 음악애호가뿐만 아니라 대자연과 더불어 음악을 즐기려는 이들이 대관령 알펜시아로 몰려들지만, 10년 전만 해도 서울도 아닌 대관령에서 음악제를, 그것도 한여름에 국제음악제를 펼친다는 것은 거의 ‘미친 짓’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하지만 2004년 7월 24일부터 16일 동안 열린 첫 음악제는 대관령 아래에 모여든 사람들 저마다의 영혼을 울렸다.
주변 여건 상으로는 불비(不備)한 것이 더 많았지만 그래서 잔잔한 감동의 파장 또한 더욱 컸다. 알펜시아 리조트 내에 전용 음악홀인 ‘알펜시아홀’까지 갖추어 진행되는 지금의 대관령국제음악제와는 달리, 당시엔 인근 용평리조트에서 천막으로 만든 눈마을홀에서 개막 콘서트를 여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비록 화려하지도, 넉넉하지도 못한 여건이었지만, ‘거장 음악가와의 대화’, ‘저명 연주가 시리즈’, ‘떠오르는 연주가 시리즈’, ‘학생연주회’ 등의 타이틀을 내건 실내악 연주회가 다양하게 펼쳐졌다. 아울러 세계적인 교수진들이 참여하는 ‘마스터 클래스’가 대관령국제음악제 기간 동안 함께 열려, 단지 일회적인 음악회가 아니라 다음세대를 키워내는 미래형 음악제로 자리를 잡기에 이른 것이다.
# 흔히 대관령국제음악제가 미국의 아스펜음악제를 모방한 것이라고 말한다. 맞다! 처음에는 대관령(해발 832미터)과미국 콜로라도주 로키산맥 중턱의 아스펜을 그저 지형학적인 유사성에서 접근했을 수도 있다. 아울러 처음 시작했을 때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일종의 불쏘시개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이제 자기만의 색깔과 나름의 철학마저 갖게 되었다. 그 사이 강효 교수 내외가 7년 여 헌신했고 4년 전부터는 첼리스트 정명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자매와 구삼열 행정감독이 바통을 이어 받아 음악제와 교육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한국판 아스펜음악제, 아니 대관령국제음악제의 기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피아니스트 신수정,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교수 등의 초인적인 헌신에 힘입어 19개국 1,400여 명의 음악도들이 거쳐간 대관령국제음악제의 ‘마스터 클래스’에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의 젊은 20대 연주자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한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피아니스트 김다솔, 김태형, 손열음 등이 그들이다. 특히 클라라 주미 강은 대관령국제음악제 마스터 클래스의 학생 신분에서 연주자로, 다시 이제는 교수진으로 대관령국제음악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대관령국제음악제가 뿌려온 미래의 씨앗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한 셈이다.
# 이제 바야흐로 대관령국제음악제 시즌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22일에 걸쳐 이어질 제11회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통해 진정한 음악과 예술교육의 만남이 얼마나 풍성한 문화의 장을 만들어내는가를 직접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글쓴이_정진홍
광주과학기술원(GIST) 다산특훈교수 • 한국문화기술연구소(KCTI) 소장
*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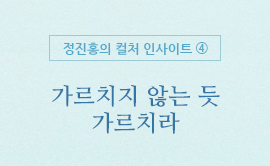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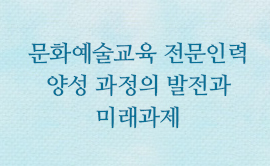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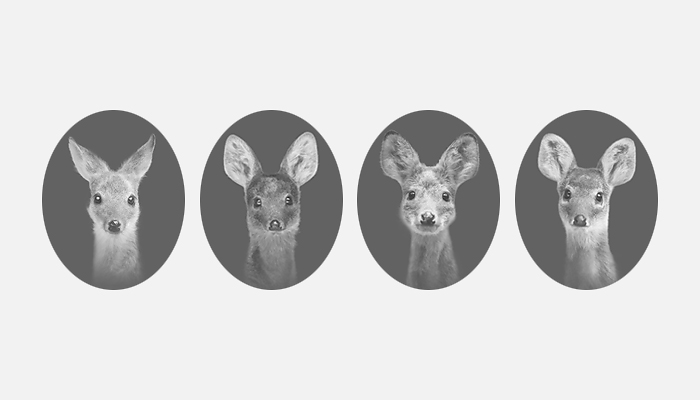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