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간질 몸이 기지개를 켤 즈음이면 어김없이 따듯한 기억이 소환된다. 햇살 가득 번지는 어느 봄날, 엄마는 방바닥에 ‘봄의 빛’을 잔뜩 늘어놓았다. 엄마의 입을 빌려 재구성되는 그림 속 주인공들은 사랑이 되고, 그리움으로 피고, 아픔으로 걸리고, 경이로움이 되었다. 자라면서 삶의 곳곳에서 다시 만난 그것들이 명화라고 불린다는 걸 알게 되었다. 클로드 모네의 <수련(구름)>, 마르크 샤갈의 <나와 마을>, 칸딘스키의 원색의 도형과 선, 조르주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등, 색채의 조화를 다룬 화가들의 작품을 나는 그렇게 만났다. 엄마는 한낱 종이에 불과했을 그것들을 추억의 장치, 기억의 저장소가 되도록 의미를 부여했다. 잡지나 신문, 캘린더에서 스크랩해뒀다가 수시로 나만을 위한 갤러리를 열었다. 삶의 일부로 살아낸 자연스러운 행위는 밋밋했던 집이라는 공간에 ‘예술성’을 들였다. 어떤 연유에서건 엄마의 이런 행위들이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수시로 찾아들던 삶의 위기마다 자존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 스스로 고통의 터널을 잘 헤쳐 나올 수 있었다. 나는 예술가로 살 재능은 없지만, 잘 즐기는 삶을 택했다. 마니아적 전문성이 아닌 생활인으로서 수시로 내 삶에 문화예술의 향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내가 속한 더함플러스협동조합은 주거공유 및 공동체 주택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공동체 주거 욕구를 가진 수요자 커뮤니티를 발굴, 육성하고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고 있다. 작년에는 인천 연수문화재단에서 ‘주거’를 테마로 하는 신중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의뢰받았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연구개발, 운영까지 맡아야 했다. 회의 중 문득, 투박하지만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했던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엄마와 나눴던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 없이 편의를 위해 스스로 단절과 고립을 선택한 50대 이상의 아파트 거주민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들에게 ‘주거’는 새삼 무슨 의미일까? 내 주거지 ‘집’의 담벼락을 스스로 뛰어넘어 ‘이웃’이 있는 지역에까지 생각이 확대될 수 있을까? 이 과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신중년’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을까?
내면의 나를 비추는 ‘공간’
뒤엉킨 질문과 극히 사적인 기억의 편린을 붙들고 기획에 착수했다. 사전에 시니어 관련 논문을 읽고,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들은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고 신선한 체험을 기대했다. 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재미, 의미, 탁월성을 원했다. 인천 최고의 투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살(Living)’ 집이기 이전에 ‘사는(Buying)’ 데 촉이 발달한 사람들일 거라는 나의 선입견과 편견부터 수정했다. 그들도 몽글몽글한 추억을 가진, 삶을 의미 있게 재편성하여 주도적 삶을 살고 싶은 존재들이라고 시각을 바꾸자, 그들이 더없이 궁금해졌다. ‘공간’이라는 날줄에 ‘시간’이라는 씨줄이 오가며 그들의 감성과 정서를 표현해내게 하고 싶어졌다. 그들의 ‘있었고, 있으며, 있을’ 시간 여행을 얼른 하고 싶어졌다. 공간을 둘러싼 그들의 희로애락을 만나고 싶어졌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 반 5명씩, 오전 오후 2개 반으로 편성해서 ‘머물다, 나답게’ 살롱 문화를 열었다. 10회차 동안, 우리는 무시로 울고 웃으며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생애주기를 따라 공간에서의 기억을 불러냈다.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 안에서 나를 지켜준 나만의 동굴은 어디였는지, 집안에서도 유독 나를 편안하게 하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나를 밀어내는 공간도 있음을 발견했다. 먹고 자고 그저 일상을 영위하는 장소로만 있던 집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나’를 투영하기도 했고 ‘느끼는’ 존재로서의 나를 가감 없이 말하고 있었다. 지저분하기만 한 물건들을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가족이 이해되었던 시간이었고, 의식을 치르듯 자기만을 위한 사치를 부리는 본격적 예술을 시작했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나누고 싶어 했다. 비교 대상으로서의 이웃이 아니라 취향을 나누는 좋은 친구로서 상대를 환대했다. 소심하게 치부한 내 ‘기능’이 섬세한 ‘재능’으로 빛이 난다는 걸 깨달았다. 신이 나서 자신의 창발성을 이야기하고 기꺼이 동료들의 재능을 찾아주고 축하했다. 급기야 어린 날 골목을 중심으로 내 집 네 집 가리지 않던 공동체성이 사람의 온기를 채운 귀한 자산이었음을 고백했다.
‘나다움’의 내러티브 살리기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의 주거 문화를 요구한다. 집은 더 이상 가족의 물리적 쉼터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교실을 대체하기도 하고, 사무실로, 홈트를 하는 체육관으로, 끊임없이 변신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 간 사적 공간 기능으로만 한정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내 집이 이웃과 교류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하게 할 수는 없을지 생각해본다. 인류는 수시로 바이러스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사람들은 비대면 온택트 사회에 우울감을 호소하며 어떻게든 연결되길 원한다. 이동 제한으로 대규모 공공의 ‘공간’이 제 기능을 못 하니 주거지를 중심으로 서로를 환대해보면 어떨까. 가령 집집마다 제 기능을 못 하는 물건이 방치되어 있다면, 빼기의 미학을 발휘하여 이웃끼리 나누고 바꾸며 소소한 재미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공허함은 사물로 채울 수 없다. 욕심으로 채운 공간은 ‘비워내기’로 숨통을 터주고 그 자리에 사람을 들여 이야기가 넘쳐나게 하고 온기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웃과 더불어 소확행을 실현하는 ‘우리’의 케렌시아. 놀이하듯 모여든 사람들은 서로의 영감을 일깨우게 될 것이다. 예술성을 더하면서 소통의 질은 달라진다. 자연스럽고 홀가분해진 일상공간에서 끊임없이 ‘나다움’의 내러티브가 살아날 것이다. 이웃들끼리 쑥덕쑥덕 재미난 작당으로 내가 사는 공간에 예술성을 입힌다. 예술은 개별성을 담보로 하지만, 즐기고 인정해주는 관객이 없이는 재미가 덜하다. 마음 넉넉한 신중년들이 관객도 되고 예술 하는 주체가 되어 삶의 의미와 재미도 예술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파트 담벼락에 ‘요기요기 붙어라’ 취향 공동체, 예술 공동체 모집 꼬리표가 나부끼는 상상에, 따듯함이 밀려온다.

- 육현주
- 더함플러스협동조합 교육이사. 강의와 코칭,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한다. 양평에서 문화복합공간 플라워&북 카페를 공동 운영하며 사람들과 소통한다. 삶 속의 예술, 예술 속의 삶을 모토로 지금&여기에 충실한 삶을 즐긴다.
mhjyook@naver.com
메인 사진_필자제공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3 Comments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코너별 기사보기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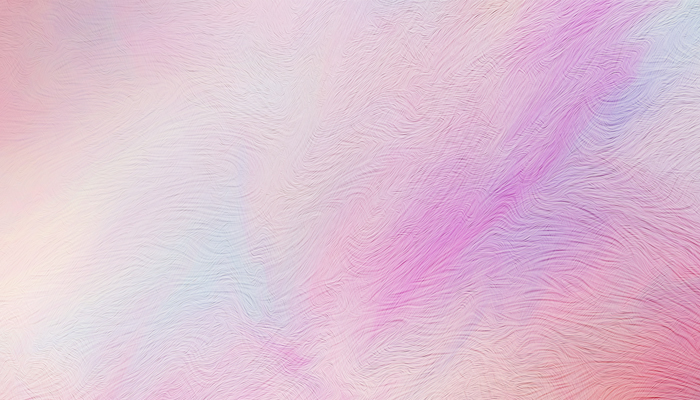









그 좋은 공감 곳곳에서 계속 이어 나가시기를 기원드리며 응원 또한 격하게 드립니다. 늘 건강하심도 바라면서…
언니 휴일아침 가슴속 일렁이는 좋은글들 잘 보았어요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언니향한 사랑과 우정을 담아
늘 응원합니다 !
글도 좋지만 인간 육현주가 너무 좋다 입니다
우리 집 담장 너머 이웃을 향하는
삶을 전환하는 공간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