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리쌍의 노래에 등장하는 일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터가 아니다. 그곳은 사랑과 꿈, 내 머릿속에 자리 잡은 소재들을 만들어내는 곳, 즉 창작 공간으로서의 일터다. 자신의 일상을 예술, 창작의 소재로 삼는 예술가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진리와 아름다움, 신과 영원을 찾아 헤매던 예술이 우리의 일상에 자리해 자신의 디테일 한 일상을 대상화하거나 현대산업사회의 일상성이라는 것 자체를 숙고하면서 어느새 일상을 예술화 시켰다. 그리고 그 다른 편엔 공공미술이란 이름으로 현대인의 일상 한가운데 예술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 일상의 예술화가 있다.
예술적 다양성_규모의 경제를 넘어서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미술관이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안산 반월공단에 설치했던, 예술이 흐르는 공단 <한뼘프로젝트>는 공장 건물에 예술가들의 작품이 선보이는 공공미술 작업이었다. 공단이라는 곳은 그 태생부터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지배하는 곳이다. 각종 공장들을 한곳에 집적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비용 절감을 기대하는데, 안산 반월 공단은 특히 1977년부터 국가 주도의 산업단지로 육성되었다. 사실 한번이라도 공단이라는 곳에 실제로 가본 사람은 안다. ‘한뼘’이라는 말이 표방하는 소박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월 공단 자체가 지닌 상상할 수 없는 메스(mass)는 도시의 스펙타클에 익숙한 우리의 눈에도 놀랍고 생경한 것이었다. 끊임없이 늘어선 공장들과 여기저기 거대한 기계시설들이 노출된 표면, 그리고 노후 된 공장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까지 뒤섞인 그곳에서(오히려 공단이라는 장소 자체가 현대산업사회의 축소판이자 하나의 예술이 되는 그곳에서) 어떤 예술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곧 예술이 투입됐다. 예술이 단순히 공단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환경미화는 아니다. 예술의 역할은 그저 공단의 삶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균열의 틈새들을 드러내고 다듬어주며 이어주는 일이다.


아름다움이 흐르는, 작품이 있는 공단
예술이 흐르는 공단 한뼘프로젝트의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 자체는 곧 공단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강익중의 바람으로 섞이고 땅으로 이어지고가 설치된 곳은 반월공단의 전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인 STX에너지주식회사의 반월발전소에서 신축한 지름 20미터의 축열조다. 축열조는 화력발전소의 냉매로 사용되는 순도 99.9%의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다.홍현숙•이주호의 안녕하세요?가 설치된 곳은 구찌나 프라다 등 세계적인 명품회사에 피혁원단을 수출하는 해성아이다의 70미터에 이르는 담장이다. 사실 담장이라는 것은 안산 공단에서는 꽤나 파격적인 것이다. 전체 80%이상이 5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으로 구성된 반월공단의 여건상 공장시설을 짓기에도 급급했기에 번듯한 담장을 가진 회사는 손에 꼽히는 공단의 현실이 있었다. 피혁공장들이 3D업종으로 분류되며 중국이전이나 폐업을 할 때 오히려 기술력과 품질이라는 정공법으로 뚫고 나갔던 해성아이다의 자존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다.박미나의 Healthcare는 아예 가로 73미터 높이 20미터에 이르는 공장 건물의 전면 외관을 캔버스로 삼았다. 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라는 1945년 국내 최초로 수액제를 소개한 제약회사의 전통과 자부심을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딩벳 폰트를 통해 현대화 시키는 작업이었다. 장소 특정적(site-specific)이라는 미술용어가 완벽하게 조건 지워질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들이었다. 그것은 23미터, 70미터, 73미터의 초대형 작품들조차 공단이라는 물리적 스케일 앞에서는 그저 한뼘 정도의 크기와 파장을 가지는 현실에 대한 우화이기도 했다.

예술의 일상화, 삶 속에서 확장되는 예술
“저 같은 사람이 보고 좋다고 느낄 정도면 그건 정말 좋은 거 아닐까요.”박미나 작가의 헬스케어가 설치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면서 참여기업의 일선 담당 부장이 내게 건넨 말이다. 여기서 ‘저 같은 사람’ 이란, 미술에 대해 문외한을 의미했다. 경전철이 들어오는 공단 3거리 중심에 위치한 이유 때문에 생면부지의 기업을 방문해 설득하기를 수 차례, 작품을 설치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유독이나 소극적이던 분이었다. 그분은 늘 ‘저 같은 사람은 미술은 잘 모르구요’ 부터 시작했지만 대신 기업 경영진에 우리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해주었다.
작품이 설치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늘 전달자였던 분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놀랍고, 또 기뻤다. 또 다른 참여기업의 경비원은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작가의 작품 안을 프린트라도 해서 갖고 싶다고 했다. 사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이 보다 많은 사람과 소통되기를 꿈꾼다. 자신의 작품이 단지 돈 많은 개인의 소유물로서 집안을 꾸미는 그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보여 지고 즐길 수 있는 무엇이 되는 것,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미술에 있어 공적인 미술일 것이다. 그러한 소망들이 적극적으로 진화될 때 거리에서, 도시에서 선보이는 공공미술 작업으로 확장되고, 우리의 삶의 공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적 상상들이 구현되는 것이다. 어쩌면 늘 자동으로 따라붙는 상투어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삶 속에서 확장되는 미술, 일상에 파문을 던질 수 있는 미술, 그런 건 교과서 속에만 박제되어버린 의미로 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그러한 오래된 믿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일터에서 펼쳐지는 예술의 일상화 작업들을 통해 사랑과 꿈을 노래하는 리쌍의 일터가 매일 기계처럼 반복되는 나의 일터에도 존재하며, 그 존재가 끊임없이 바로 ‘나’의 사랑과 꿈에 대해 떠올리게 하고, 묻게 만드는 존재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글_ 여경환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사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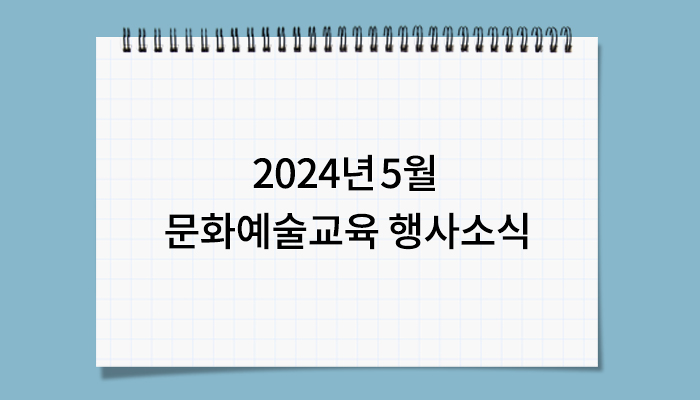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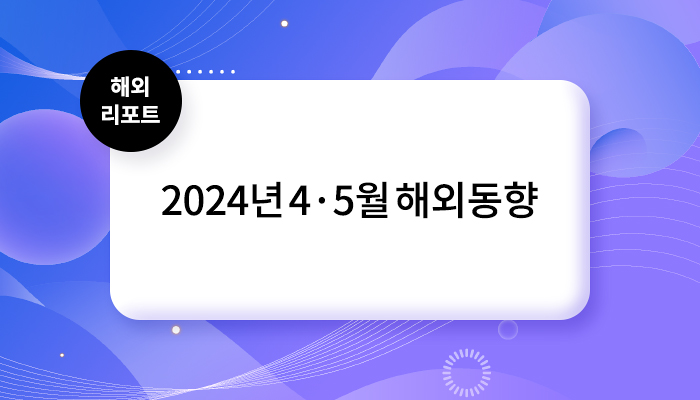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