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찍는다, 본다, 남긴다… 이들에겐 아주 일상적인 동시에 무엇보다 특별한 작업이다. 평생의 업이자 매일 하는 일이기에 일상이라 말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으니 특별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찍음’의 기쁨에 빠진 사람들
지난 7월 22일 오후 5시, 강동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로비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쁨에 찬 이 박수소리는 이날 오픈한 ‘2011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사진전’의 주인공들이 서로를 축하하는 소리였다. 전문적으로 사진 교육을 받은 적 없고 그저 좋아서 한 장 두 장씩 찍기 시작한 사진이 이렇게 어엿한 전시 현장에 나서게 되기까지는 이들의 열정과 땀방울이 오롯이 모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영상의학과 김형중 교수, 서준범 교수, 이진성 교수, 윤종현 교수, 송호영 교수, 김남국 교수, 신지훈 교수(외국학회 참석 중이라 이날은 함께하지 못했다), 성규보 교수 등 총 8명의 영상의학과 교수들은 보람찬 눈빛으로 벽에 걸린 작품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저희야 물론 기쁘고 고마운 일이지만, 이렇게 취재를 나오시다니 부끄럽고 어색하네요.” 이들 중 서준범 교수에게 인터뷰를 청하자 쑥스러운 듯 얼굴이 붉어진다. “어떤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만나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시작 시기도, 사진을 통해 추구하는 바도 모두 다르지만 ‘찍음’이 주는 기쁨에 푹 빠졌다는 것만은 동일하다고나 할까요.” 서 교수는 자신을 포함한 여덟 명의 교수들을 아우르는 것은 사진 찍기의 기쁨이라고 말한다.

뷰파인더를 통해 나를 돌아본다
뒤이어 다른 교수들에게도 사진에 대해 한 마디씩 물었다. 다들 쑥스러워하면서도 차분한 얼굴로 자신 속 사진의 의미를 길어 올린다. 성규보 교수의 이야기다. “혹시 아세요? 사람의 내부 장기나 혈관이 마치 사람의 얼굴 생김새나 지문처럼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요. 만약 모든 사람의 혈관과 장기가 다 똑같이 생겼다면 저희처럼 영상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사진을 찍으면서 자연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같은 대상을 찍어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해뜰 무렵과 해질녘이 다릅니다. 모든 순간이 다르기에 사진은 한 장 한 장 그 가치를 갖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윤종현 교수의 경우에 사진은 꿈을 이루는 마당이 됐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필름카메라를 통해 처음 카메라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데 바빠 사진찍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다시 사진을 찍으며 놓아 두었던 꿈을 새롭게 좇고 있는 기분입니다. 원래 성형외과 전공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영상의학을 전공하게 되었는데요. 카메라를 통해 제가 꿈꾸는 세상을 표현하고 제가 바라는 이미지로 사물을 ‘성형’할 수 있으니 그 또한 재미있다 생각하게 되었지요.” 윤 교수의 작품에 보이는 독특하고 익살맞은 ‘왜곡’의 시도는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야기다.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 하나는 ‘사진을 통해 가족사랑이 깊어졌다’는 사실. 성규보 교수의 경우엔 오히려 부인이 먼저 카메라를 들었다. 부부가 함께 사진촬영 취미를 가져, 주말에는 배낭 하나 둘러메고 등산화 끈 조인 후 출사를 다니는 것이 성 교수의 기쁨이다. 서준범 교수의 경우는 “처음에는 부인이 그리 좋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사진 찍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사진을 찍기 전엔 주말에 게으르게 쉬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주말에 어디 갈지, 그리고 가족과 함께한다면 어떻게 루트를 짜는 것이 좋은지 부지런히 실천하는 아빠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성장을 카메라로 오롯이 남길 수 있으니 더 좋아합니다.” 라고 사진이 가족에게 가져다 준 유쾌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빛과 시간이 기록하는 기억들
영상의학과 교수 사진전의 실무를 맡아 누구보다 바쁘게 뛰어 다녔던 김남국 교수. 동료 교수들이 사진에 대해 고민하고 어색해 할 때 기운을 북돋우고 함께할 수 있으니 의미가 있다며 용기를 심어 준 사람이 바로 그다. 이날도 전공 세미나와 더불어 전시회 오픈 실무를 맡아 잠시도 쉴 틈 없이 이 일 저 일을 보살피는 그에게 소감 한 마디를 물었다. 그러자 말없이 빙긋이 웃음짓는 김 교수. “여기 걸린 사진 한 장 한 장이 모두 저희에겐 빛과 시간으로 기록한 기억이에요. 이 기억을 여기 꺼내어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기쁠 따름입니다. 촬영한 장소도, 촬영한 시점과 당시 각자의 마음도 모두 다르지만 시공간을 뛰어넘어 이러한 결과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기쁩니다.”
사진으로 시작된 이들 8인의 소통은 좀 더 의미있는 결과를 꿈꾸고 있다. 전시회 작품판매수익금은 병원 내 난치병재단에 성금으로 기탁될 예정이며, 작품은 환자들을 위해 철저히 눈높이를 낮추고 문턱을 없앤 곳에 손대면 잡힐 듯한 모습으로 전시됐다. “아, 참 좋네… 매일 병원에만 있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멋진 곳인 줄 몰랐네!” 휠체어를 탄 한 환자가 사진을 둘러보며 혼잣말로 탄성을 내뱉었다. 환자의 뒤를 조용히 따르던 여덞 명의 교수들이 서로 시선을 나눈다. 이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감사와 기쁨의 빛, 그것을 보니 이들이 이어 나갈 앞으로의 사진 작업이 더욱 기대됐다.

글_ 박세라 사진_ 정민영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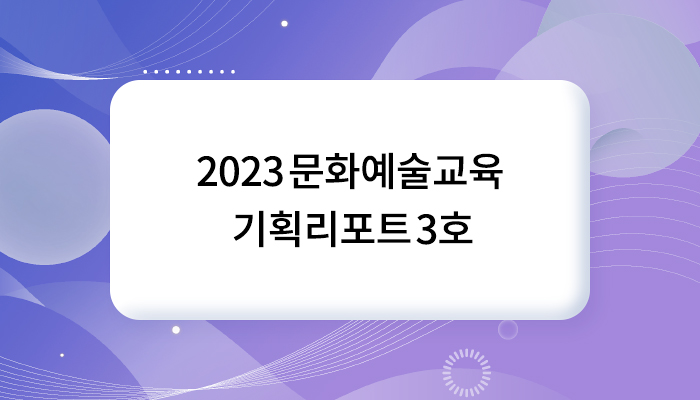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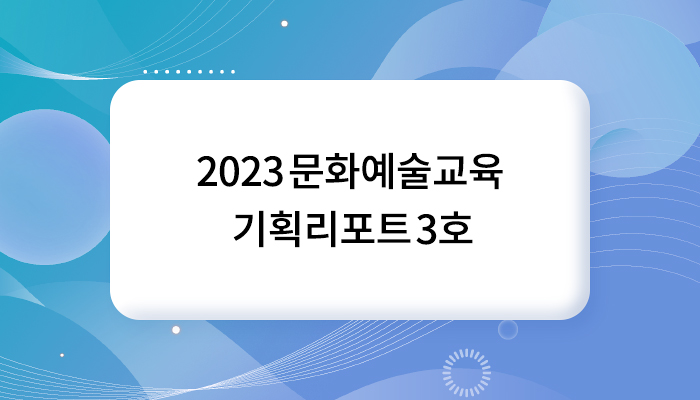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