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겨울, 환경을 주제로 한 레지던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겪은 팬데믹 3년의 시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때이다. 다소 주제가 넓다는 생각에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오래전부터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 새삼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것이 맞을까, 너무 때늦은 접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3년이 지난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반성하게 된다.
세 번의 기후변화 레지던시를 하면서 기후변화는 기후위기가 되었고, 위기는 다시 기후비상사태가 되었다. 그리고 요즘 나는 다시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기후위기에 대해 무감각해졌기 때문은 아니다. 위기와 비상사태는 종종 재난의 상상으로 이어진다. 재난이 당도하기 전 우리는 어떻게 ‘전환’의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 최근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 중 하나는 ‘희망’이다. 쑥스럽고 간지러운 감정이 들기도 하지만, 벽에 걸린 포스터의 그래픽이 되어 버린 이 단어를 부여잡게 된다. 그리고 그 앞에 ‘가능한’을 슬쩍 끼워 넣는다. 가능한 희망! 재난과 디스토피아적 상상에서 벗어나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가능한 희망이 아닐까. 몇 년 전 한 동료는 마이크로 유토피아를 언급했다. 파국의 반대 방향 끝에 거대한 유토피아가 아닌 우리 삶 안의 마이크로 유토피아를 상상하고 만드는 것이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파국의 끝에서 희망을 상상하기
기후변화 레지던시 첫해 참여 작가들이 결정되고 첫 번째 공통 워크숍을 위해 모였던 2020년 7월의 열흘이 생생하다. 내내 비가 내렸다. 매년 겪는 여름 장마라고 하기에는 비의 양이 어마어마했다. 얼마 후 전남 구례에서의 물난리와 스스로 탈출한 소가 지붕에 올라가 있는 낯선 풍경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그 이후에도 잦고 긴 산불, 유례없이 따뜻한 겨울, 서울 도심 한복판의 물난리, 여름 가뭄 등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게다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팬데믹 세상 안에서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대기 과학자, 생태학자, 기후 활동가, 정치학자 등 전문가를 모셔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우리를 둘러싼 대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도대체 희망이 있기는 한 것일까. 예술이, 예술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술의 미약함에 우울감만 커졌다. 첫해는 그렇게 우리 모두 활동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급한 마음과 함께 기후위기와 더불어 동시대 예술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질문이 무성하게 쌓였다.
레지던시가 세 번 이어지는 동안, 시각은 확장되고 생각은 단단해졌다. 기후위기가 단순히 기상학적 문제가 아니라, 생태의 문제이고, 불평등과 인권의 문제이며, 식인자본주의의 구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뚜렷해지면서, ‘기후변화’의 거대함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슈들을 폭넓게 바라보게 되었다. 예술에 대한 믿음도 회복되었다. 참여 작가들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나무에서 수많은 가지를 뻗어 나갔다. 인간과 비인간, 숲의 절멸, 동물권과 비거니즘, 억울하게 희생되는 야생동물(멧돼지), 자신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탐조, 기후 우울증, 기후와 지역, 재생 에너지와 생태, 석유 그 이면의 세계, 플라스틱, 보이지 않는 것 등 워크숍과 개별 리서치를 통해 예술가의 생각과 예술작업의 싹을 오픈 텃밭에서 발표하고 관객과 공유하였다.
보이는 세상의 이면을 마주하기
작년 레지던시부터 지금까지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단어는 ‘이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그동안 레지던시 참여 예술가들은 보이는 세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상을 탐구하는 작업을 해왔다. 윤종연 작가는 산불, 가뭄, 홍수와 같은 재난과 같이 명징하게 보이는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 터전을 잃고 밀려나고 쫓겨난 인간과 비인간의 삶들을 추적하였다. 이혜원 작가는 (야생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설치된 긴 철책 이면의 세상을 탐구하며, 인간의 욕망과 야생 멧돼지의 억울한 죽음을 드러냈다. 장한나 작가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실천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의 이면을 추적하면서 석유산업 시스템에 도달했고, 플라스틱 세상을 위해 석유를 시추하고 있는 시대를 보여주었다. 비거니즘과 동물권을 중심으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한윤미 작가는 전원 스위치로 편리하게 전기를 공급받는 도시인 삶의 이면에서 부담과 희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과 도시와 지역, 인간과 비인간의 착취 구조를 보여주고자 했다. 예술가는 이렇듯 보이는 세상의 이면을 추적하고, 예술가의 상상력으로 그 이면의 세상을 눈앞으로 끌어낸다.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겹겹의 세상으로 사람들을 이끌며, 함께 경험하기를 제안하며 질문한다. “이제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추상적이고 거대한 개념의 기후변화는 우리가 위기와 마주하는 순간, 명징하게 드러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눈앞에서 다시 사라진다. 그리고는 내 앞의 세상은 그저 평온하게 감각된다. 때로는 반복되는 재난이 자본에 전유 되며 낭만적 언어와 공간으로 우리 삶의 위기를 무화시키기도 한다. 일 년 내내 비가 내리는 카페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 열심인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재난에 무감각해 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보이는 세상을 다시 보기, 꿰뚫어 보기, 그 이면으로 걸어 들어가기,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세상을 드러내고 그 안에 가능한 희망을 함께 만들기. 이것이 마이크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나가는 예술가의 역할이고 힘이 아닐까 하는 (가능한) 희망을 꿈꿔본다.

- 박지선
- 세상을 걸으며 삶과 시대를 사유하는 예술기획자이다. 기후변화, 포스트 휴머니즘, 경계, 기술 사회에 대해 리서치 하고 질문하며 예술가들과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부터 기후변화를 주제로 예술가 레지던시를 공동 기획하고 있다.
jisunarts@yahoo.com
인스타그램 @jisun_park_092
사진제공_예술텃밭 예술가 레지던시-기후변화(황호규 촬영)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3 Comments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코너별 기사보기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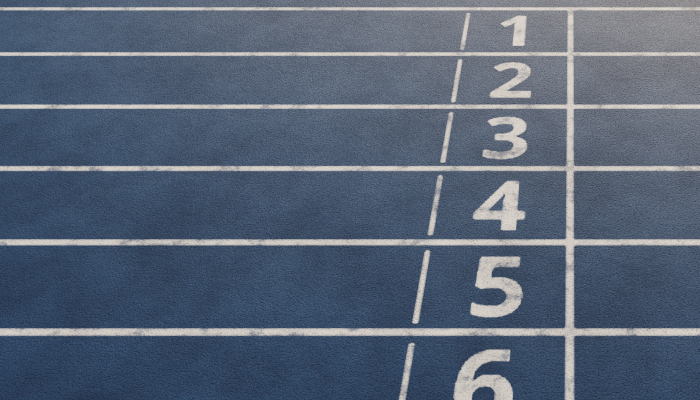






덕분에 마이크로 유토피아 구멍으로 들어가기 위한 ‘꿰뚫는 궁리’를 해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드러내기, 가능한 희망을 꿈꾸기
거대한 기후변화에서 찾은 예술가의 역할
공감이 갑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드러내기, 가능한 희망을 꿈꾸기
거대한 기후변화에서 찾은 예술가의 역할
기대만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