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의례
오래전 일이다. 다니던 대학원에 수영장이 있었다. 실기실에서 작업하다가 막히면 수영장으로 달려가곤 했다. 혼자 곁눈질로 배운 수영이 접영까지 해낼 수 있게 되자 전생이 고래와 연결된 혈통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수업보다 수영에 진심이어서 등록금을 수영장에 바친대도 아깝지 않았고, 해가 저물고 근처 주막에서 얼큰해져 실기실로 돌아가다 말고는 불 꺼진 수영장에 대고 “문 열어 주세요!” 고래고래 객기부리던 기억도 난다. 그 뒤로도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아침 수영과 뗄 수 없는 삶을 지속해왔다. 출산일 전날까지도 수영했던 것은 물론이고, 잡지사 시절엔 새벽 동틀 때 마감을 마치고 퇴근하면서도 수영장으로 직행하곤 했다. “해장 수영 가야 한다”라면서 말이다. 수영은 매일의 세례였고, 수영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오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일상에서 반복하는 일이 신성한 의례가 되는 것, 내겐 수영이 바로 그것(!)이었다.
『리추얼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일상의 일 중 의미 있는 행위에 의도와 목적을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리추얼이라고 정의한다. 나의 수영 의례와 관련해서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종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대에는 헬스클럽이 성당이나 교회의 역할을 한다는 대목이었다. 저자는 ‘소울사이클’이라는 자전거 타기를 체험했던 세 번 모두 울어버렸다고 고백한다. 록스타처럼 훈련된 강사의 안내로 참가자들과 함께 페달을 밟다가 점점 강도가 고조되면서 마치 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소속감과 함께 사뭇 종교적 환희심 같은 것을 느낀 것일까. 그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종교를 멀리하면서 생긴 인생의 의미와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운동이나 세속적인 행위들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일상의 해방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이라면 먹고 입고 머무는 행위가 기본일 것이다. 나는 의식주라는 일상이 예술과 축제의 리추얼이 되는 꿈을 오랫동안 꾸어왔다. ‘창조성 놀이학교, 감우산방’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말이다. 인왕산 언덕에 자리한 ‘서로 배움터’ 감우산방은 달 감(甘), 벗 우(友), 또는 비 우(雨)의 조합으로 풀어보면, 달달한 벗들이거나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조우라는 의미로 이름 지었다. 감,우를 연음하여 가무로 읽으면 ‘음주가무’를 연상시키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이곳에서 서로의 창조성을 키워내는 놀이을 함께해왔다.
산방을 열면서 처음으로 시작한 서로 배움은 ‘옷’에 대한 것이었다. 신체를 가리고 보호하기 위해 입기 시작한 옷은 내가 세상과 만나는 제일 바깥의 피부이기도 하다. 옷은 욕망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때와 장소에 따른 역할의 구속복이 되기도 한다. 옷의 기능들을 성찰하면서 우리는 우선 각자의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빼곡히 걸려있는 내 욕망의 연대기를 살펴보기로 했다. 허물 같은 내 옷 하나를 나무에 걸어 두고, 마치 모노드라마처럼 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서 그 시절을 회상하고 떠나보내는 시간도 가졌다. 헌 옷가지들을 단호한 가위질로 오리고 변형시키면서, 가위질과 바느질 모두 끊어내고 다시 잇는 심리적 재생과정, 즉 리뉴얼이자 리추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옷이 해방의 날개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볕 좋은 마당에 모여 그 옛날 빨래터에서처럼 왁자하게 떠들면서 천과 옷들을 천연염색으로 물들였다. 염색된 천들을 이어서 스카프로 두르고, 쪽빛 몸빼바지로 맵시를 내면서 자연을 입는 듯한 기쁨이 번져갔다. 숨은 고수들의 도움으로 어설픈 솜씨지만 ‘내가 주인이 되는 옷’들을 직접 지어 입기도 했다.
공감과 환대
산방에서 모임을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늘 준비한 시를 천천히 소리 내 읽는다. 시는 기도처럼 모임을 열고 닫는 힘이 있었다. 손작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늘 독서 나눔을 먼저 진행했다. 책 내용을 열거하기보다는 각자 삶을 관통한 경험과 성찰을 내놓았다. 이런 책 읽기는 우선 나와 연결되는 체험을 주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는 눈물, 콧물의 공감으로 서로 연결되곤 했다. 그 마음을 손끝에 모아서 작업으로 풀어내면 서툴어도 행복한 기쁨의 놀이가 되었다.
조지프 캠벨의 『여신들』을 함께 읽으면서는 주변 어디든 각자의 성소를 정해 자신만의 제단을 꾸미고 기리는 의례를 해보기도 했다. 내 안의 신성이 창조성으로 돋아나는 시간이었다. 가장 최근에는 ‘하루. 죽음.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서로의 지지 속에서 차분하고 담담한 ‘마지막 편지’를 쓰고 낭독했다. 따뜻한 차와 다과를 먹으며 죽음에 관한 지혜와 정보를 나누는 유쾌한 ‘데쓰 카페’를 매해 망년회처럼 가져 보자고 약속했다.
모임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은 가장 중요한 환대의 순간이다. 산방의 위치 특성상 각자 허기를 면하게 해줄 것들을 한두 가지씩 이고 지고 올라와야 했다. 준비해온 음식들을 아름다운 그릇에 펼쳐서 나누는 일은 행사의 흥을 돋우는 으뜸의 리추얼이었다. 정성으로 차리고 성스럽게 나눠 먹는 떠들썩한 야단법석은 늘 넘치게 풍성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말했다. 마법처럼 서로의 경계를 녹이면서 점차 한솥밥 친구가 되어갔다. 코로나로 음식을 나눌 수 없게 되자, 모임은 앙꼬 없는 찐빵처럼 서운해졌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일이 얼마나 짠하고 성스러운 일인가 새삼스레 느꼈다.
하루하루를 구성하는 순간들을 새삼스럽게 만나는 일. 내 손으로 옷을 지어 입어보는 일, 공간을 나만의 성소로 만드는 일, 음식을 정성스레 만들고 아름답게 내어놓는 일들은 일상을 섬세하게 주시하도록 한다. 허둥거리며 흘려보내거나 쫓기며 떠밀리지 않고 그 위에 온전히 머물도록 한다. 수영장에서 물을 가르며 나아갈 때, 물살의 결들까지 하나하나 느끼는 것처럼, 흘러가는 시공간의 입자들을 좀 더 예민하게 만지고 알아차리게 해준다. 이것은 사실, 자본이라는 시스템이 전력으로 돌려대는 무한 소비의 쳇바퀴로부터 나를 구해내는 일이다. 다루기 좋은 호갱이 아니라 삶의 주체가 되는 일이다. 인생이라는 고해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유영하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리추얼의 힘이다. 벗들이 함께하면 더욱 좋다. 함께 물살을 헤치며 나아가다 보면 문득 미소처럼 희열의 순간이 밀려들 것이다.
끝으로 고백 하나. 혼자 익힌 근본 없는 나의 수영 실력은 ‘고래는커녕’이어서 늘 레인의 후미를 지키고 있지만 나름 충만한 수영이라 주장하며 오늘도 동요 없이 유유자적!

- 제미란
- 감우산방 대표. 의상스타일리스트, 아트 워크숍 리더. 『길 위의 미술관』 『나는 치명적이다-경계를 넘는 여성들, 그리고 그녀들의 예술』의 필자. 참여연대 느티나무 아카데미 강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리추얼 워크숍> 등 다수의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wanda21@daum.net
사진 제공_필자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6 Comments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코너별 기사보기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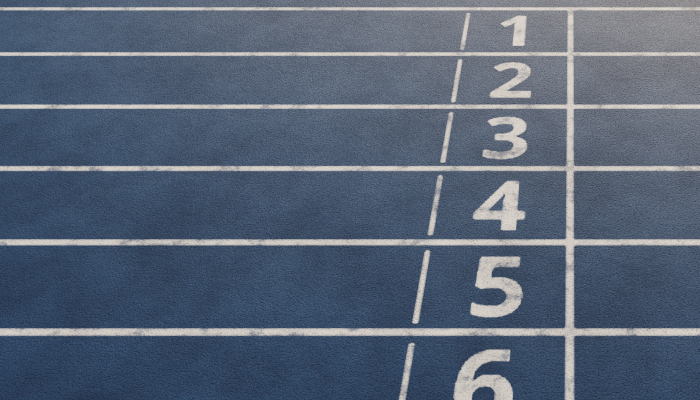






산책 같은 글.
오솔길을 걸으며 아작아작 밟히는 낙엽과 흙. 돌. 나무뿌리의 감촉이 느껴지는 감각적 글.
리추얼이 삶이된 가벼운 삶에서 나오는 공기같은 글이 가볍게 미뉴엣을 추는거 같다.
나의 의례,
나의 리추얼을 만들어야겠어요
매일의 삶을 지키는 신성한 토대
리추얼의 힘
공감이 갑니다
매일의 삶을 지키는 신성한 토대
리추얼의 힘
기대만점이네요
잔잔한 삶이 그려지네요.
잘 읽고 갑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네요. 리추얼의 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