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비 – 대면
비대면 상황이 이어지면서 ‘비대면’이라는 말에 대한 의심도 길어진다. 비(非)대면을 직해하면 ‘대면이 아니다, 대면이 아닌 다른 무엇이다’이므로 비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된다. 무엇일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똑바로 마주 앉아 서로를 뚫어져라, 보지 않았는가? 이것이 왜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일까? 사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수업은 대개 온택트(ontact) 방식의 ‘간접 대면’으로 이루어졌다.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직접 대하지 않고, 중간에 무엇을 두고 대면하는 수업 말이다. 그런 탓에 우리는 서로를 만났다고도 할 수 없고 만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없는 이상한 뒤끝에 시달렸다.
그러니 간접-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왠지 공허한(?) 반쪽의 만남, 이 이상한 만남 덕분에 누군가를 대면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캐묻게 된다. 비대면의 불완전한 소통을 이야기할 때면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어떤 의구심들, 그러니까 이렇게 속삭이는 삐딱한 질문들. ‘서로를 온전히 만난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가? 채워지지 않는 이 헛헛한 마음이 단지 비대면 때문인가? 헤아릴 수 없는 바로 눈앞의 불통과 무관심은 어찌하고, 비대면이라 서로를 느낄 수 없다니,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을, 그 자체로, 느낄 수가 있는가?’
이상한 우리 – 사이
참 이상하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강철 집 안에서도 자신 안에 또 한 겹의 집을 짓는다. 그 속에는 자기라는 타자, 타자화된 자기가 정주한다. 이 친숙하고도 낯선 이를 알아볼 수 없을 때, 자신이 아닌 타인 속에 집을 지으려 할 때 그곳은 아무도 살 수 없는 유령의 집이 되고 만다. 우리 제각각은 오직 자기 안에 집을 지어 이 세계, 세계 속의 타인을 초대할 뿐이다. 이때 정작 우리를 서늘하게 하는 것은 초대에 응하는 이 또한 실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 타인과 만난다는 것은 홀로 수행하는 역할극 같은 것이다.
물론 아무런 대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 상대의 대사를 채울 수 있는 신호 – 언어적이거나 형상적인 것, 감각적이거나 물질적인 것 즉, 인간이 서로의 존재를 감지하고 공존하기 위해 고안한 다양한 신호 체계를 통하여 이 세계의 풍경을 읽고 쓴다. 당신과 닮았지만 다른, 나의 대본을 쓰고 그린다. 우리는 오직 이러한 신호들의 집합을 경유하여, 언제나 간접적으로, 우리 사이에 무엇을 두고 당신과 만난다. 이것이 당신으로 가는 끝없는 길이다.
비상한 우리 – 효과
한 번쯤은 꿈꿨을 것이다. 텔레파시 같은 것.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도, 애써 서투른 말이나 특별한 선물을 하지 않아도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었으면, 누가 읽어주었으면. 이런 무매개의 소통을 사전에서는 심령 현상이라 부른다. 누군가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초감각의 꿈이다. 그럼에도 가끔 우리는 마치 텔레파시가 통하기라도 한 것처럼 어떤 대상들과 하나가 되곤 하는데, 그것은 그때 매개된 매체가 – 말이든 몸이든, 기계든 기술이든 – 오직 효과로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매체가 투명하게 뒤로 물러났을 때 우리는 의식보다는 무의식으로, 생각보다는 신체로 그것을 흡수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무심히 잊는다. 이것이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대면의 방식이다.
비대면의 만남은 매체에 대한 망각을 단번에 상기시켰다. 그것은 벤야민의 예견처럼 우리의 “존재 방식 전체와 더불어 인간의 지각 방식”의 변화를 실감하게 했다. 또한, 그것은 역사를 이끌어 온 매체들이 우리에게 끼쳤던 영향 그 이상으로 감각의 질서를 재배치하려 했다. 그것은 나와 대상 세계의 관계로부터가 아니라 그 관계를 이루는 조건, 즉 배경을 바꿈으로써 모든 것이 재편되어야 할 당혹감을 선사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뛰놀았던 공간 : 입체를 잃어버렸고 흡사 새로 태어나기라도 해야 할 것처럼 어떤 절대적인 불가능함을 느꼈다. 그러나 와중에도 몇몇 도전적인 예술가들은 아예 가상공간을 활보하는가 하면, 모자이크화면 속에 남은 이들 또한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 음을 맞추며 합주를 해내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매체뿐 아니라 우리 자신 역시 하나의 (공허한?) 효과로서 존재하는 순간이다.
비상한 감각 – 주머니
이런 상상을 해 보자. 화면 속의 친구가 커피를 내리면, ‘원두 향이 좋은데?’ 하는 대화가 예사라고 해 보자. 한날한시에 접속하면 동시에 모여 공연 리허설을 할 수도, 상대의 온기도 촉각도 완벽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해 보자. 또 다른 현실로 진입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가 없어도 아니 우리 몸 자체가 가상 세계를 일으키는 동인(動因)으로 진화했다고 해 보자. 그러면 비대면의 공허가 즉, 효과가 더는 시늉이 아니라 실재가 될 수 있을까? 그때는 이런 물음조차 무용하겠지만, 적어도 현실과 비현실을 가르는 기준이 감각의 지각이 아닌 다른 무엇이지 않을까?
아주 먼 이야기의 첫 장일지 모르는 지금, 비대면 상황의 예술교육은 감각의 기로보다 인식의 기로를 드러낸다. 비대면으로 획득, 소거되는 감각의 재구축 과정은 동시에 인식의 재고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효과에 의해 존재해 왔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특정한 순간들의 효과라는 것은 현실의 감각 현상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푸코의 말대로 언제나 “현실(reality)은 논쟁적”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예술교육의 공간 역시 예술 자체가 아니라 예술이 하나의 효과로서 사라진 곳, 그래서 예술이 하나의 매개로서 투명해지는 대신 우리 자신, 우리 삶을 비추도록 하지 않았는가? 이때 매개된 예술이 단지 공허한 도구인가? 예술은 투명한 진실이자 진실된 허구로서 우리 속에 실재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논의는 지각된 사유, 사유된 지각이 교차할 때 가능할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더 많은 현실을 감각할 수 있도록 그 힘이 주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 그곳에서 당신을 만난다는 것,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섣부른 전망은 차치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당신에 대한, 예술에 대한 더 건강한 다툼, 더 많은 선택과 가치를 유예할 수 있는 빈 주머니 같은 것이면 좋겠다. 그래서 비대면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 온몸을 다해 – 당신을 만나러 간다면 좋겠다. 끝이 없는 그 길 위에서 ‘이것은 당신이 아니야’ ‘이것은 예술이 아니야’가 아니라 내 오랜 대본 속의 당신 그리고 예술을 끊임없이 해체하고 재건해가면서 말이다.

- 류현미
- 미술을 기반으로 창작 활동과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2020년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아트프리즘>의 디렉터로 참여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강의.
threenoname@gmail.com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코너별 기사보기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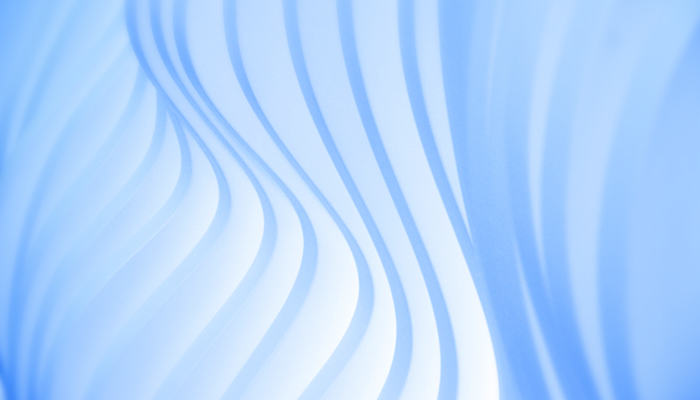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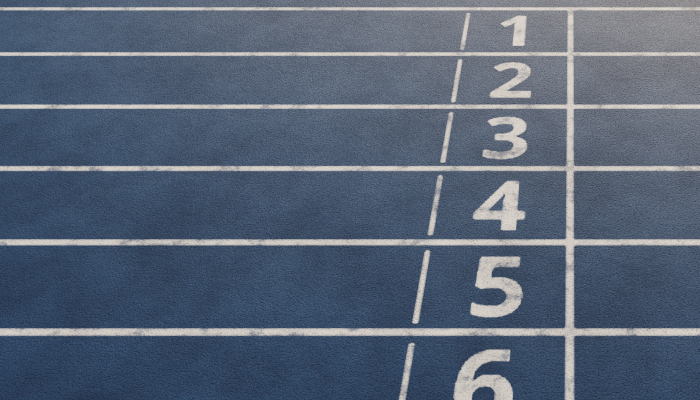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