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일상의 윤활유 되기
임권택 감독의 ‘축제’라는 영화가 있다. 감독은 초상집을 배경으로 인간의 솟구쳐 나오는 다양한 욕망과 감정의 얽힘을 축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고인에 대한 추억을 안주 삼아 한 잔 들이켜는 술과 한날 한시에 모이기 힘들었던 사람의 만남. 이것은 터부시했던 죽음을 이야기하는 힘이 되고 스스로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는 장치가 된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부딪히며 축제라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것이다.
일상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들, 그것은 구조화된 일상에 숨겨져 있거나 금기시되곤 한다. 하지만 중요한 가치일 때가 더 많으며, 반복되는 것은 일상도 실은 어디론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때 사람이 주체가 되어 구조와 방향을 점검해보고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축제’다. 모름지기 축제란, 일상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다 같이 모여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 자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결국, 축제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서로의 관계를 통해 확인하고 점검하며 공유를 통해 구성원의 삶에 선물이 되는 하나의 장인 것이다.



둘째, 낯설고 새롭게 다가가기
2002년 프랑스 곳곳에서 열린 축제에 참가한 적이 있다. 아비뇽과 액상프로방스, 파리 외곽에서 펼쳐지던 ‘우린 아비뇽에 가지 않을 거야‘(통역 명칭)라는 젊은 예술가들의 축제였다. 액상프로방스 축제는 버스 정류소에서 시작된다. 한 명의 무용수가 우체국과 공공건물 등 시내 일대를 다니며 공연을 펼치고 관람객들은 그 뒤를 따라다닌다. 무용수와 관람객이 무리 지어 다니는 모습은 회색 도시를 물들이는 물감처럼 보였다.
축제는 도시를 새롭게 물들이며 시작됐다. 이방인이 아닌 축제의 구성원이 되어 예술가와 함께 보고, 걷고 느끼며 모든 것이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 액상프로방스를 떠올리면 아직도 그때의 느낌이 생생하게 떠올라 가슴이 설렌다.
‘우리는 아비뇽에 가지 않을 거야‘라는 축제는 파리 외곽 우범지역 철도창고를 극장과 카페, 사무실로 단장한 젊은 예술가들의 축제다. 그들이 보기에 ‘아비뇽’은 너무 상업적인 마켓이 이기에, 그 틀을 벗어난 예술 본연의 힘을 구현할 수 있는 공연예술축제를 지향하고 있었다. 예술의 사회적 치유기능, 즉 축제를 통한 범죄율 증감의 기준으로 정부지원도 받고 있었다. 나는
더 많은 이들과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려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에 감동했다. 또한 축제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셋째, 고민하고 공부하기
영화 ‘말하는 건축가’에서 정기용 선생은 ‘나이가 들수록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나는 누구이고, 세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하는 이런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을 논하며 늙어 갈수록 우리의 생은 더욱 풍성해진다는 의미로 짐작된다.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는 요즘, ‘지역경제활성화’, ‘브랜드가치창출’이라는 구호가 심심찮게 들린다. 본질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질문과 대답보다는 결과만 앞서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특정 가치에 대한 자신감은 축제의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가치들의 경쟁력, 소통 방식, 공유의 정도에 따라 브랜드 가치는 새롭게 창출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제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는 상시적인 노력이야말로 지속가능하고 풍성한 축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축제의 본질은 종교와 문화에 대한 신성한 시간이나 특별한 기간에 대한 기념, 계절의 순화와 변화에 있다. 지역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것도 그 때문이다. 오늘날, 새롭게 만들어지는 축제는 역사와 전통에 뿌리를 두고 동시에 사회 공동체를 결속시키거나 교육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각 지역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축제들, 그 의미와 방향을 짚어봤다.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코너별 기사보기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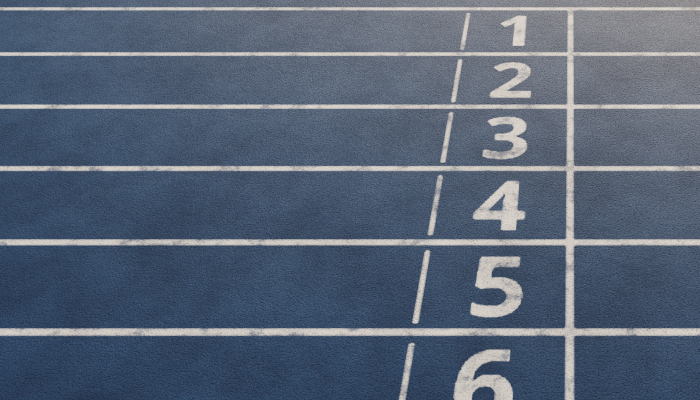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