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내가 이끄는 한국문화기술연구소(Korean Culture Technology Institue, KCTI) 창립 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다(多)문화 가정초청 음악회를 열었다. 마침 다문화 음악회가 열린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GIST)은 석•박사 학생의 약 10%가 23개국 이상의 외국인 학생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캠퍼스여서 그 의미가 더했다. 자고로 음악은 만국공통어다. 특히 베토벤의 음악세계는 세계인류의 화평과 공존을 음표의 가장 밑뿌리에 담고 있다. 다문화 음악회에서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알게 모르게 편견과 차별의 부당함에 한숨 짓고 눈물 흘렸을 다문화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일궈갈 멋진 하모니가 담긴 다문화의 미래를 꿈꾸어야 하기에.
# 오늘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 및 그 자녀 수는 50만여 명에 이른다. 현재는 5,000만 인구의 1%에 불과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10% 아니 그 이상의 비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시대를 ‘다(多)문화 시대’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두루 인정하고 존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배타하고 차별하는 것에 더 익숙한지 모르겠다. 물론 이것은 ‘더 큰 대한민국’,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심각한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 언젠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이유 없는 차별에 몹시 화가 난 적이 있었다. 차별에 분노하며 항의도 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다. 아니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나 자신을 포함해 우리는 정작 이 땅에서 공부하고 결혼하며 살겠다고 애써 찾아온 이들에게 혹시 쓸데없는 편견과 이유 없는 차별을 드러내진 않았던가 하고 말이다. 어려서부터 ‘5,000년을 이어온 단일민족’이란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라온 사람들에게 여전히 다문화는 생소하고 생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다문화는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미래다. 함께 더불어 아름답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내가 꾸리고 있는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창립 1주년을 계기로 다문화 가정 초청 음악회를 연 까닭도 이런 맥락이 깔려 있다.
# 사실 ‘차이’와 ‘차별’은 글자 하나가 다른 듯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세계를 가리킨다. 차이는 가치를 담고 있다. 아니 차이 그 자체가 가치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존중 받을 가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한 지 모른다. 우리는 차이의 가치에 대해 인색하다. 아니 차이를 용납하길 꺼린다. 다름을 포용하는데도 서툴다. 문화는 차이의 텃밭에서 자라고, 예술은 다름의 숲에서 번성한다. 차이가 존중되고 다름이 인정되어야 문화도, 예술도 숨을 쉬고 자라나고 융성하는 것이다. 역으로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고 다름이 외면된 채 용인되지 않는다면 문화도 움츠리고 예술도 질식한다. 그만큼 차이와 다름은 소중한 것이다. 다문화 음악회를 통해서 함께 느끼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서로의 다름과 차이가 더 이상 차별의 근거가 아닌 존중 받고 함께 할 가치의 토대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득이었다. 정말이지 차이는 가치 있고 다름은 아름다운 것이다.
# 내가 처음 차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발견’했던 것은 지금부터 40여 년 전 내가 배재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다.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배움터라는 자부심 하나로 백 년하고도 수십 년을 더 버텨온 학교였다. 지금은 학교 터가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서울 서소문에 학교가 있었고 내가 공부했던 교실은 1916년에 지어진 아주 고풍스런 교사(校舍)였다. 그 당시 한 학급은 70명이 정원이었고 그런 반 10여 개가 모여 한 학년을 이뤘다. 지금에야 그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풍속도는 그러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남들이 보면 모두 똑같이 짧게 머리를 깎고 똑같은 검정색 교복을 입혀 놓아 언뜻 보기엔 구별 조차 쉽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정작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의 별명을 지닐 만큼 너무나도 달랐다는 점이다. 정녕 그것은 내게 있어 ‘다름의 발견’이었던 셈이다.
# 그렇다. 본래 모두 다른 것이다. 각자의 지문(指紋)만큼 말이다.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다지만 지문이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니 이제까지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해 온 이래 그 모든 사람을 다 따져봐도 같은 지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으리라. 지문이란 나의 정체성(identity)의 무늬다. 그리고 나만의 차이 곧 남과 다름의 문양이요, 내 정체성의 자연스런 발로다. 그저 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만의 것이 우러나온 것이 곧 지문에서 드러나는 차이요, 다름 아니겠는가. 그런데 저마다 다른 지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했던가? 이제까지 우리 사회, 우리 학교, 우리 문화는 차이와 다름을 여간 해선 용인하지 않았다. 아니 남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스스로가 ‘다른 꼴’을 보지 못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르다는 것은 자칫 왕따의 조건은 될지언정 존중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래서 차이와 다름을 숨기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되레 같은 척 했다. 모두 다른 무늬를 하나의 무늬처럼 위장하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이 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를 살아내기 위한 고육책이었는지 모른다.
# 차이를 배제하고 다름을 시기할 때 사회는 삭막해지고 문화는 실종되며 예술은 질식한다. 문화가 펄떡이듯 살고 예술이 경이롭게 펼쳐지려면 남 따라하는 유행, 즉 훼션(fashion)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열정 곧 패션(passion)에 몰입해야 한다. 유행은 자칫 차이와 다름을 매몰시키지만 열정은 차이와 다름을 도드라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서 오리진(origin)이 나온다. 그러니 유행 즉 훼션에 눈 돌리기보다는 열정 곧 패션에 몸을 던져라! 이것이 중요하다. 세상 유행(fashion)을 쫓기보다는 내 안의 열정(passion)을 소중히 여기고 나만의 차이, 나만의 다름을 온전히 지켜내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는 차이를 통해 발전하고 예술은 다름의 토양 위에서 꽃피기 때문이다.

글쓴이_정진홍
광주과학기술원(GIST) 다산특훈교수 • 한국문화기술연구소(KCTI) 소장
*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코너별 기사보기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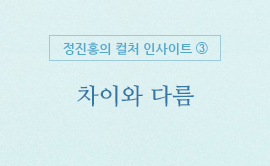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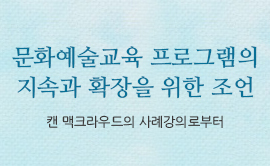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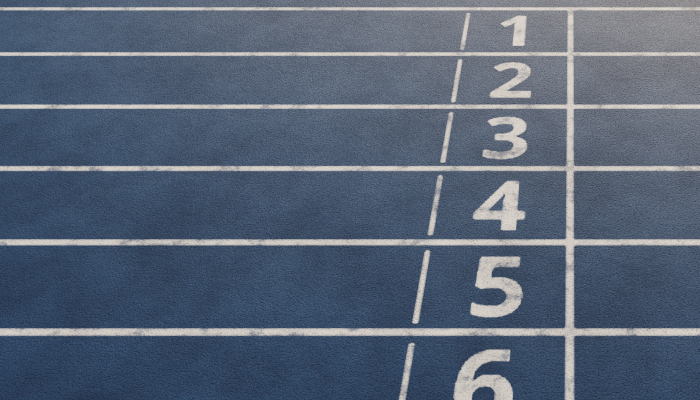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