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여름, 전쟁이 선포되었을 때 독일 작가 토마스 만은 이런 글을 발표했다.
“전쟁 발발 소식에 시인의 가슴이 얼마나 크게 타오르는가? 우리는 전쟁을 믿지 않았다. 우리의 정치적 통찰력은 유럽 파국의 필연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도덕적 존재로서 우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지금의 세계, 지금 우리의 세계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 평화의 세계를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 세계는 구더기와 정신의 해충들로 들끓고 있지 않던가? 썩어가는 문명의 물질들이 발효해 악취를 풍기고 있지 않던가? 이 지긋지긋한 평화의 세계가 붕괴하는 것을 예술가들이 어찌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느낀 건 정화와 해방, 거대한 희망이다.”1)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까지 개입하게 된 첫 번째 세계대전. 그 시작을 이렇게 환호하며 맞이했던 건 토마스 만 혼자가 아니었다. 에른스트 톨러, 로베르트 무질, 알프레드 되블린 같은 작가들, 이후 다다이스트로 활동하는 후고 발, 게오르그 그로츠 등의 예술가들도 같은 이유로 전쟁을 새로운 시대의 출발로 받아들였다. 당시 한 문학잡지는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적지 않은 시인들이 전쟁의 발발을 거대한 모험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이 커다란 사건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질문되지 않는다. 그것이 모호하고 위험 없는 현 상태를 지양하고, 이 시대 젊은이들 스스로가 빠져있던 비행동성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여긴다.
예민한 감성을 통해 당대 삶의 상황을 포착해내는 시인과 예술가들을 그 시대의 감수성이라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1차 대전 직전 유럽의 정신적 상황이 징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군복을 즐겨 입던 황제 빌헬름 2세의 군사주의적 통치하에서 독일은 특히, 엄격하고 권위주의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건너온 새로운 감성의 예술사조는 ‘비도덕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며 금기시되었고, 작가와 예술가의 활동 및 관련 출판물은 당국의 검열을 받아야 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만한 힘과 대안을 가진 정당도, 정치세력도 없었다.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이 규제된 갑갑한 현실 속에서 그를 극복할 사회, 정치, 문화적 대안도 찾을 수 없던 젊은 작가와 예술가들은, 토마스 만의 말대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긋지긋한 평화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은 아무런 정신적, 창조적 에너지도 없는 시간을 끝낼 해방의 사건으로 여겨졌다. 전쟁, 더구나 전 유럽이 개입하는 세계대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시간을 급진적 변화의 시간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던 무력감을 역사의 중심을 살아간다는 자긍심으로 바꾸어줄 것이었다. 전쟁이 극적인 갱생과 강렬한 체험의 열망을 충족시켜 주리라 믿은 많은 작가, 예술가들은 자발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런 열정을 무너뜨린 건 전쟁의 참혹함이었다. 1차 대전은 이전의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현대전의 시작이었다. 자동소총이나 전차 등의 기계화된 무기는 영웅적 행위의 가능성을 없애고 군인을 전투용 소모품으로 전락시켰고, 처음 전쟁에 동원된 비행기는 전후방 구별 없이 폭탄을 쏟아 부었으며, 적군과 아군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독가스도 처음 사용되었다. 6백만 명의 민간인과 9백만 명 이상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 대신 평화를 원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종종, 전쟁이란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재앙이나 병원균 같은 거라고 여긴다. 하지만 한 사회 내부의 정신적 상황은 어떤 식으로든 전쟁의 징후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사회의 정신적 분위기가 전쟁이라는 극단적 분출을 향하게 된다면, 그것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섣부른 권력자의 도발보다 훨씬 클 것이다. 전쟁방지를 위해 ‘튼튼히’ 해야 할 ‘국력’이란 이런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 Thomas Mann, Gedanken im Krieg, Die neue Rundschau 25, 1914. Manifeste und Dokumente zur detuschen Literatur 1910-1920, Expressionismus. hg. Thomas Anz, Michael Stark, 292쪽에서 재인용.

글 | 김남시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베를린 훔볼트 대학 문화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에서 미학과 문화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예술과 문화적 현상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성을 통한 세계 인식이라는 미학 Aesthetics 본래의 지향을 추구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권력이란무엇인가』, 『한 신경병자의 회상록』, 『노동을 거부하라』, 『발터 벤야민의 모스크바 일기』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좋아요
1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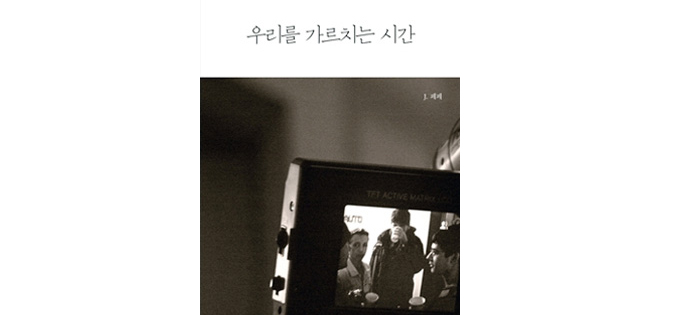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