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사상가 다산 정약용 선생(1762-1836)은 “나라를 걱정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다(不憂國非詩也)”라고 썼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농민들의 민란이 가장 많았던 19세기를 살았던 지식인으로서 ‘시(예술)’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한 언급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문장은 시대착오적인 명제가 아니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듯이, 민주주의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시인-시민, 혹은 시민-시인으로서 제 할 일을 다해야 하는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는 셈이다. 다만, 나는 이 명제에 등장하는 나라(國) 대신에 ‘사람(人)’을 넣어 지금 여기에서 사유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시라는 말은 ‘예술’일 수 있고, ‘사상’일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두루 포괄하는 말일 수 있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1997년생 작가 안온의 첫 책 『일인칭 가난: 그러나 일인분은 아닌』은 가난의 경로와 가난의 문법을 뛰어나게 잘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가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20여 년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온 작가가 자신이 겪어온 가난의 실상을 그린 르포르타주(reportage)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사회학 보고서나 빈곤 계측 모델로도 잡히지 않는 구체적인 가난의 실상과 외로움을 책의 행간에서 만날 수 있다.
어느 시인이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신경림)라고 썼지만, 경제적 자유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난은 이유 없는 형벌이 되었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도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섬세한 이해와 접근은 여전히 부족하다. 작가가 초등학생 시절 멸균우유를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멸균우유를 주는 방식에는 배려가 없었다고 쓴 문장에서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떠올린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방학식 끝나고 17번, 28번은 집에 가지 말고 교무실로 와서 우유 받아 가세요.” 어떤 상처와 모욕감은 만지면 만질수록 덧나는 오랜 ‘내상(內傷)’이 된다.
그래서였을까. 『일인칭 가난』의 부제가 ‘그러나 일인분은 아닌’이라는 점에 눈길이 오래 간다. 이 의미에 대해 안온 작가는 “내 가난은 나에게 있어서 소명(召命)이다”라고 쓴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 가난의 이야기가 두꺼워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가 우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문학도가 된 작가가 외로울 때마다 백석의 시 「흰 바람벽이 있어」(1941)에 등장하는 구절을 읊조리며 “이것은 나의 기도문이 되었다”라고 쓴 문장에서 나는 격렬한 통증을 느낀다. 안온 작가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어가도록 태어났다”라는 백석의 구절을 읽으며 큰 위로를 받은 것이다. 궁핍의 가난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가난의 길을 걷고 있는 안온 작가의 앞날에 문운(文運)이 함께 하기를.
‘동학하는 삶’을 실천한 무위당 장일순
최근 한평생 ‘뒷것’의 삶을 살았던 예술가 김민기 선생(1951-2024)이 작고하셨다. 하지만 ‘뒷것’의 원조 격은 무위당 장일순 선생(1928-1994)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다. 가톨릭 연구자인 한상봉의 『장일순 평전』은 ‘걸어 다니는 동학’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일순의 삶과 생명·생태 사상을 온전히 풀어놓은 평전이다. 장일순은 1928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미학과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에 돌아와 40여 년간 원주에서 사회운동을 해온 실천적 지식인이다. 특히 1970년대 지학순 주교, 김지하 시인, 생협 운동가 박재일 선생, 가수 김민기 선생 등과 더불어 소위 ‘원주 그룹’의 핵심 멤버로서 민주화운동과 생명 운동을 실천했다.
하지만 장일순은 노자의 무위(無爲) 사상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살고자 했고, 자신의 호 또한 그렇게 지었다. 평전을 읽노라면 ‘하지 않음으로써 행한다’라는 무위 사상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탄복하게 된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허명(虛名)을 경계하며, ‘밑으로 기어라’라는 하심(下心)의 삶과 사상을 실천했다. 김종철 선생은 장일순 선생이 작고한 후 그의 강연과 대담 등을 엮은 책 『나락 한 알 속의 우주』(1997)를 펴냈다. 장일순은 책을 쓰는 대신에 수많은 ‘글씨’를 썼고 난초 등 그림을 그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누군가가 글씨는 ‘글의 씨’라고 했던가. 선생이 생전에 남긴 붓글씨는 2,500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적어 나누어주었다. 한상봉은 “수신자가 정해진 글씨”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猪怕肥人怕出名)” 같은 글귀는 그렇게 탄생했다.
평전을 보는 내내 선생이 ‘혁명은 따뜻하게 보듬는 것’이라고 한 말이 긴 여운을 남긴다. 어쩌면 문화예술교육 또한 그런 것이 아닐까. 장일순 선생이 해월 최시형의 삼경(三敬) 사상을 강조하며, 하늘을 공경하고[敬天], 사람을 공경하며[敬人], 사물을 공경하라[敬物]고 한 가르침은 글로벌 복합 위기(global polycrisis) 시대의 오래된 미래이자 새로운 문화적 비전이 아닐까 한다. 내 곁의 ‘사람을 하늘처럼 여기라’(事人如天)라는 사상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즐겁게 참조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가 말하는 ‘식인(食人) 자본주의’(carnival capitalism)가 우리의 미래일 수는 없다.

- 고영직
- 문학평론가.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경희대 실천교육센터 운영위원, 웹진 [아르떼365] 1기 편집위원장을 지냈으며, 춘천문화재단 [POT] 편집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삶의 시간을 잇는 문화예술교육』 『인문적 인간』을 비롯해 『자치와 상상력』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공저), 『생애。전환。학교』(공저) 등을 펴냈다.
gocritic@naver.com - 책표지 제공_마티, 삼인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코너별 기사보기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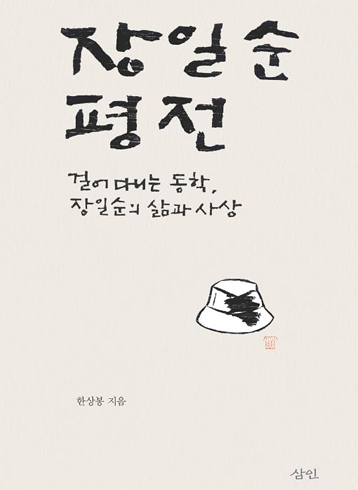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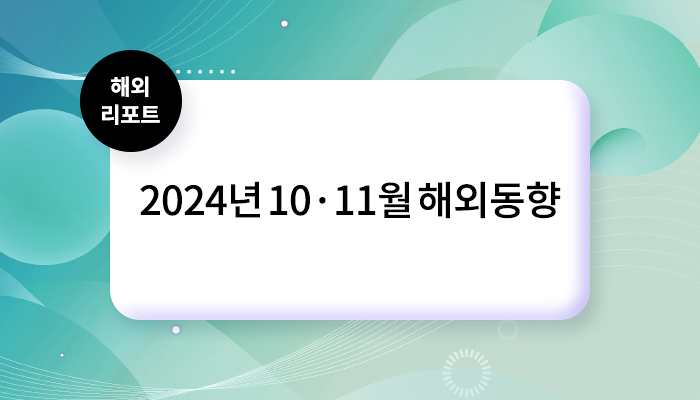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