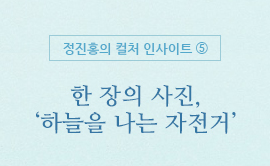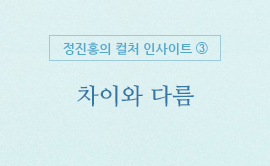디어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다르게 말하면
책으로 읽는 문화예술교육
새벽 어스름이 스러져 가고 있는 한겨울 들판을 기차가 달리고 있다. 유일민, 유일표 형제는 중학생 나이에 처음으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싣고 한강철교를 건너고 있다. 선잠을 자던 동생이 깨면서 얼결에 “성, 여그, 여그가 워디랑가?” 하고 내뱉자, 형은 동생 입을 틀어막는다. 서울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사투리부터 고쳐야 한다는 담임선생의 말 때문이다. 조정래의 소설 『한강』의 첫 장면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을 꿈꾸던 전라도 아이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사투리를 버리는 일. 카페에 앉아 ‘나는 보아뱀이라카능 기 정글에서 젤로 무스븐 기라꼬 생각했데이.’로 시작하는 『애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