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열풍이 거세다. 최근의 생활문화 열풍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소확행(小確幸) 시대를 맞아 ‘여유롭게 살 권리’(강수돌)를 실현하고 ‘한가로움의 민주화’(한병철)를 구가하려는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다. 또 지난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난 현상과 부합한다고 보아야 옳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롸잇나우’ 실현해야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로의 전환은 미국에서 시작된 킨포크(kinfolk) 열풍 이후 휘게(hygge, 덴마크), 라곰(lagom, 스웨덴), 오캄(au calme, 프랑스)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변주되어 적극 권장된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만둘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분명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저녁이 있는 삶’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설령 그런 삶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시대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을 위한 활동으로 자족한다는 점이다.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생은 늘어났지만, 나와 우리 안의 일상적 습속(Habitus)에 맞서 저항하려는 문화시민의 탄생은 아직 더디다. 대량 생산-대량 유통-대량 소비-대량 폐기처분이라는 악무한(惡無限)의 소비사회 중독에서 벗어나 ‘탈성장’ 시대의 새로운 문화적 모델로서 생활문화활동을 (재)사유하려는 시민의 탄생은 요원하다. 내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여기 대한민국 사회에 작동하는 특유의 견고한 ‘리듬’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운동적 지향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지 않는 한 지금의 생활문화 열풍은 생활체육운동이 그러했듯이 취미와 여가활동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자족적인 동아리 활동 내지는 그들만의 메이커(maker, 手作) 문화를 소비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당신의 취향을 존중한다는 의미의 ‘취존’ 이상의 활동으로 전환하려면 모임의 자폐성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활문화는 신자유주의 시대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국가’와 ‘시장’이라는 제도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피동형 동사 같은 삶이 아니라, 비움의 삶을 통해 삶의 예술(lebenskunst)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동사’적 삶의 관점과 태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주체의 자발성과 분방한 창의력이란 의미의 소비자가 아니라 의미의 생산자가 되는 세계를 적극 창조하려는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2항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포괄되는 생활문화란 라이프스타일 혁명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우리 삶이란 그런 법적 규정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아니 포괄되어서도 안 되는, 무수한 우연성과 다양성의 결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적 예술인의 개입과 관계없이 주민 개개인이 여가시간 안에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교류하는 활동”으로 규정되는 생활문화란 지금의 견고한 노동사회를 지탱하려는 여가사회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의 생활문화정책이 성과사회 혹은 피로사회가 낳은 번아웃 신드롬 현상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설계된 정책사업이라는 ‘혐의’를 갖는 것은 바로 그 점 때문이다.
생활문화정책의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녁이 있는 삶’에서 ‘삶이 있는 저녁’이란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국가 시스템에 철저히 의존하려는 삶 자체를 (재)사유하며 자본주의적 교환가치가 아니라 내 안의 ‘사용가치’를 복원하고 부활하려는 문화적 모델과 가치지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나는 이 점에서 공허하기 짝이 없는 ‘삶의 질’이라는 지표가 아니라 이제는 ‘삶의 격(格)’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어쩌면 이 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2003년 간행한 「생애 핵심역량 보고서」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지식에서 역량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더 이상 학력(學歷)이 아니라 학력(學力)이 대세인 시대라는 것이다. 먹고사는 데 쓰잘데기없는 것들을 배우고 익히며 ‘딴짓’을 할 수 있는 학력(學力)의 시대는 결국 로버트 D. 퍼트넘이 말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획득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있다. ‘생활’이 아니라 ‘생존’에 급급해하며 굶주림에의 공포를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한 우리 삶과 내면을 어떻게 바꾸느냐이다. 그리고 모임의 자폐성을 넘어서기 위한 고민 또한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생활문화정책은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주도한다고 하여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파커 J. 파머(Parker J. Palmer)가 “민주주의는 우리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하고 있는 무엇이다”라고 말한 언명은 이 대목에서 음미해야 할 명제가 아닐까 한다. 쉽게 말해 생활문화는 ‘시민성’과 어떻게 접속해야 할지 고민하고 다양한 실천의 경로들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무력(無力)한 존재가 아니라 미력(微力)한 존재이다. 그러나 미력하기 짝이 없는 ‘나-들’이 모여 나와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다른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다른 삶과 다른 문명의 가능성을 염탐하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 고영직_문학평론가
- 문화예술교육 웹진 [지지봄봄] 편집위원을 역임했으며, 경희대 실천교육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치와 상상력』, 『 노년 예술 수업』(공저) 등을 펴냈다. - gohyj@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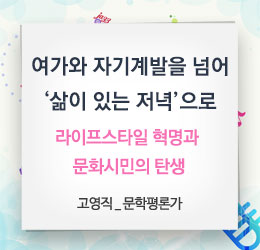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좋아요
0코너별 기사보기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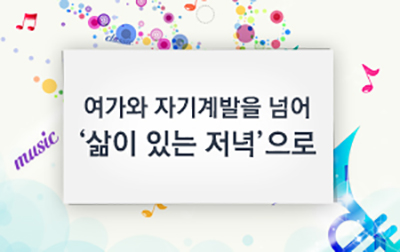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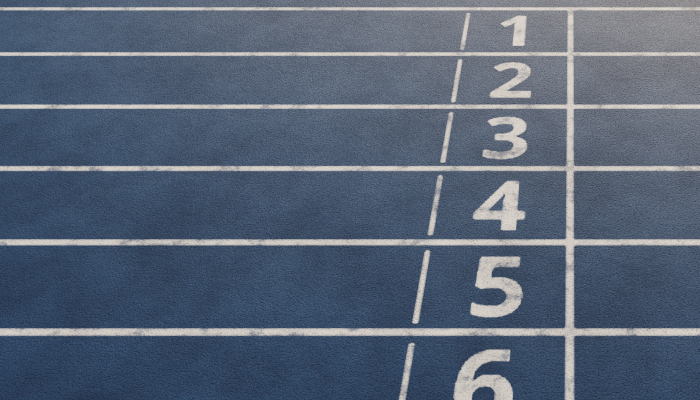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