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두 명의 거장을 마주치듯 만나다
박나경 지음 |
뜨란 | 2013.02.04.
방송구성작가의 글은 기본적으로 기승전결이 분명하다. 시청자의 수준을 고등학생으로 맞춰놓고 누가 들어도 쉽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주제의식이 뚜렷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난해한 소재를 어렵지 않게 만드는 재주가 뛰어나다. 결국 방송작가는 이미지를 염두에 둔 글쓰기에 익숙할 수 밖에 없다.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은 20년 넘게 방송작가 활동을 해 온 작가의 글이다. KBS 라디오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 소개한 100여 명의 인물들 가운데 세상을 아름답게 바꾼 위대한 예술가 12인을 선별해 그들의 삶과 예술 세계를 조명했다.
그래서 이 책만큼 속 깊게 위대한 예술가 12인의 예술세계와 삶을 다룬 책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박나경 작가는 대단한 작품이나 심오한 예술세계를 화려한 문구로 풀어 나가는 고루한 위인전의 형태에서 벗어나 그들의 생활 속을 들여다 보고 상상력을 펼치는 나름의 방법으로 사진 찍듯 보여 주고 있다. 그런 사소한 일상들이 그들을 위대한 거장으로 만드는 바탕이 되었음이 자연스레 증명된다.
사람들은 자코메티처럼 명성 높은 미술가가 어떻게 그처럼 비좁고 허름한 아틀리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곤 했다. 가구라고는 용수철이 튀어나온 소파 하나와 건들거리는 의자 몇 개, 작은 난로가 전부였다. 그의 아틀리에는 수도사들의 엄격한 수행 공간을 연상시켰다. 하지만 자코메티는 자신의 작업실에 만족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작업실을 달리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_185p
굴드는 외투에 베레모를 쓰고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까지 끼고 나타났다. 그의 장비는 일반적인 악보 뭉치와 수건 묶음, 큰 생수 두 병, 작은 알약통 다섯 개, 그리고 특별한 피아노 의자였다. 굴드는 언제나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흥분에 들떠 지휘를 하는가 하면 음악에 맞춰 말 그대로 발레를 하기도 했다. _258p
우디알렌의 ‘미드나잇인파리(Midnight in Paris, 2011)’에서 주인공 소설가 길(오웬 윌슨)이 만났던 1920년 대의 파리로 돌아가 헤밍웨이와 피카소를 만났던 생생한 장면처럼 작가는 브레송의 진실성과 가우디의 다재다능함, 로트렉의 외로움, 호퍼의 쓸쓸함, 굴드의 천재성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 마치 잘 아는 지인을 처음 만나게 해 주는 자리처럼 편안하고 친근하다. 그녀가 묘사한 로트렉과 굴드를 만나보자.
몽마르트르에서 툴루즈 로트렉이 그림만큼이나 열중했던 것이 있었다. 술과 댄스홀이었다. 그는 예술가들이 즐겨 찾던 ‘샤 누아르’와 샹송가수 브뤼앙이 운영하는 ‘르 미를리통’에서 저녁마다 술을 마셨다. ‘물랭 드 라 갈레트’ 같은 무도회장의 열띤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도 좋아했다. 그럴 때면 담뱃불을 붙이고 난 까만 성냥개비를 연필 삼아 이런저런 종잇조각에다가 스케치를 하느라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로트렉은 관찰자였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에게로 향했다. 댄스홀은 웃음 뒤에 감춰진 인간의 복잡다단한 심층을 들여다보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이었다.
_81p
굴드는 여러 가지 음악적 실험을 거듭하는 가운데 책을 읽고, 숲을 산책하고, 새로운 레퍼토리를 연구하고, 즉흥 연주와 작곡을 했다. 사람들이 기이하게 혹은 산만하게 느꼈던 그만의 독특한 연주 습관도 이때 굳어졌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닐 때면 그 음을 따라 허밍으로 노래를 부르느라 그의 입도 부지런히 움직였다. 마치 건반 속을 파고들기라도 할 듯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전후좌우로 흔들었다. 때때로 건반을 떠난 손은 지휘를 하듯 허공을 휘저었다.
일부에서는 과시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런 의견은 오해에 불과했다. 그의 동작은 피아노와 연주자가 하나가 되는 순간, 온전한 몰입에서 분출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었다. 무대가 아닌 것에서 홀로 연주할 때도 그의 몸짓은 똑같았다. _256p
가장 친한 친구가 그에 대한 세간의 오해에 대해 해명하는 듯한 모습이 느껴질 정도이다. 책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마치 위인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보는 듯 그려진다. 모든 드라마가 그러하듯 그 사람에 대한 진지한 천착은 약하다. 하지만 눈 앞에 그리듯 펼쳐지는 이야기의 플롯이 재미있고 큰 틀에서 오해 없을 만큼 정확해서 처음 근대예술의 대가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무리없이 권할만한 책이다. 책을 모두 읽고 나면 12명의 거장을 마주친 듯한 착각이 든다. 시각적인 글쓰기의 달인이 써내려 간 위인전은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닐까.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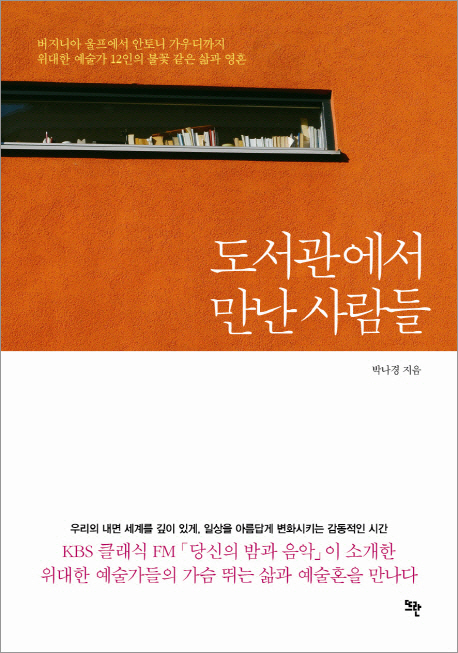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