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도시의 탄생과 부활: 진도와 전주의 사례
창의적인 도시는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할까? 또한 왜 정체되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지역이 경제적·사회적 변화 속에서 정체성을 잃고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전라남도 진도와 전라북도 전주의 사례를 통해 이 주제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진도는 문인화, 소리, 춤 등 전통 문화예술이 꽃피는 곳이다. 초등학생부터 예술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현재 진도가 창의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주 역시 소리, 의복, 공예, 전통가옥 등 전통 예술을 계승하고 있으며 예술교육도 활발하다. 그러나 진정한 창조도시라고 부르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창조도시는 다양한 요소가 융합하여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곳이다. 이때 창조성은 문화산업과 창조산업으로 이어지며, 지역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온다. 진도와 전주의 현재 모습은 문화예술의 보존과 교육만으로는 창조도시로 도약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예술 도시의 역사와 현재
진도와 전주는 한때 명실상부한 창조도시로 자리매김한 곳이었다. 진도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고, 조선시대에 해상무역이 감소했음에도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모여들며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켰다. 전주는 육로 물류의 거점으로, 다양한 인재와 문화가 교류하며 사상, 문화, 예술이 꽃피었다. 이곳에서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꿈을 품은 오목대와 천주교, 동학운동 성지가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 지역은 창조성을 상실하게 되었을까?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커뮤니티 자본의 약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필자는 책 『커뮤니티 자본론』에서 제주의 창업생태계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자본을 서로 다른 커뮤니티가 만나 창의적으로 융합하며 창발성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정의했다. 제주의 경우 최근 20여 년 사이에 문화이민자의 유입으로 지역민과 이주민이 만나고 융합하며 창발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다. 한편, 진도와 전주에서는 전통문화와 예술이 계승되고 있지만, 본질적인 창조성은 점차 상실해 왔다.
창조성을 되찾기 위한 전략
그렇다면 창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다행히 케이팝, 영화, 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의 전 세계적 인기가 K-푸드, 한복, 조선팝 등으로 확장되며 지역에도 큰 기회가 찾아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발달로 지역이 콘텐츠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오프라인의 강력한 콘텐츠와 커뮤니티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구심력으로, 온라인은 이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 원심력으로 작용한다. 이 둘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은 창조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지역의 강점을 살리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 우선 지역의 다양성을 높이고 서로 다른 커뮤니티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융합과 창발성이 일어나고,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을 예로 들면, 한국 지역에 관심 있는 외국 창작자들이 지역에 머물며 현지 창작자들과 교류하는 것이다. 또한 예술가가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인재와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를 통해 예술가 정신과 기업가 정신이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창조적 학습의 장
지역에는 전문적인 예술 기술을 가르치는 전통적 ‘예술교육’보다는 ‘창조적 학습’의 장이 필요하다. 각 주체가 도전하고 실천하며 타 분야와 연결되고 융합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실천 커뮤니티(CoP)가 그것이다. CoP는 실리콘밸리의 창발성 비결로 꼽히는데, 한국에서는 문화예술, 문화기획 분야에 한정되어 도입된 한계가 있었다. CoP가 진정한 창조적 학습의 장이 되려면 경계를 넘나드는 실천 커뮤니티여야 한다. 지역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커뮤니티의 융합과 창발을 통해 예술의 본질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존의 예술 장르와 지원 체계의 칸막이를 넘어 다양한 커뮤니티와 만나 예술을 진화시킬 때, 지역은 창의적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요컨대 지역이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의적 인재들과 교류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커뮤니티 자본 강화 전략이 요구된다. 그렇게 할 때 지역은 창조와 혁신의 중심지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정환
- 작가, 액셀러레이터, 지역변화 디자이너. 폰트에디터 개발로 장영실상을 수상한 개발자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 전문사 학위를 취득한 기술과 예술의 경계인이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을 7년간 역임했으며, 저서로 『밀레니얼의 반격』 『커뮤니티 자본론』이 있다.
drawnote@gmail.com
페이스북 @drawnote
인스타그램 @drawnote
2 Comments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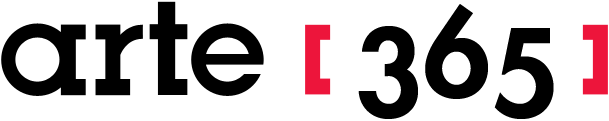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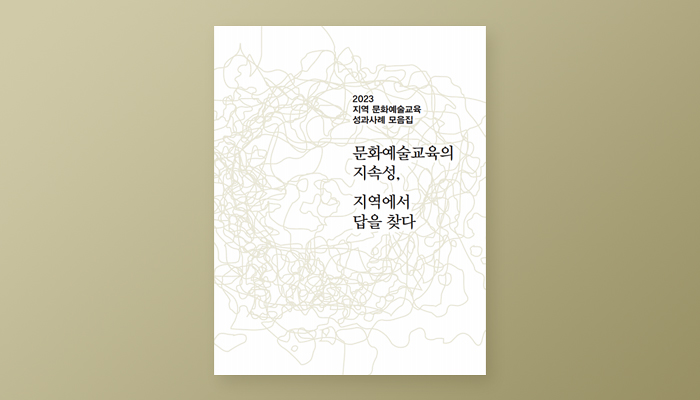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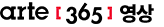
경계를 넘어서 :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지평
지역을 위한 창조와 혁신 전략
잘 보고 갑니다
경계를 넘어서 :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지평
지역을 위한 창조와 혁신 전략
기대만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