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가에게 배우는 무용 아닌 무용 수업. 아르떼랩 두 번째 클래스이자 매년 5월 넷째 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과 함께한 이번 클래스의 콘셉트는 그랬습니다. 과연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참가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스태프의 한 사람으로서 준비과정 내내 드는 그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시작함과 동시에, 아니 더 정확히 김윤진 무용가가 참가자들을 움직이게 한 순간, 그 모든 것이 쓸데없는 노파심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번 클래스에서 무용 전공자가 덕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글쎄요. 훌라후프 돌리는 동작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정도일까요?
이번 클래스는 한마디로 ‘인간’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3시간의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인간의 내적, 외적 세계를 밀도 높게 축약해 경험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며 마루 위에 모인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뚜벅뚜벅 마루를 걸으며 마주치는 이들과 포옹하며 관계를 만듭니다. 누군가와 나란히 짝을 이룬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암흑을 걷다가, 다시 혼자가 되어서 사람들과 부딪치며 여전한 암흑 속을 헤맵니다. 그러다 손끝이 마주 닿은 사람을 끌어당겨 내 곁에 두고, 그가 또 누군가를 끌어당겨 우리의 곁에 두고, 그가 다시 누군가를 우리의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모두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이 과정은 끝이 납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울컥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어둠 속에서 마지막 두 사람의 손을 잇기 위해 모두가 끊임없이 움직이던 그때입니다. 모두 눈을 꼭 감은 채였고, 자신이 맞잡은 손이 누구의 손인지도, 아직 이어지지 않은 두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오로지 하나의 덩어리가 되기 위해 안으로 안으로 좁혀 들던 이들의 움직임에 혼자 찡해졌습니다. 정작 그 작은 덩어리를 만들어낸 참가자들은 자신의 움직임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여전히 눈치채지 못하고 있겠지요.
수업의 절정은 마지막 퍼포먼스였습니다. ‘소름 끼치다’, ‘머리를 쓸어 넘기다’, ‘훌라후프를 돌리다’, ‘놀래키다’, ‘음악을 듣다’, ‘침묵하다’의 여섯 개의 몸짓을 다양한 박자로, 다양한 자세로 표현하는 것이 과제였는데요. 모든 몸짓에 익숙해질 즈음, 각자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몸짓을 원하는 박자만큼 원하는 순서대로 표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주변의 누군가를 향해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누군가 내 음악에 맞춰 덩달아 춤추기도 하고, 나란히 누워 훌라후프를 돌리기도 하고, 소리지르는 이의 옆에서 침묵하기도 하며 모두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의 삶을 영위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며 공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 속에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지키고 쌓아가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느끼고 알게 된 살아감의 형태를 그 날 우리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잊고 있던 감각과 무의식 속 내면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유로움, 그리고 관계의 표현을 몸으로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관계와 배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의식했는데 결국 나만 보게 되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다.”
참가자들의 말처럼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준 클래스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왜 무용 아닌 무용 수업이어야 했던 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머릿속의 동작이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본질적인 표현 방식을 배우게 되어 신선했다”는 어느 참가자의 말처럼 상상도 못했던 세 시간이 그렇게 훌쩍 흘렀습니다.
사진으로도, 문장으로도 제대로 담지 못하는 이 벅찬 감정이, 바로 문화예술교육의 알맹이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던 5월의 아르떼랩 클래스였습니다.
글·사진. 최민영
arte365 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arteLAB. 매달, 만나고 싶던 아티스트와 함께 합니다.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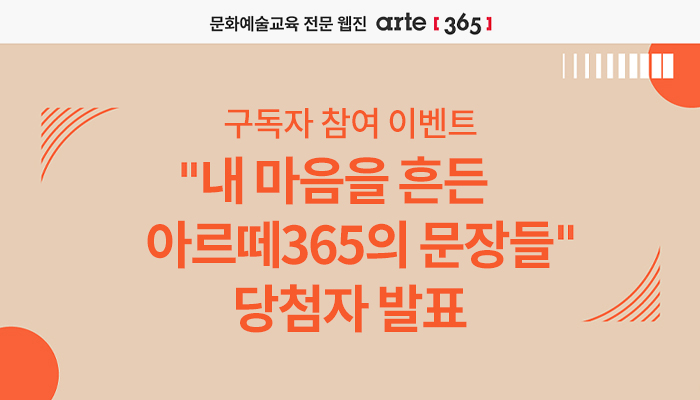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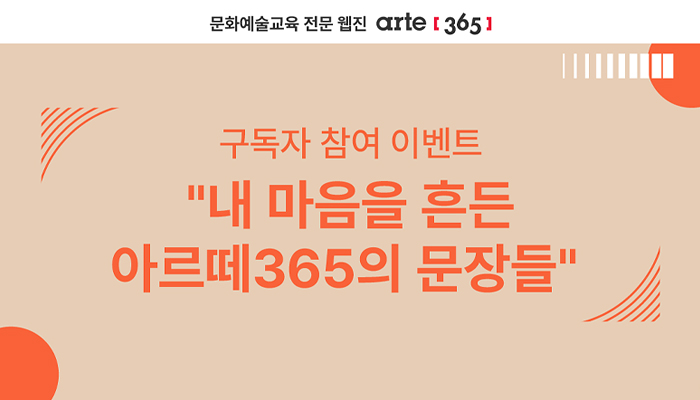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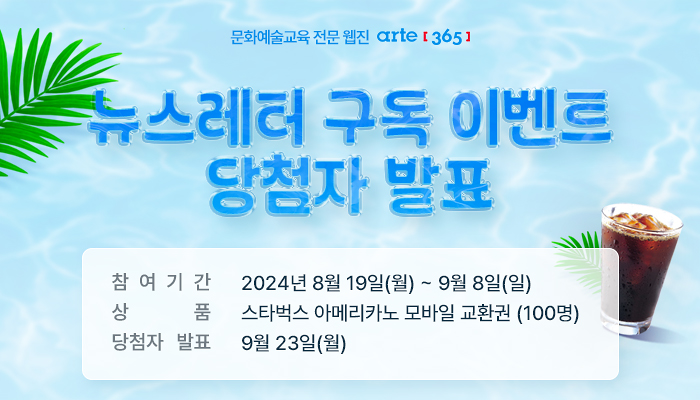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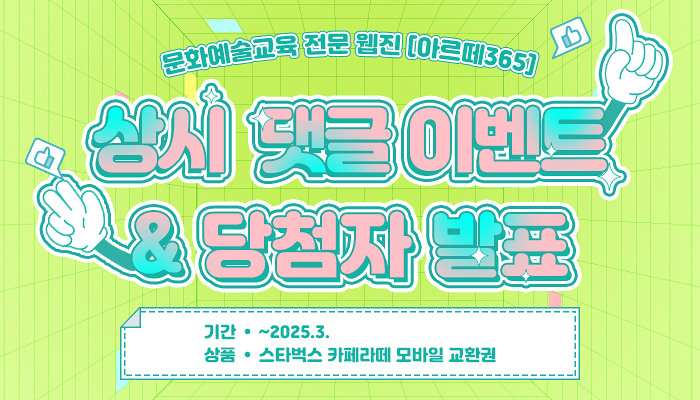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