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는 나치의 유태인 집단학살이 이루어진 “아우슈비츠”를 상징적 기준점으로 삼아 예술과 문명의 전후를 나누었다. 그는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아도르노의 이 같은 명언을 떠올려보면 유태인 집단학살을 다룬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피아니스트>(2002)에서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쇼팽의 피아노곡들이 전편에 깔리는 것은 얄궂기까지 한 일이다. 이는 물론 실존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 속 주인공 피아니스트 스필만이 쇼팽과 같은 폴란드인이라는 점을 고려한 설정일 것이다. 하지만 감독은 영화라는 시청각적 체험의 도구를 통해 아도르노의 비관적 예술관을 실험해 보기라도 하듯이 영화의 시작과 끝을 포함하여 곳곳에서 홀로코스트의 잔혹하고 음산한 풍경과 쇼팽의 서정적인 음악을 대비시킨다.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세 가지의 음악 풍경을 특히 주목할 만하다. 첫 번째는 유태인 집단수용소의 열차 건널목 앞에서 거리의 악사들이 연주하는 민속음악이다. 유태인들이 열차가 지나기를 기다리며 서있는데 그들을 심술궂은 표정으로 보고 있던 독일 경찰들이 돌연 그들에게 “춤추라”고 명령한다. 경찰의 과장된 지휘 제스처에 맞추어 무표정한 얼굴로 연주하는 악사들과 경찰의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춤을 추는 유태인들의 모습은 애처롭다 못해 보는 이의 분노를 일으킨다.

또 다른 풍경 역시 수용소 안에서 그려진다. 수용소 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가난에 허덕이던 스필만은 결국 나치에 협력하는 유태인들(그의 동생이 ‘기생충’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이들)의 유흥장소인 어느 레스토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된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스필만은 자유롭게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다. 피아노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어느 나치 부역자가 불쑥 웨이터를 통해 스필만의 연주를 잠시 멈추도록 주문한 뒤 테이블 위로 던진 동전 구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에게는 스필만의 피아노 소리보다 금화를 골라내는 동전 소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나치의 유태인 집단수용소를 배경으로 그려지는 위의 두 가지 음악풍경은 아도르노가 ‘문화산업’이라고 명명한 20세기 대중문화의 풍경을 암울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첫 번째 풍경이 자연공동체의 유대를 잃어버린 채 강제된 유흥으로 전락한 민속음악의 운명을 나타낸다면, 두 번째 풍경은 철저하리만큼 사회적 기능에 속박된 채 문화상품으로 퇴락한 살롱음악의 초라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문화산업이라는 거대한 수용소 안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음악을 ‘대중음악’이라고 부르며, 두 번째를 ‘클래식음악’이라 부른다.
학살 장소로 향하는 기차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온 스필만이 목숨을 건 도피 과정에서 은신처에 있던 피아노 건반에 두 손을 얹고 행여 소리가 날까 상상의 연주를 하는 장면 또한 “아우슈비츠 이후”의 음악과 예술이 처한 곤경에 대한 아도르노적 은유라 하겠다. 하지만 영화 속 음악 풍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세 번째 음악 풍경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거리의 어느 건물에 숨어들어간 스필만은 극도의 굶주림 속에서 죽음의 마지막 고비에 이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장교와 맞닥뜨린 절망적 상황에서 그는 장교의 뜻밖의 주문을 받고 거실의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발라드를 연주한다. 체념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스필만의 피아노 연주는 독일 장교를 감동시켰고 그의 도움을 받아 스필만은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해피엔딩일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스필만의 피아노 연주 장면이 주는 감흥은 다른 지점에 있는 듯하다. 영화를 보는 관객은 스필만이 당한 극심한 폭력과 굴욕의 과정을 몸서리치게 추체험한 뒤에야 비로소 음악이 주는 찰나적 구원의 순간을 확인하게 된다. 요컨대 모든 적대적 관계를 무효화하는 진지한 음악적․심미적 소통의 힘이 컴컴한 절망과 체념의 끝에 이르러서야 한 줄기 빛처럼 드러난다는 것, 그것이 나치의 비인간적 폭력을 경험한 예술과 음악의 현대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저 아름답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민속음악과 살롱음악은 더 이상 없다’. 철학자 아도르노와 영화감독 폴란스키는 “아우슈비츠 이후”의 음악에 대해서 같은 얘기를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글 | 최유준 (음악평론가)
서울대와 동아대에서 음악미학과 음악학, 문화연구를 전공했다. <월간 객석> 등의 지면을 통해 음악평론가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사업단에서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음악과 대중문화를 주된 텍스트로 삼아 사유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비평적 노력을 해왔다. 저서로 『음악문화와 감성정치』, 『예술음악과 대중음악, 그 허구적 이분법을 넘어서』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 『지식인의 표상』, 『비서구 세계의 대중음악』, 『아도르노의 음악미학』, 『뮤지킹 음악하기』 등이 있다.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좋아요
0댓글 남기기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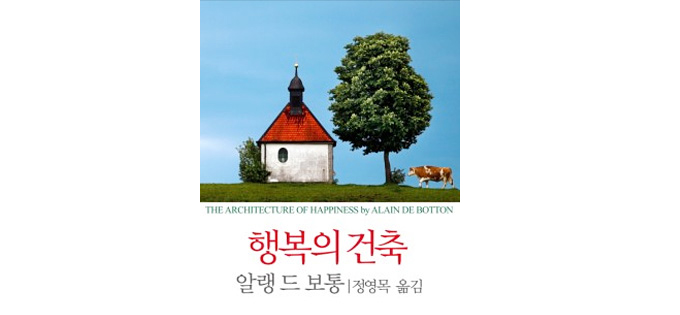







와우! 영화와 음악이야기,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글 좋네요.
잘 봤습니다~!
항상 흥미로운 콘텐츠, 좋아요!
음악적 조예가 없어서 이해가 힘들지만…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의 음악 –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스필만의 피아노 연주 장면이 주는 감동
아우슈비츠 이후’의 음악 –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스필만의 피아노 연주 장면이 주는 감동
처음 사진에서 어느 누구도 표정이 밝지 않아 연주자들의 음악이 흑백사진의 암흑속으로 흡수되어버린 느낌이네요. 전쟁 속에서 호사라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이 때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하다가도 생사의 기로에서 생명을 얻어주는 구원줄이 되기도 하니 참 허무하네요.
개인적으로 클라리넷을 연주하는데 기사에서 나온 사진에 클라리넷이 나와서 흥미를 가지고 영화까지 찾아 보게 되네요,,, 많은 수용소에 관련된 영화를 봤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음악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었기에 이전에 보았던것과는 색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사 잘읽었고 좋은영화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기 위해 살아야 하기에 예술의 혼을 발산했던 그들의 애잔함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음악을 잘 모르는 제가 가끔 듣는 영화음악이 있는데요.. 저 당시의 배경 중 쉰들러리스트라는 사람의 일화를 그린 영화 쉰들러리스트의 주제곡이죠. 들을 때마다 가슴을 콕콕 찌르는 듯한 애잔함에 빠져드는데 저 당시 죽음을 알면서도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