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이 무형문화재인 하회 별신굿을 배우기로 했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였다. 나는 여기에 컨설턴트로 참여하였는데 별신굿의 내용 중 이매마당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였다. 등장인물 ‘이매’는 비틀거리는 몸짓과 어눌한 말투로 관객을 웃기고 양반을 희롱한다. 그 행색과 말투로 비추어 볼 때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가진 인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담당 교사는 그렇지 않아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자칫 장애인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게다가 그것을 그런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점이 걸리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불편할까 걱정을 하였다.
한 학기쯤 지나고 학교를 방문하니 예술강사들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조그만 발표회를 하고 있었다. 난타, 댄스, 풍물, 탈놀이 등의 다양한 공연이 있었는데 그 말미에 정말 이매가 등장했다. 그는 턱이 없는 탈을 쓰고, 가슴을 풀어헤친 채 비틀거리며, 학생들을 향해 “이 등신들아!”하고 외치며 등장했다. 순간 학생들이 손뼉을 치며 열광하면서 함께 호응하기 시작했다.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었고 한순간 축제 분위기로 변하였다. 어떤 등장인물도 이렇게 호응을 받지 못했다. 이것이 당사자의 입장인 셈이다. 말하자면 학부모와 당사자는 다를 수 있다. 학부모들은 어찌 볼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비하하거나 희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재미있는 하나의 극으로 본 것이다. 그냥 즐거움의 한마당이 되었다. 그들의 즐거움이 어디 있는지 되새겨볼 만한 장면이었다.
한 지역에서 수년간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합창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무대에 서는 것조차 어려워하던 친구들이 이젠 제법 무대에 서서 노래를 따라 부른다. 어찌 보면 그것만으로도 대견한 일이다. 수년을 그들과 함께해온 강사의 공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나는 출연자들을 좀더 세세히 관찰하면서 관람할 수 있었다. 앞줄의 친구들은 지휘자를 곧잘 따라 하지만, 뒷줄의 친구들 몇몇은 제각각의 행동을 하고 있었다. 대개 잘하는 친구들이 앞에 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뒷줄에 서게 되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친구들을 배려한 조치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뒷줄에 있는 친구들이 뭔가 못하는 상황이라고만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을 뿐 나름 즐기고 있었다.
그 중 유난히 눈에 띄는 친구는 중증 자폐와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였다. 노래를 따라 하진 못하지만, 연신 자신만의 특유의 소리를 냈고 손뼉을 치며 가락을 타고 있었다. 그러다가 점점 흥이 더해지면서 지르는 소리가 다른 친구들의 노랫소리를 압도할 정도였고,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구르기 시작했다. 틀리지 않으려 조심스레 노래하는 친구들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완전히 합창의 상황에 몰입하고 있었다. 나는 그 친구가 만일 무대의 앞쪽에 섰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다. 관객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지 합장의 분위기는 어찌 변모했을지 말이다. 게다가 그 친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합창을 구성해 본다면 어떨까 하고 말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발달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반문이 있다. 활동보조인들과 함께 늘 주간보호센터에 가 앉아 있다면, 거기서 무슨 무슨 예술, 무슨 무슨 작업, 프로그램 등을 종일 하고 있다면 그들의 활동이 정말 지원되고 있는 것일까 말이다. 안타까운 것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자기를 주장하지 못(안)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가족 혹은 사회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여 그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기에 십상이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일까 돌아보아야 한다. 나는 요즘 발달장애와 바보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자기 욕구가 있으며, 자기표현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보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저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표현할 줄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있다면 그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환경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서 종종 느릿느릿함, 아무런 욕구가 없을 것 같은 무표정함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런 대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언가 늘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며, 자신들의 욕구와 흥미가 외면당하고 무시되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실현할 가능성을 상실했을 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낯선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당사자의 표현일 수 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그런 장애성은 개선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자기표현의 출발이라는 점이다. 발달장애인의 목소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는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장애이다. 그래서 비장애인이 그 일부를 함께 나눠야만 한다. 발달장애인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는 지점은 그 언저리 어디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발달장애인의 목소리는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떤 국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때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자신의 소리를 마음껏 내지를 것이고, 비장애인도 그것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지 모를 일이다.
[사진] <우리는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불편하진 않아요> <말 안 할래요. 비밀이에요.>, 김인규, 2018

- 김인규
-
30년 가까이 중등 미술교사를 지냈으며, 10년 가까이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들과 미술활동을 해왔다. 지금은 개인작업과 함께 발달장애 청소년들과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kig8142@naver.com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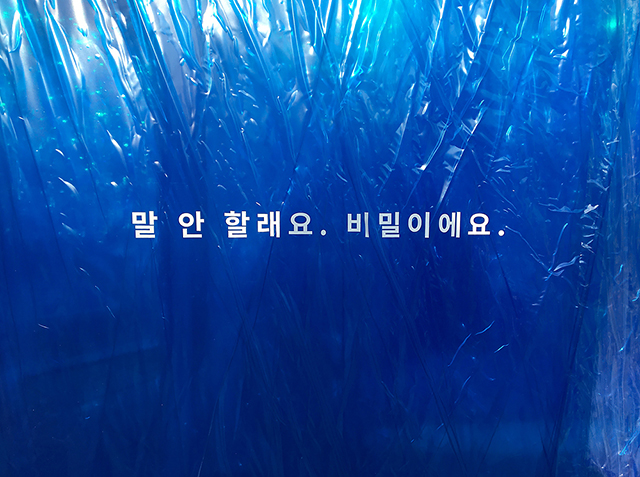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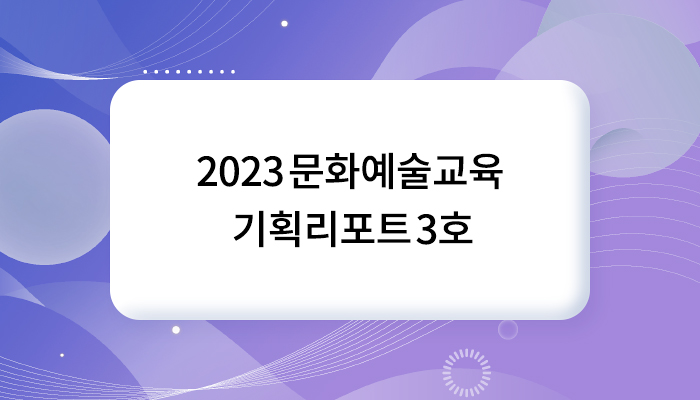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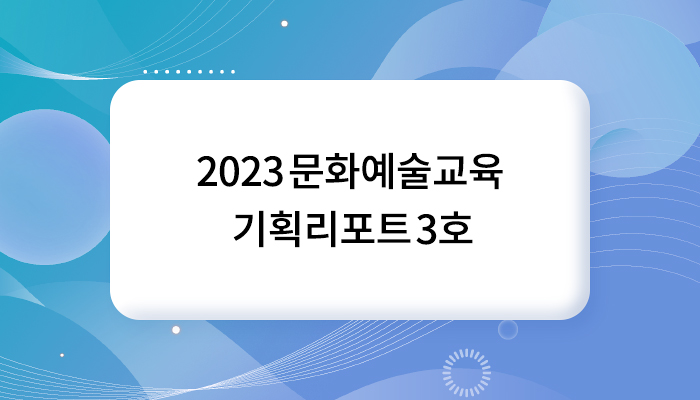



정말 거기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있는가
장애와 예술, 포용의 방식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