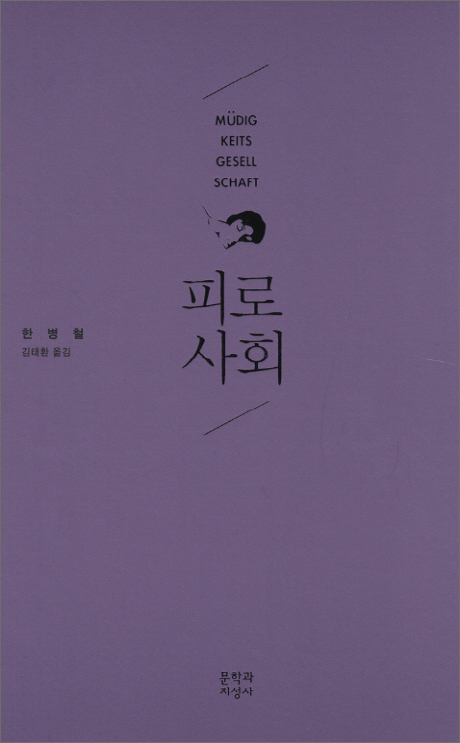
Yes, we can! 긍정의 사고가 부르는 피로사회
한병철 지음 | 김태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 2012.03.05
우선 이 작은 책은 읽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들어가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고 지극히 함축적인 기술방식이라는 점도 작용한다. 어쨌든 시간을 들여 꼼꼼히 읽어야 하는 책이다.
이런 가정을 해 보자.
작은 영업팀을 이끌고 있는 A팀장은 올해 150%로 목표를 초과달성 했다. 보너스와 함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A팀장은 기쁘지가 않다. 내년도 사업계획 때문이다. 이제 그의 목표는 올해 최선을 다해 달성한 150%를 훨씬 넘어서야 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언제나처럼 긍정 가득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거슬린다. ‘그래 내년에도 새로운 방법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고 말겠어. 나는 물론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다음, 또 다음 해에도 이런 성과를 계속 낼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언젠가 우리는 한계를 만나고 그 한계를 예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우울해 진다. 성과지상주의가 가져오는 우울증이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우울증의 본질과 치유이다.
또 다른 가정을 해 보자.
일 잘하는 기획팀 김대리는 회사에서 소문난 멀티태스킹의 귀재이다. 한 번에 여러 가지 기획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누수가 없는 그의 깔끔한 업무 스타일은 가히 천재적이라 할 정도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가 않다.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일 저 일 벌이 꿀을 찾아 꽃을 돌아다니듯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내게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면서 보냈는가? 일 잘하는 모든 사람의 특징처럼 김대리는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에는 해결해 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일은 일일 뿐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멀티태스킹을 반복하다 보니 한가지의 문제를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사유의 시간이 없어 아쉽다. 그 점이 김대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든다. 무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삶에서 빠져나간 것 같은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Yes, we can’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더 많이 열심히 움직이도록 채찍질하는 일에 익숙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성과’ 그 자체인가? 그 성과의 지표는 내가 정한 것인가? 성과 달성의 대가로 얻는 달콤한 과실은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에 대한 당신의 대답을 스스로 해 보라고 재촉하고 있다.
그토록 성과에 집착하면서 우리는 정작 왜 행복하지 못한가? 왜 더 자유롭지 못한가? 성과지상주의는 스스로를 노동 착취 구도 안에 가두도록 고안된 교묘한 자본주의의 마지막 전술 아닌가? 왜 나는 그 장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깊이 빠져 들기만 하는 것인가?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이런 삶의 방식에 길들여지는 프로세스의 정교함을 나는 이해할 수 있을까? 피로한 사회에서 피로를 권하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이 이 책 안에 있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로 시작되는 재독학자 한병철의 「피로사회」는 21세기를 ‘면역사회’에서 ‘성과사회’로 이동하는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 세기는 면약학적이었다. 안과 밖, 친구와 적 등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경계가 뚜렷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부정의 대상이 되었다. 세포가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면역과정과 동일했다.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이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정해지던 사회였기에 일상적인 업무성과 역시 타자가 정해준 목표를 받아서 수행하면 그만이었다.
그에 반해 21세기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해도 된다는’ 허용이 주가 되는 사회로 변한 것이다. 이제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내가 주체가 되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는 역설적으로 긍정의 과잉으로 이어지게 된다.
긍정의 과잉이 신경증을 불러일으킨다는 논리는 금방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은 우리를 자발적으로 착취하는 구조 속에 몰아 넣고 있다. 이전에는 누군가 강제하는 것을 완수하는 일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과를 내기 위해 스스로를 불사르게 된 것이다. 착취의 대상과 주체가 동일시 되는 소모적 구조가 가져오는 피로도로 인해 우리 사회는 집단적으로 신경증 증상을 앓고 있다. 무엇을 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나쳐서 자신 스스로를 착취 하는 사회. 그 안에서 자신이 소진되면서 신경증적 병들이 나타나는 사회. 이런 사회를 피로사회라 말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동반되는 피로는 과잉활동의 욕망을 억제하며, 지나친 긍정으로 충만한 자아의 성과주의적 집착을 완화시키려는 자연스러운 방어기제다. 피로한 자아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채찍질하는 대신 타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피로하면 신경증 걸리기 전에 좀 쉬라는 말이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천천히 주변도 돌아보고 삶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지라는 권고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니체가 말한 ‘중단하는 본능’이다. 우리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갖춘 존재이다. 끊임없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반대편에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는 부정도 함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파괴적 피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태만함과 염려하지 않는 시간을 지내도록 스스로를 방치하는 일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사실은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마저 성과를 내는 일로 연결하려는 오류가 될 것 같다. 즉 ‘잘 쉬면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익숙한 공식이다. 당신이 한발 물러나 쉬어야 하는 이유는 행복과 충만감을 위해서이다.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휴식이 아니어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가?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기 위한 시작점은 당신이 피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닐까?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좋아요
0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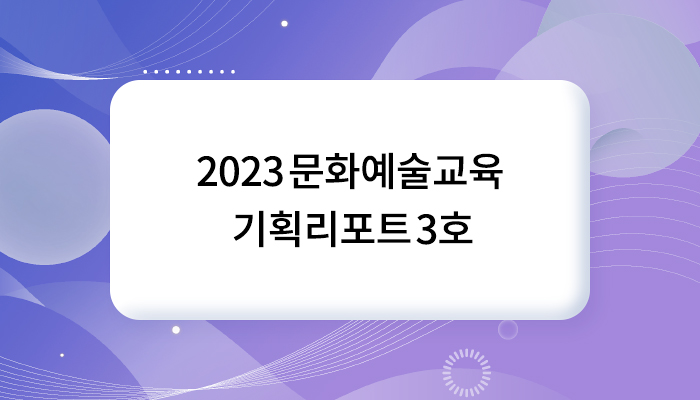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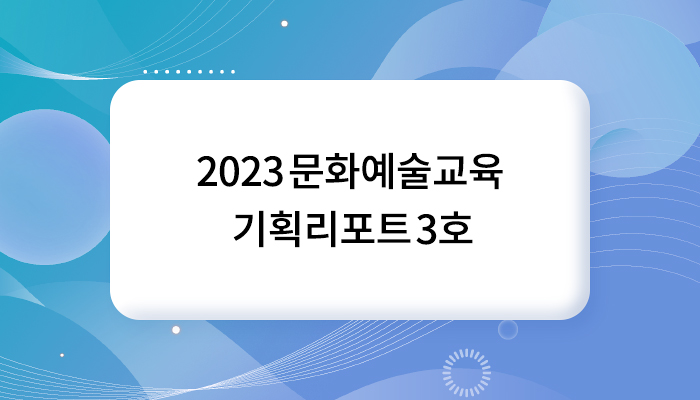



긍정의과잉이 신경증을 불러일으킨다.라니! 읽자마자 공감이 확드네요..!!
저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