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는 아이디어의 산물이다. 광고에 쓰이는 글귀와 장면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삽입되는 것이 없다. 짧은 순간에 인간의 내면을 쥐었다 놓는 절실함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의 급소를 강력하게 혹은 부드럽게 타격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군가의 가슴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닌데, 감성의 맥을 탁탁 짚어내는 힘. 그것이 무엇일까. 박웅현은 그것을 ‘인문학’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책’이 있었다고 말한다.
여기, 그의 시야를 여는데 큰 도움을 준 두 권의 책이 있다. 손철주의 『인생이 그림 같다』와 오주석의 『옛 그림읽기의 즐거움』. 그가 한국적인 정서를 놓치지 않고 세계적인 광고인으로 자리매김 한 것에 꽤 부합되는 맥락이어서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었다.
그림과 인생을 멀게, 느리게, 넓게, 단순하게 보는 방법.
지금부터 박웅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멀게, 느리게 – 손철주의 『인생이 그림 같다』
요즘 세상은 참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뭔가를 더 얻어보겠다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왠지 더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손철주의 『인생이 그림 같다』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사소한 자연의 것들이 얼만큼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얼만큼 잊고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문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들 도리어 누가 되고
부귀가 하늘에 닿아도 수고에 그칠 뿐
산속으로 찾아오는 고요한 밤
향 사르고 앉아서 솔바람 듣기만 하리오
아무것도 없는 작은 초당에 밤이 깊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솔바람 소리를 듣고, 바람에 답하는 풍경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비 오는 날엔 빗방울이 나뭇잎을 툭툭 건드리는 소리, 바람 따라 비의 방향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을테구요. 이렇게 바람의 감촉, 빗소리 하나에도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풍요를 위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멀리 보는 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뼈빠지는 수고를 감당하는 나의 삶도 남이 보면 풍경이다.
모든이에게 자신의 삶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지만 멀리서 보면 행복해 보입니다. 멀리 지게를 지고 가는 아저씨는 낭만적이지만 정작 지게 진 아저씨는 뼈가 빠지는 고통이겠지요. 그래서 사물을 볼 때 ‘참 목가적인 풍경이다’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면을 바라보게 됐어요. 이게 바로 멀리 보는 힘, 책을 통해 얻게 된 시선의 확장입니다.
넓게, 단순하게 – 오주석의 『옛 그림읽기의 즐거움』
침묵의 위대함은 앞뒤의 음향이 만든다. 그림 속 여백의 의미심장함은 주위의 형상이 조성한다.
『옛 그림읽기의 즐거움』에서 우리 그림의 여백에 대한 저자 오주석의 설명입니다.
1996년 뉴욕대에서 유학하던 시절, 저는 그들에게 이철수 판화를 가져가서 소개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 그림이 가진 “여백”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서양의 그림은 여백을 비우지 못하거든요. 어떻게든 빼곡히 채우지요. 수업을 진행하던 교수는 “저렇게 여백을 비우는 건 용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림들 속에는 제대로 메우지 않았지만 여백에 가득 찬 운무를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여백이 아닌 살아있는 여백인 것이죠. 그 여백을 신경 쓰는 사이, 우리 그림을 보는 또 다른 눈이 생기는 겁니다.
또, 서양과 동양 그림의 큰 차이 중 한가지는 원근법입니다. 서양은 모든 것의 중심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근법이 중요할 수 밖에 없지요. 그들에게 있어 자연이란 ‘사람’이 관찰한 결과물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림은 다릅니다. 어떤 그림은 여러 각도가 한 폭에 다 들어가있기도 하죠. 원근법이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한가지 시선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 멀리 있는 사람이 진한지, 배경과 중심이 어떻게 똑같이 부각되면서 균형이 잡히는지, 오주석의 분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술의 격조란 정확히 감상자의 수준과 자세만큼 올라간다.
예술은, 우리가 얼마큼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오주석은 말합니다. 손철주와 오주석의 책을 읽는다면 격조 있는 감상자의 수준에 다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의 광고의 전제는 ‘사람’이다. 그것은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때론 정(精)이 되기도 하며, 때론 파격이 되기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탐구해야 한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알고, 그 속에 흐르는 감성의 수맥을 찾아야 한다. 비좁은 시야로는 다른 사람의 삶에 호기심 조차 생기지 않으니까. 그의 사람을 향한 호기심과 열린 시야가 언제나 반짝이고 섬세한 창의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제 조금은 넓어진 시야로 세상을 보자.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원근법)을 떠나 나와 곁에 있는 사람 사이를 메운 구름(여백)을 볼 줄 아는 넓고 단순한 시야로.

글 | 문화예술 명예교사 박웅현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뉴욕대학교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석사학위를 받았다. 제일기획에서 광고 일을 시작해 지금은 TBWA KOREA의 전문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칸국제광고제, 아시아퍼시픽광고제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다. 대표적인 카피 또는 캠페인으로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람을 향합니다>, <생각이 에너지다>, <진심이 짓는다>등이 있고 저서로는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등이 있다.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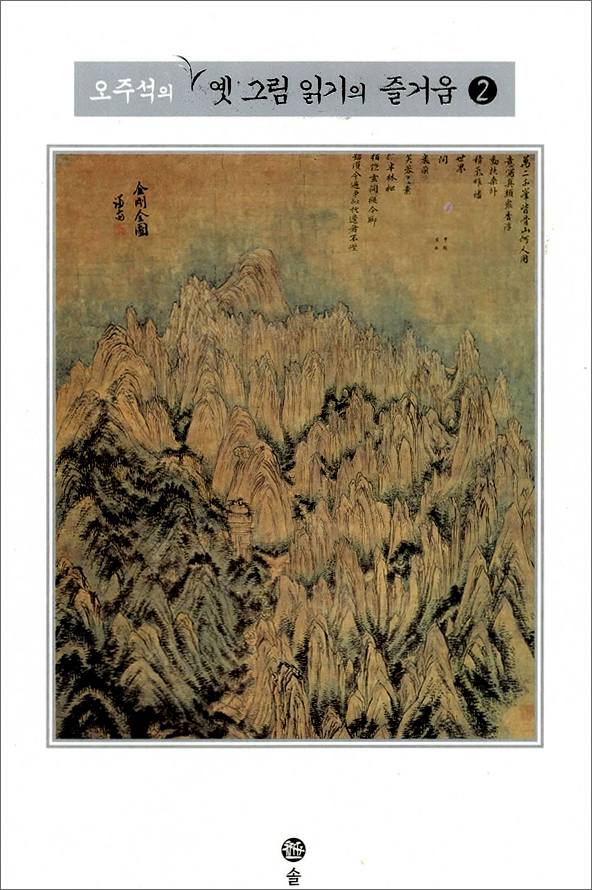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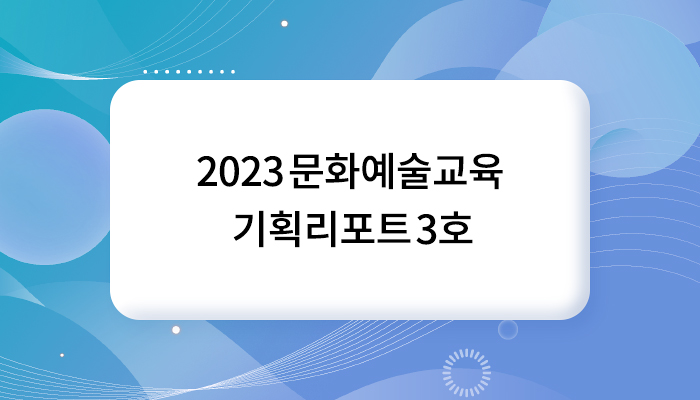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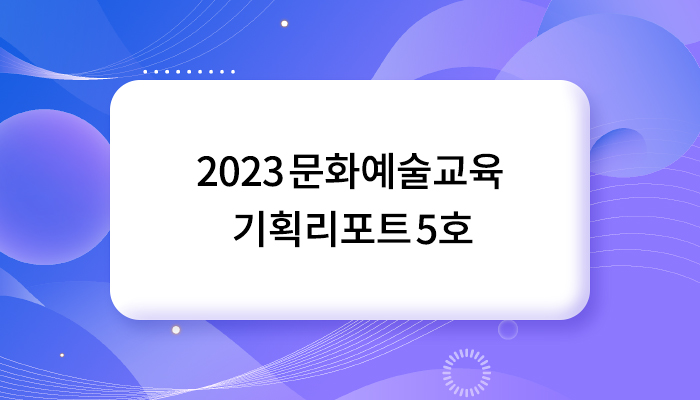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