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려서는 안 되고, 자신의 내면에서 본 것도 그려야 한다. 내면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그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일도 그만두어야 한다.”
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1774~1840)의 잠언은 당시로선 파격적인 것이었다. 만약 예술가의 내면에서 추한 것, 우스꽝스러운 것, 불쾌한 것, 끔찍한 것, 무시무시한 것이 떠오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피해야 하는가 아니면 묘사해야 하는가. 움베르트 에코에 따르면, 낭만주의의 도래로 “미는 더 이상 미학의 지배적인 관념이 아니게 되었”으며, “우리에게 혐오감을 주는 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가능”했다. 이전까지 아름다운 대상을 모방하는데 급급했던 예술가는 19세기 들어 그동안 외면했던 인간 내면이라는 어둠의 영역에 눈을 돌리면서 이제껏 누려보지 못한 ‘창조자’라는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1774~1840)의 잠언은 당시로선 파격적인 것이었다. 만약 예술가의 내면에서 추한 것, 우스꽝스러운 것, 불쾌한 것, 끔찍한 것, 무시무시한 것이 떠오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피해야 하는가 아니면 묘사해야 하는가. 움베르트 에코에 따르면, 낭만주의의 도래로 “미는 더 이상 미학의 지배적인 관념이 아니게 되었”으며, “우리에게 혐오감을 주는 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가능”했다. 이전까지 아름다운 대상을 모방하는데 급급했던 예술가는 19세기 들어 그동안 외면했던 인간 내면이라는 어둠의 영역에 눈을 돌리면서 이제껏 누려보지 못한 ‘창조자’라는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타비아니 형제의 영화 <시저는 죽어야 한다(Cesare deve morire, Caesar Must Die)>(2012)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자체로 창조적 예술가들이라 불릴 만하다. 이탈리아 로마 교외 레비비아 교도소를 배경으로, 셰익스피어의 연극 <줄리어스 시저>의 리허설 과정과 공연 장면을 담은 이 영화는 실제 수감 중인 죄수들을 배우로 삼았다. 줄리어스 시저 역의 지오반니 아르쿠리는 마약 밀매로 17년 형을, 브루투스 역의 사사 스트리아노는 카모라 조직 관련 범죄로 14년 7개월 형을, 카시우스 역의 코시모 레가는 살인 및 기타 범죄로 종신형을 언도받고 복역 중인 중범죄자들이다. 로마의 역사에 대해 아는 바 없고, 셰익스피어 연극 또한 이제껏 본 적 없을 무지한 죄수들이 범죄로 얼룩진 과거의 악행에만 기대어 힘들게 인물들의 감정을 길어 올릴 때 우리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기적의 눈빛들과 마주하게 된다. 특히 브루투스가 시저를 살해하는 대목에 이르면 프레임 속 배우들이 실제 죄수라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잊을 정도다.
그들의 미적 기예는 임마누엘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천재란 어떠한 특정한 규칙도 주어지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재능이다. 즉 그것은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한 숙련의 소질이 아니다”라고 말한 독창성에 속하는 것 아닐까. “시저, 이제 편히 쉬시오! 당신을 죽였던 분노보다 더한 분노로 자결하니…” 무대 위의 브루투스가 고통스런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지자 객석에서 일제히 기립 박수가 쏟아진다. 그러나 배우들은 커튼콜의 흥분을 음미할 시간이 없다. 관객들이 극장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들은 교도관들에 떠밀려 독방에 갇힌다. 연극이 끝난 뒤 카시우스 역의 코시모 레가는 독방에서 이렇게 중얼거린다. “예술을 알고 나니 이 작은 방이 감옥이 되었구나!” 그의 작은 읊조림은 단지 비참한 처지의 토로로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칸트의 말대로 그들이 창조적 예술가라면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고 스스로를 깨우쳐서다.
타비아니 형제가 감옥에서 예술의 소생을 목도한다면, 다큐멘터리 <선물가게를 지나야 출구(Exit Through The Gift Shop)>(2010)를 감독한 뱅크시는 갤러리에서 예술의 죽음을 선언한다.
“우리가 보는 미술 작품은, 단지 소수의 선택되어진 화가들의 작품일 뿐이다. 소수의 사람들이 전시를 기획, 홍보하고 작품을 구입하여 전시하면서 미술 작품의 성공은 결정된다…(중략)…갤러리에 간 당신은 단지 백만장자들의 장식장을 구경하는 관람객에 불과하다.”
– 뱅크시, 『월 앤 피스』 중
세계의 유수한 갤러리에 자신의 작품을 몰래 걸어두어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예술을 조롱했던 얼굴 없는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는 이 영화에서 좀 더 대담한 시도를 선보인다. 아예 가짜 예술가를 만들어 시장에 침투시키는 것이다. 한때 보세 옷 상점의 주인이었던 티에리 구아타가 하루아침에 아티스트 ‘미스터 브레인워시(Mr. Brainwash)’로 변모하고, 경매시장에서 데미언 허스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스타 작가의 대열에 올라서는 과정은 그 자체로 거대한 코미디다.
천부의 자질을 지닌 예술가의 면모를 티에리 구아타 혹은 ‘미스터 브레인워시’에게서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는 단지 어깨 너머로 훔쳐봤던 그래피티 작가들의 은밀한 작업을 필사적으로 흉내 낼 뿐이다. 게다가 이러한 베끼기에 가까운 모방마저도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한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대신한다. 얼치기 사기꾼의 첫 번째 전시회는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두게 된다. “예술이 죽었다는데 예술은 항상 곁에 있죠.” 관객의 열광을 즐기며 ‘미스터 브레인워시’는 자신이 뱅크시를 흉내 낸 것인지 아닌지, 자신이 진정한 예술가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호기롭게 큰소리치기까지 한다. ‘미스터 브레인워시’는 뱅크시의 또 다른 작품이라고 해도 좋다. 뱅크시는 시장에서 비싸게 팔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예술이라는 전도된 가치의 장(場) 한가운데 티에리 구아타를 유인용 먹잇감으로 던져두고서는 이에 대한 무지의 반응을 실험한 것인지도 모른다.
예술이 창조성이라는 수식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시기는 고작해야 19세기뿐이다. 중세부터 계몽주의 시대까지 창조성은 신에게만 허락된 무엇이었다. 그러던 창조성이 20세기 들어 더 이상 예술만이 아닌 “인간 제작의 전 분야”에서 쓰이는 공통의 단어가 됐다. 이러한 창조성의 범용은 역사의 진보를 뜻한다고 해야 할 것인가. 창조성이 지니고 있던 희귀한 광휘가 사라지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시저는 죽어야 한다>의 감옥이 신성한 무대로 탈바꿈하는 것은 그저 환영인가. <선물가게를 지나서 출구>의 갤러리가 거대한 감옥으로 밝혀지는 것은 단지 해프닝인가. 역설과 도착에 봉착한 것은 비단 예술뿐인가. 우리의 삶 또한 위태한 처지에 놓여있지 않은가. 이와사부로 코소는 『죽음의 도시 생명의 거리』에서 우리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문화에 의해 길들여져 버렸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의 예술과 삶이 당면한 목표일 것이다.
이미지 제공_(주)에스와이코마드, (주)영화사조제

- 이영진 _ 영화평론가
- 오랫동안 잡지를 만들었다. 지금은 영화와 글쓰기가 삶의 전부인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려고 궁리중이다.
zizek73@gmail.com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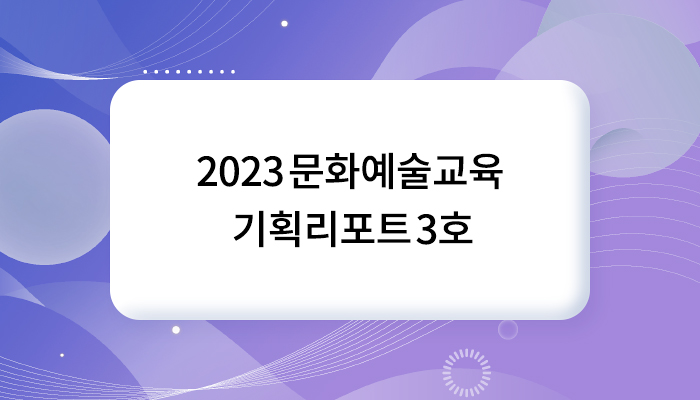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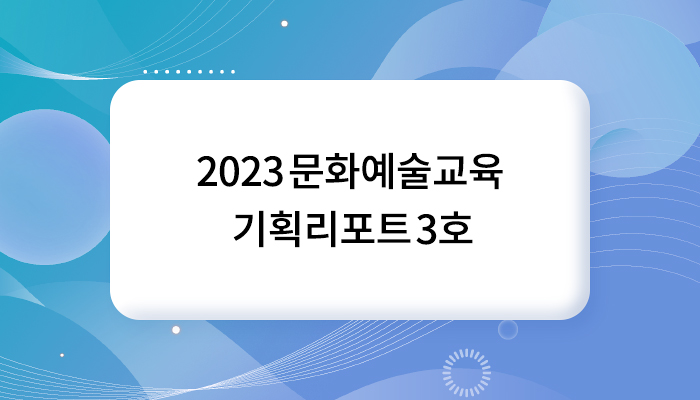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