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뮤지컬 산업과 창작 콘텐츠를 위한 제언
연간 제작되는 뮤지컬의 편수는 얼마나 될까. 경제위기가 지속된 지난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 다소 편수가 줄었지만, 대략 180여 편을 넘는 작품들이 막을 올렸다. 이중 창작 뮤지컬의 수는 해외 뮤지컬에 비해 4~5배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정작 돈벌이가 되고 대중이 움직이는 대형 공연장은 해외 뮤지컬들에 의해 점령되어있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

창작물과 수입 콘텐츠의 비율을 보면 조금 더 경이롭다. 일반적으로 뮤지컬은 외국에서 수입해 제작되는 해외 뮤지컬과 순수 우리 자본, 문화, 언어 그리고 인력으로 꾸며지는 창작 뮤지컬로 나뉜다. 다시 해외 뮤지컬은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우리말로 번안해 무대를 꾸미는 라이선스 뮤지컬과 배우와 인력, 무대와 기술이 모두 내한해 한정된 기간동안 공연하는 투어 뮤지컬로 구분된다. (간혹 직수입 뮤지컬을 오리지널 뮤지컬이라 부르지만,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잘못된 용어다. 일반적으로 공연에서 ‘오리지널’이란 용어는 초연 배우들이 꾸미는 오리지널 캐스트의 무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투어 프로덕션(Tour Production)이라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창작 뮤지컬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
흔히 뮤지컬하면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나 <캣츠(Cats)> 혹은 <맘마 미아(Mamma Mia)!>나 <시카고(Chicago)>같은 외국의 화려한 작품들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일 년 동안 제작되는 해외 뮤지컬의 제작편수는 30~40편 안팎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연간 제작편수에서 이들을 제외한 140~150여 편이 모두 창작 뮤지컬들이라는 의미다. 제작 편수만으로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한 대형 뮤지컬 시장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껍질을 벗겨보면, 현실이 꼭 장밋빛은 아니다. 연간 제작되는 창작 뮤지컬의 수는 해외 뮤지컬에 비해 4~5배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정작 돈벌이가 되고 대중이 움직이는 대형 공연장은 해외 뮤지컬들에 의해 점령되어있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요한 원인 중에는 시장 환경도 한 몫을 한다. 대부분 복합공연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연 시장에서 뮤지컬은 길어야 2~3달의 공연기간을 확보할 뿐이다. 이런 대관여건은 이미 큰 시장에서 가능성을 검증받은 해외 뮤지컬들의 마케팅에나 적합할 뿐, 작품을 만들고 브랜드 가치도 키워야하는 창작 뮤지컬에게는 언감생심 이윤을 창출하기 힘든 장벽 같은 존재다. 자연히 수지타산 맞추기 어려운 대형 공연장은 해외에서 온 유명 뮤지컬이, 적은 비용에 경제적 부담도 덜한 소극장에는 창작 뮤지컬이 주를 이루는 편향된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 쯤 되면 백여 편이 넘는 창작 뮤지컬의 등장이 사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씁쓰름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영세한 규모의 구멍가게 같은 환경 안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창작 뮤지컬의 등장을 바란다는 것은 사실 도둑놈 심보에 다르지 않다. 매해 20%에 육박하는 매출 신장이 이어지고 있다지만, 결국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외국의 저작권자’들이 챙겨가는 악순환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관건은 어떻게 창작 뮤지컬의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의 여부다. 예술과 문화산업에 관한 보다 치밀하고 치열한 고민이 따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있다. 우선 시장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창작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며 그들이 ‘물건’을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분위기와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 단계별 시장의 조성과 운영은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다. 대형 창작 뮤지컬을 만드는 제작자들이 그들의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대규모 공연장에 올리기에 앞서 검증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중간단계의 과정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 즉, 뮤지컬 공연 기획자가 부동산 담보 맞기고 ‘모 아니면 도’ 형식의 도박판을 벌리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험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형 창작 뮤지컬의 등장과 흥행, 대중성의 확보는 단계별 시장에서의 실험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작 인력의 양성과 육성 반드시 전제
교육도 빠질 수 없다. 단순한 배우 양성 위주의 구조로는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힘들다. 100여 편이 넘는 창작 뮤지컬이 등장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또 다양한 인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한숨 쉬게 될 때가 많다. ‘그 밥에 그 나물’인 경우도 허다한데다 인기 작가나 작곡가라 인정받게 되면 수편에서 수십 편 넘게 관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만큼 검증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노래하고 연기하는 기능인도 중요하지만, 뿌리를 만들고 튼실한 줄기를 형성할 제작 인력의 양성과 육성은 창작 뮤지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할 덕목이다.
다양한 실험과 도전이 보장되지 못하면 뮤지컬의 산업화는 감히 바라지 못할 명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시장에서 장벽을 넘어 공통적으로 통하게 하는 것도 바로 제작인력이며, 콘텐츠의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 역시 크리에이터들이다. 물론 라이선스 작품들의 수익을 챙기는 이도 바로 이들이다. 우리 창작 뮤지컬이 왜 창작자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지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아쉬움이 없다.
사실 주목할 만한 시도들은 이미 시작됐다. 예를 들어,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는 매해 창작 뮤지컬을 선발해 대구에서 트라이 아웃을 꾸밀 수 있도록 대관료나 제작비 등을 지원하고, 다시 이들 간의 경쟁에서 선발된 작품을 이듬해 뉴욕 뮤지컬 페스티벌로 보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는 창작 팩토리 사업을 통해 단계별 지원 및 콘텐츠의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결과물은 등장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도전이자 시도여서 이들이 빚어낼 ‘물건’을 기대하게 한다.
서구에서 뮤지컬이 대중문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150여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우리 뮤지컬 시장이 본격적인 규모의 경제시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0여년 역사에 불과하다. 아직은 성장통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남다른 시장의 외연적 확장은 기념비적 성과라 부를 만하다. 기왕이면 이제 우리 콘텐츠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사례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대 예술가들의 노력과 고민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좋아요
0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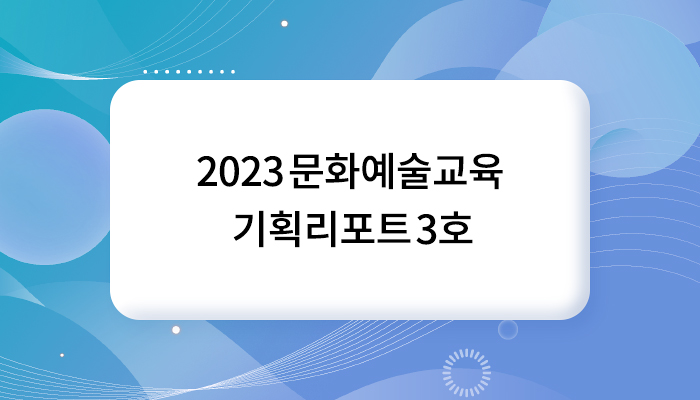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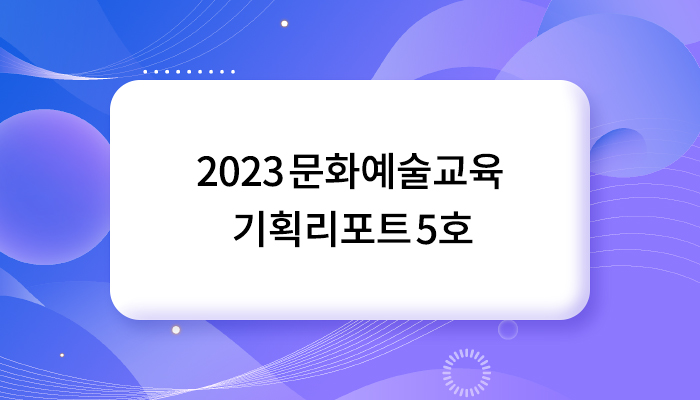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