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끈 튼실한 뿌리
클래식음악에서 ‘5’는 마법의 숫자 같다. 특히 교향곡에서 그렇다. 베토벤 5번, 차이코프스키 5번, 쇼스타코비치 5번 예외 없이 극적이고 힘과 에너지에 넘치는 걸작들이다. 그 선율이 눈물겹게 아름답고 서정적인 아다지에토(Adagietto)가 들어있는 말러의 교향곡도 5번이다. 이 곡들 중 베토벤 교향곡 제5번은 가장 먼저 나를 사로잡은 음악이자 처음 클래식음악의 세계로 이끈 음악이다.

베토벤 5번? 에이, 그 음악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는 말이다. 흔히 ‘운명’이라는 부제로도 널리 알려진 이 음악은 수많은 광고와 드라마, 영화들에서 이미 남용될 대로 남용되어, 실제로는 곡 전체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조차도 ‘익숙하다’라거나 심지어 ‘지겹다’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 유명한 ‘딴따따 딴~!’을 누가 모를까?
하지만 같은 노래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다른 법이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조용필이 부르느냐, 심수봉이 부르느냐에 따라 그 노래의 온도와 밀도, 습도, 색채, 분위기는 사뭇 달라진다. 어쩌면 전혀 다른 노래처럼 들릴 수도 있다. 클래식음악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하다. 어떤 지휘자가 어떤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연주했느냐에 따라 그 맛이 전혀 다르다. 같은 작곡가의 음반이 수없이 쏟아지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악보는 같지만 그 음표들 뒤에, 그리고 음표와 음표 사이에 놓인 해석의 여지는, 마치 거대한 은하계처럼 넓고 깊고 다양하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서주부터 마법에 걸리다
내가 베토벤 5번을 듣고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충격에 휩싸인 것은 20년도 더 전의 일이다. 당시 나는 군대를 마치고 초년 기자로 막 사회에 발을 내딛고 있었다. 내 몸 하나 누이면 공간이 꽉 차는, 좁디좁은 단칸 자취방에 잠시 기식할 무렵이었다. 그날 퇴근길에 별 생각 없이, 그냥 ‘베토벤 5번’이라는 작품명만 보고 산 CD였다. 중학교 음악 시간에 들어본 곡이니 별로 귀가 낯설지도, 지루하지도 않겠지 하는 막연한 추측과 함께.
그러나 나는 첫 네 소절 ‘딴따따 딴~!’의 서주와 함께 마법에 걸리고 말았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 기세와 역동감에 속수무책으로 날아가 버렸다. 마치 줄을 잡아 뜯는 것처럼 거칠게 분출되는 바이올린과 첼로의 야수적 에너지, 숨 막힐 듯 몰아붙이는 속도감과 긴박감, 그러면서도 전혀 어긋남이 없는 템포, 악기군과 악기군 간의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균형감 등이 실로 ‘굉장’했다. 1악장을 듣는데 소름이 쪽 돋았다. 그리고 2악장의 유장하면서도 장대한 물결. 각기 다른 악기군의 소리가 절묘하게 배합되고 분산되어, 서로가 서로를 가리는 게 아니라 물결치듯 밀려오면서 도리어 서로를 키우고 늘리고 증폭시키는 듯했다. 비교적 빠른 템포로 그처럼 서정적인 소리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게 경이로웠다.
폭풍 전야의 불안스러움을 더없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3악장을 지나면 4악장의 대폭발, 승리와 광명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모든 에너지가 남김없이 분출되는, 화산 대폭발의 향연이다. 도대체 누가 연주한 거야? CD 케이스를 훑어봤더니 카를로스 클라이버와 비엔나 필하모닉의 연주. 1975년 스튜디오 녹음이었다(도이체그라모폰 발매). 그 때부터 클라이버의 음반, 그리고 베토벤 5번 음반을 열성으로 사서 듣기 시작했다.
클라이버가 전해준 신선한 충격과 감동
내 귀에는 불행하게도, 하지만 내 주머니 사정으로 본다면 다행스럽게도, 클라이버의 음반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음반도 나를 실망시키지는 않았다. 왜 이런 지휘 천재가 이 정도밖에 녹음하지 않았을까 불만스러울 뿐이었다.
문제는 베토벤 5번이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음반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그 유명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을 비롯해서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빌헬름 푸르트뱅글러, 조지 셸,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레너드 번스타인, 오토 클렘페러, 브루노 발터,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존 엘리엇 가디너, 오이겐 요훔, 쿠르트 마주어, 콜린 데이비스, 프리츠 라이너, 귄터 반트, 미하엘 길렌, 클라우디오 아바도, 리카르도 무티, 오자와 세이지 등 전대와 당대의 명지휘자라는 이들의 명단과 5번 음반의 목록은 대체로 일치했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몇 번씩 되풀이해서 5번을 녹음했다. 다른 템포와 스타일로, 다른 오케스트라로. 카라얀이 그랬고, 토스카니니와 푸르트뱅글러, 하이팅크가 그랬다 그러나 그 어떤 음반도 클라이버가 안겨준 것과 같은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다시 주지
는 못했다. 그에 근접한 것으로는 클라이버의 아버지인 에리히 클라이버의 모노 연주와, 놀라울 만큼 느린 템포로 놀라울 만큼 팽팽한 긴장감과 에너지를 분출하는 오토 클렘페러 정도였다. 물론 연주 그 자체로는 대부분 별 다섯에 네 개 이상 줄 수 있을 만한 명연들이었다. 곡 자체가 비교적 짧은 데다 워낙 자주 연주된 곡이다 보니, 웬만큼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는 지휘자 자신들도 호락호락 음반으로 내지 않기 때문일 터이다.
오랜만에 다시 클라이버의 5번을 듣는다. ‘역시!’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저 수준의 힘과 기교, 템포, 리듬, 밸런스를 성취하자면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쳐든다. 특히 템포와 악기군 간의 균형성에서, 아직도 클라이버의 1975년 녹음을 따를 연주는 나오지 않은 것 같다. 비평가들의 온갖 호평에도 불구하고 아르농쿠르-유럽체임버의 것은 템포와 세기(細技)에 일관성이 좀 없는 듯하고, 가디너-혁명과 낭 만의오케스트라의 것은 도리어 너무 자로 잰듯해서 좀 기계적으로 들린다. 그에 비하면 길렌, 반트, 하이팅크의 것이 좀더 인간적이고 표준적이다. 요즘은 말러에 심취해 있다. 말러의 교향곡들이 가진 장대하고 심오하고 극적인 세계와 견주면 베토벤과 브람스의 세계는 너무 단순하고 소박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베토벤 없이 말러가 가능했을까? 아직 경박하기 짝이 없는 수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보는 클래식음악 세계에서 베토벤은, 그리고 그의 5번은 튼실한 뿌리이고 영원한 고향이다.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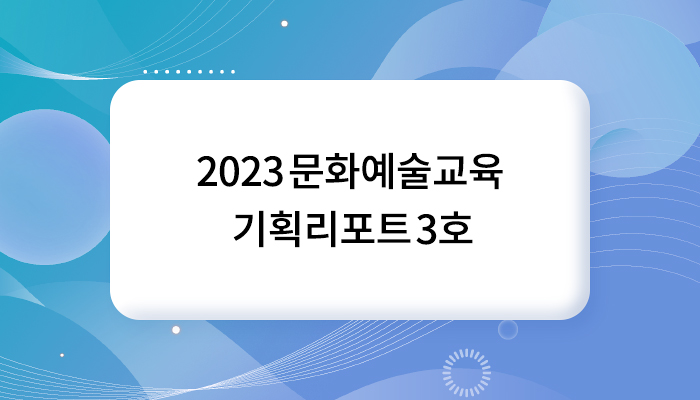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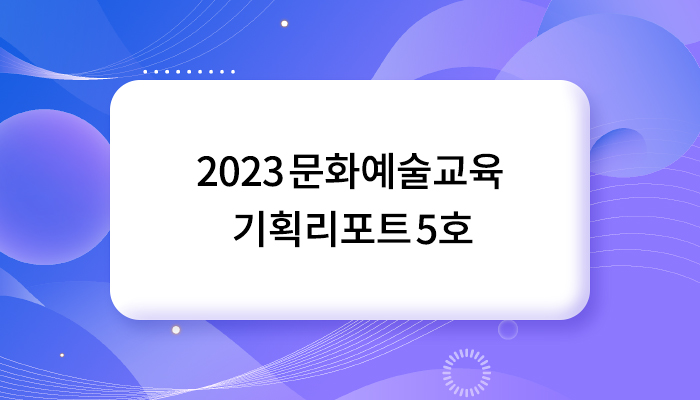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