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의 절망스러운 여정에서 만나는 희망
‘책 속에 길이 있다.’ 살아가는 지혜를 알게 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말 그대로 길을 다룬 책도 많다. 제주 올레 길, 지리산 둘레 길을 안내하는 여행서도 있지만,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책도 있다. 연어의 길을 따라가며 인생을 논하는 책도 있다. 제목이 ‘길’인 책도 있다. 미국 소설가 코맥 매카시의 장편 소설 <로드(The road)> 또한 번역하자면 ‘길’이다.

마음 속에 희망의 불씨를 심고 걷는 사람
<로드(The road)> 읽고나서 나는 이 책이 ‘사람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 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쉽게 알게 해주었다는 데 놀랐다. 속물이 되어선지 수많은 삶의 지침서들 속에서 헤매면서도 감동받지 못했던 나를 흔들어 깨운 문장 때문이다.
‘우리는 불을 옮기는 사람들이다.’
미사여구 없이 단순한 이 문장이 울림이 있는 것은 소설의 배경과 줄거리 때문이다. 대재앙을 겪은 지구에 생명체는 대부분 죽었고, 불에 탄 세상은 온통 재로 뒤덮였다. 잿빛 먼지로 가득 찬 하늘 아래 폐허로 변한 땅, 그곳에서 한 남자와 그의 어린 아들이 길을 걷는다. 길은 안전하지 않다. 추위를 피할 곳도 허기를 면할 곳도 없는 데다 먹을 것이 없어진 상황에서 인육을 먹는 무리까지 생겨났기 때문이다. 산 자들도 자살이 최선이라고 믿고 목숨을 끊는, 이 참혹한 환경에서 남자는 그의 유일한 희망인 어린 아들을 생존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악전고투한다. 남자는 아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심고 꺼지지 않게 계속 간직하기를 염원하며, 그 불을 옮기기 위해 계속 길을 간다. 남자와 소년은 바다가 있는 남쪽을 향해 가는 머나먼 길 위에 있다. 그곳에 안전지대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에 의지해 길을 걸을 뿐이다.
그런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을 찾아가는 남자의 모습은, 젊은 시절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결국 나는 길 위에 있지 못했던 탓에 어른들이 강요한 길로 들어서야 했다. 누나는 대학생이 된 나에게 당시 괜찮은 책이라며 두 권을 선물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와 <도둑놈 발바닥에 새겨진 부처님 이마>라는 책이었다. 책 속에는 역시 길이 보였다.
나는 그 두 책 중 어디에서 읽었는지 기억할 수 없지만 ‘빛과 어둠 사이에서 눈을 부릅떠야 함은 사람의 사람다운 길을 걷고자 함이다’라는 문장에 푹 빠져서 좌우명처럼 되뇌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눈을 부릅떠야 한다.”
그래야 ‘사람의 사람다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공감한 나는 그 말이 일러준 길이라 생각한 길을 찾아내고는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늦게 들어선 길에는 동행도 없었다. 어른들은 나를 멸시했고, 친구들은 제 갈 길로 가면서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머물 거면 길에서 벗어나 있어야 해”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장 죽을 길이라도 내 길을 가지 않으면 다른 길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처음 길을 찾아 나섰을 때, 나는 뭔가 심오한 해석 같은 것을 바랐다. 또 나는 내 길에 대해 그럴싸하게 철학적인 분석이나 비장미가 넘쳐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썼던 일기들에는 꽤나 폼이 들어가 있었다.
나는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 아직도 그 길 위에 있는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 길을 걷고 있다고 내세울 아무런 근거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아마 그 길에서 벗어나 어느 행렬을 따라가 그 무리 속에 섞여 정착한 곳에서 발 따스하고 배부른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리라.
<로드>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를 여읜 소년은 그들의 뒤를 밟으며 따라온 한 가족을 만난다. 그 가족의 가장인 남자는 경계하는 소년에게 동행하지 않겠느냐고 제의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머물 거면 길에서 벗어나 있어야 해”라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 나는, 머물기 위해 걷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사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걸었던 길을 한참 벗어난 곳에서 나는 속물로서 살고 있는 것이다. 계속 걸어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도 들지 않은 채. 어쨌든 나는 <로드>를 통해 ‘사람의 길’을 처음 발견했던 옛 책을 떠올릴 수도 있었고, 내가 그 길 위에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도 얻었다.
‘사람의 길’이란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로드>의 소년이 “아저씨는 불을 운반하세요?”라고 묻는 말을 대면하면 해석이 무의미해진다. ‘사람의 길’을 논하는 말과 글이 이 소년의 말 한마디에 사라져 버리는 느낌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떠나는 이야기
<로드> 또한 많은 비평가와 독자들이 분분한 해석을 내놓았다. 어떤 이는 ‘한 남자의 세상 방랑기’라고 했고, 어떤 이는 ‘지옥으로 가는 여정을 담은 또 하나의 단테의 <신곡>’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영혼의 여정을 다룬 소설’이라고 말했다.
그에 반해 저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떠나는 이야기’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머물러 있는 현재가 아늑한 사람에게 가혹한 형벌 같은 여정을 따라가는 일이 재미있을 수는 없다. ‘옛 세상의 기억을 간직한 생존자가 한편으론 그 기억을 견디고 한편으론 생존이라는 현실을 버텨야’ 하는 것에 감정이입이 된다는 자체가 끔찍한 경험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이 책을 만났을 때 읽을까 망설였다.
그러나 희망에 관한 책을 보면 절망에 대해 먼저 언급하는 대목을 만나듯, <로드> 또한 그러하다면 <로드> 속에서 주인공과 일행이 되는 것은 해볼 만한 모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간 중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했지만, 책 속에서 나는 잊고 있었던 내가 걷고 싶어 했던 ‘사람의 사람다운 길’을 떠올리고는 빛과 어둠을 분간하기 힘든 ‘잿빛 현재’에서 두 눈을 부릅떠보는 옛 경험을 다시 해보기도 했다.
그들과 힘겹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여정이었지만 결국 책 속 소년과 나는 희망을 만날 수 있었다. 가뭄 끝 단비가 달콤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힘겨운 여정 속의 남자와 어린 아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법 또한 엿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사는 게 안 좋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나는 그래도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우린 아직 여기 있잖아.”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좋아요
0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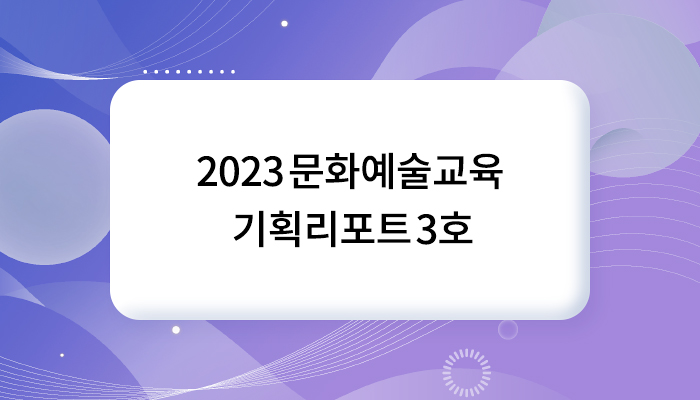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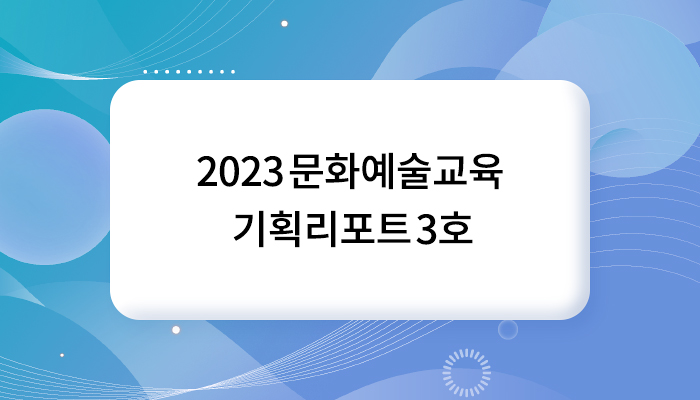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