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작가로 만들어준 어린왕자와의 ‘행복한 동행’
 지난 8월초 저녁, 필자는 중국 내몽고의 후룬베이얼 초원을 걷고 있었다. 일망무제의 초원에는 비단 같은 풀과 그 들판을 건너가는 평온한 바람뿐이었다. 두어 번 화석처럼 보이는 낙타와 파도 같은 말떼가 지나갔지만, 그것은 잠시 스쳐가는 풍경일 뿐이었다.
지난 8월초 저녁, 필자는 중국 내몽고의 후룬베이얼 초원을 걷고 있었다. 일망무제의 초원에는 비단 같은 풀과 그 들판을 건너가는 평온한 바람뿐이었다. 두어 번 화석처럼 보이는 낙타와 파도 같은 말떼가 지나갔지만, 그것은 잠시 스쳐가는 풍경일 뿐이었다.
거대한 포유동물의 등허리 같은 언덕에 올라섰을 때 누군가 손가락을 펴며 소리쳤다.
“강이다!”
바람 따라 이리 눕고 저리 일어서는 풀밭 너머로 설핏 은빛 띠가 보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빛을 향해 겅중겅중 달려갔다. 강은 ‘초원의 틈’에서 수줍은 듯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물을 먹으러 내려왔던 말과 양들이 남긴 발자국이 강가에 어지러웠다. 나도 모르게 두 손을 강물에 담갔다. 생각보다 물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이 강은 대초원의 어디에서 흘러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물길을 굽어보며 잠시 상념에 젖어들 찰라, 뒤쪽에서 나뭇잎이 밟히는 듯한 소리가 났다. 왜, 그 순간 낙타나 양이 아니라 어린왕자가 생각났는지 모르겠다. ‘샛노란 머리와 머플러를 바람에 날리며 그가 서 있다면 참 멋있겠다’라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풀과 장난치는 바람뿐이었다. 혹시나 해서 강가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굽어봤지만, 역시 밀밭을 연상시키는 어린왕자의 머리는 보이지 않았다.
까까머리 때 <샘터>에서 처음 만난 어린왕자
사실, 불쑥불쑥 어린왕자를 떠올리는 버릇은 어제오늘 생긴 게 아니다. 10대 이후 그를 여러 번 만난 뒤부터, 낯선 곳에 가기만 하면 그를 찾아 두리번거리게 된다.
어린왕자를 처음 만난 것은 까까머리 때였다. 가난한 농가에 한 달에 한 번 ‘이야기 덩어리’가 들어오는 날이 있었다. 우체부가 월간 <샘터>를 내려놓고 가는 날이었다. 시골 중학생에게 <샘터>의 글들은 아랫목처럼 따뜻하고 찐 감자처럼 구수하게 다가왔다. 책이 귀하던 시절이라, 늘 표지부터 맨 뒷장 ‘발행인의 편지’까지 꼼꼼히 읽곤 했었다. 그날도 표지부터 찬찬히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한 쪽짜리 ‘책속의 명언’인가 ‘한줄 명언’인가 하는 지면이 눈에 들어왔다.
그날도 표지부터 찬찬히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한 쪽짜리 ‘책속의 명언’인가 ‘한줄 명언’인가 하는 지면이 눈에 들어왔다.
–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도무지 묻지 않는다. 어른들은 ‘그 친구의 목소리가 어떠냐? 무슨 장난을 좋아하느냐? 나비를 수집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나이가 몇이냐? 형제가 몇이냐? 몸무게가 얼마냐? 그 애 아버지가 얼마나 버느냐?’ 하는 것이 어른들이 묻는 말이다. 그 대답을 듣고서야 친구를 아는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틀에는 제라늄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아름다운 붉은 벽돌집을 보았다…’라고 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하지 못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다’고 해야, 그들은 ‘참으로 훌륭하구나’ 하고 감탄한다. -생텍쥐베리의 어린왕자에서-
생텍쥐베리라는 작가가 누구인지 <어린왕자>가 어떤 작품인지 전혀 몰랐지만, 이상하리만치 이 글이 뇌리 깊숙이 들어와 앉았다. 어쩌면 ‘제라늄’이라는 정체불명의 꽃과 ‘프랑’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화폐 단위 때문에 더 눈여겨봤는지도 모른다. 며칠 뒤, 어렵사리 <어린왕자>를 구해 읽어볼 수 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가 소혹성 B612에서 온 한 아이와 알쏭달쏭한 대화를 나누는 동화. 사실, 그 당시에는 내용보다 그림에 더 끌렸다. 바오밥나무가 세 그루 서 있는 별이나, 하루에 마흔 세 번이나 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별이 궁금하기는 했지만 그뿐이었다. 어린왕자는 그렇게 달빛처럼 찾아왔다가 시나브로 잊혀져갔다.
 삶의 지혜 전하는 문장과 얘기로 가득한 작품그
삶의 지혜 전하는 문장과 얘기로 가득한 작품그
를 다시 만난 것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였다. 10여 년 뒤, 나는 운 좋게 월간 <샘터>의 기자가 되었다. 입사를 하고 보니 더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이 같은 팀 부장이지 않은가. 그의 지시를 받아가며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들의 삶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내 책장에 꽂힌 책들을 읽으며 또다른 세상과 인생 그리고 사랑에 서서히 눈뜨게 되었다.
어린왕자를 다시 만난 것은 기자가 된 지 4년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정채봉 선생이 부서 술자리에서 불쑥 <어린왕자>를 읽어 보았느냐고 물었다.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다고 하자, 그는 다시 한 번 읽어보라고 권했다. 그리고는 “놀랍고 완벽한 작품이다. 한 문장 한 문장에 깃든 의미를 찾아보라”고 덧붙였다. 그의 뛰어난 글쓰기 비결이 거기에 있다고 믿고 나니 머뭇거릴 틈이 없었다.
서둘러 다시 읽어보니 정말 각장마다(<어린왕자>는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삶의 지혜를 전하는 문장과 얘기들이 즐비했다. 나이를 먹고 개안한 탓도 있겠지만, 주옥같은 대사나 이야기들은 곱씹을수록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듯했다. 예컨대 등장인물(동물)들이 내뱉는 이런 문장들 말이다.
“얼굴이 시뻘건 신사는 더하기밖에는 아무것도 한일이 없어. 그리고 온종일 ‘나는 바쁜 사람이다!’ 하고 되풀이하지. …그렇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야.” “나비를 보려면 벌레 두세 마리쯤은 견뎌내야 해.” “허영장이에게는 칭찬밖에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법이다.”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 그리워할 거야. 내게는 네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되고, 네게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될 거야.” “…잘 보려면 마음으로만 보아야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이후 상상력이 부재하다는 느낌이 들면 <어린왕자>를 뒤척거리곤 했다. 때로는 어린왕자를 변주해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기도 했다. 정선생이 동화를 써보라고 권유했을 때 쉽게 응할 수 있었던 것도 <어린왕자> 덕이었다. 내 손으로 직접 <어린왕자> 같은 작품을 쓰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난 아직 어린왕자 같은 멋진 주인공을 창조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 꼭 그가 내 안으로 걸어 들어오리라 믿는다. 그래서 오늘도 그의 지혜로운 말과 아름다운 모습을 잊지 않으려 <어린왕자>를 뒤적인다.
댓글 남기기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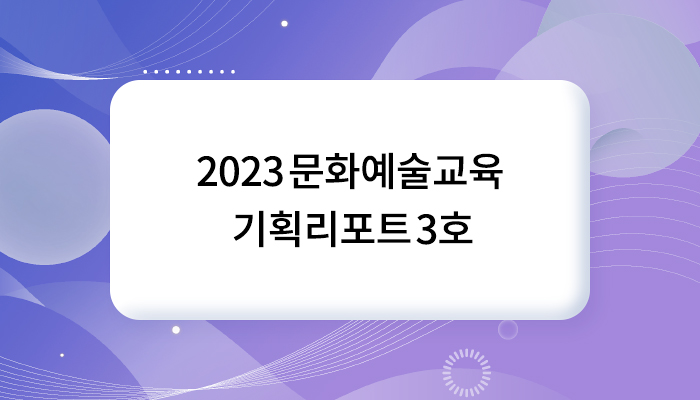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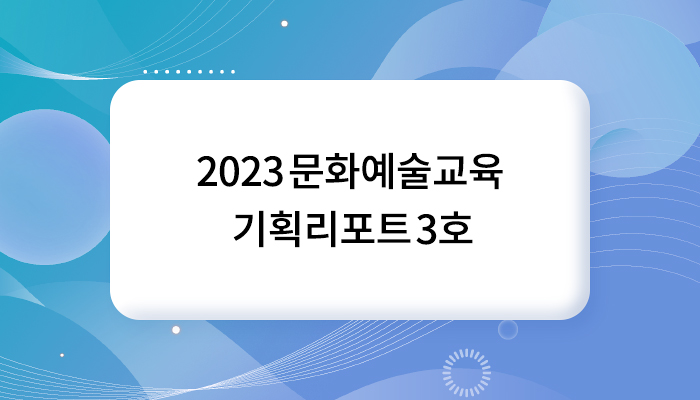



주저않고 열쇠고리를 고르던 때가 생각납니다.
지금도 자취방 문을 열고 잠글 때마다 손 아래서 찰랑찰랑 어린왕자가 흔들립니다. 왔냐? 가냐?……근데 어디?하면서.
그런데 작가님의 글을 읽고나니 문득 히까리가 생각납니다. 잘 지내고 있겠죠? 히까리말입니다.
몇 해전 경기도의 한 식물원에 갔더니 바오밥나무가 있더라구요. 그 옆에는 어린왕자 상도 있습니다. 어린왕자는 초등학교 이후로 이따금씩 읽곤 하는데 그때마다 생텍쥐베리가 이야기를 풀어 놓는 솜씨에 감탄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