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예술교육, 베를린필 단원이 꼭 나와야할까?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중 더블베이스 연주자 에딕슨 루이즈는 1975년 베네수엘라 정부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엘 시스테마’ 를 통해 음악을 처음 접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외국의 경우 학교의 수업 시간에 이미 악기 연주 등 실제 삶에서 즐길 수 있는 예술 교육이 먼저 이뤄지는 반면 한국은 저소득층의 음악 ‘신동’을 발견하려는 데 차이가 있다.

세계의 오케스트라 중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지키는 베를린 필하모닉. 그 오케스트라의 맨 뒷줄에는 눈에 띄는 청년이 있다. 더블베이스를 연주하는 24세의 에딕슨 루이즈(Edicson Ruiz). 짙은 갈색 곱슬머리에 마른 체구로 악기를 껴안고 연주한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출신으로 6년 전 이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됐다. 최연소 입단 기록이었다. 세계 음악계의 심장부에 서있는 이 청년은 10년 전 빈민가의 소년이었다. 지난해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루이즈는 “마약과 무기 밀매상이 들끓던 도시에서 평생 살아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얼굴도 보기 전에 집을 떠났다.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돕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처음으로 악기를 잡은 것은 9살 때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1975년 시작한 ‘엘 시스테마’의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전국에 125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악기를 쥐어줬다. 총과 마약 대신이었다. 루이즈는 이때 오케스트라를 시작해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 사이먼 래틀의 눈에 띄었다.
한국의 엘 시스테마를 꿈꾸다베네수엘라의 경제학자이자 국회의원을 지냈던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70) 박사는 ‘엘 시스테마’의 창시자로 불린다. 지난해 한국을 찾아 강연한 그는 한 오케스트라에 주목했다. 부산의 보육원인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다. 1979년 시작한 이 오케스트라 역시 지휘자 정명훈,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등의 연주자와 협력하면서 보육원에 음악의 꿈을 키우고 있다. 아브레우 박사는 “이들을 베네수엘라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의 변화를 점쳐볼 수 있는 제의였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예술 교육에 관한 해외의 움직임은 이처럼 국내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SK그룹은 2007년 ‘해피뮤직스쿨’을 시작했다. 전국 초중고 학생에게 악기를 배우는 기회를 준다. 이는 미국 줄리아드 음대가 뉴욕시의 아프리카, 라틴계 등 소수 민족과 빈민 가정의 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MAP'(The Music Advancement Program)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최근 현대기아차는 ‘아트드림 음악콩쿠르’를 열어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중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뽑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음악영재아카데미’를 시작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들의 성과를 볼 수 있는 성적표가 있을까? 이 중 한 프로그램에서는 “예술계 중고등학교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의 가시적인 결실이 이어졌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세계적인 예술가를 키운다’거나 ‘숨겨진 영재를 발굴한다’는 등의 모토도 일반적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예술교육이 빠지기에 가장 쉬운 함정이 여기다. 현재 국내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전문 예술인 양성에 맞춰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유명 강사에게 레슨을 받기 위한 음악 전공 학생들의 ‘편법’ 등록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예술계 중고등학교의 입시를 노린 이들이었다.즐기는 예술 교육이 아닌 음악 신동 발견에 치중시야를 좁혀, 현재 한국의 학생들은 음악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부터 돌아볼 문제다. 학생들은 음악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전공을 하거나, 혹은 대학 입시와 상관없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다. 저소득층 예술교육 역시 이 구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문제는 ‘즐기는 예술’이다. 외국의 경우 학교의 수업 시간에 이미 악기 연주 등 실제 삶에서 즐길 수 있는 예술 교육이 먼저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능이 발견되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예술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 공적·사적 부문 모두 한국과 차이가 있다. 현재 한국의 저소득층 예술교육은 이 두문을 개선하지 않은 채 응급처치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시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로 돌아가보자.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는 이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스타다. 전국의 오케스트라에서 잘 하는 아이들을 뽑아 만든 ‘전국 올스타’ 오케스트라라고 보면 된다. 지난해 12월 이 오케스트라가 한국에서 연주했을 때, 청중은 충격에 빠졌다. 단원 수는 보통 오케스트라의 두 배였다. 연주 스타일 또한 정통의 해석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남미의 들뜬 듯한 에너지가 폭발하는 듯했고, 흥분과 격정이 무대를 채웠다. 만일 ‘콩쿠르’에 나갔다면 탈락했을 연주다. 하지만 청중을 자극한 것은 ‘즐거움’이었다. 그간의 점잖았던 음악계를 비웃듯, ‘음악은 즐기는 것’이라는 명제를 남기며 이들의 음악은 무대를 천방지축 누볐다. 콩쿠르를 열고 오디션을 치러서 저소득층의 음악 ‘신동’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음악 교육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것과 연계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계적 음악가, 베를린 필하모닉에 입단하는 단원 한 명이 나오는 것보다 수천명의 학생들이 삶에서 음악을 좋아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낫다는 뜻이다.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십만 명의 베네수엘라 청소년들이 해답의 열쇠를 준다. 이들은 전문 음악가로 활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음악을 연주하고 즐기는 방법을 배웠다는 사실 만으로, 지역 사회의 변화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을 지를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사가 좋았다면 눌러주세요!
좋아요
0댓글 남기기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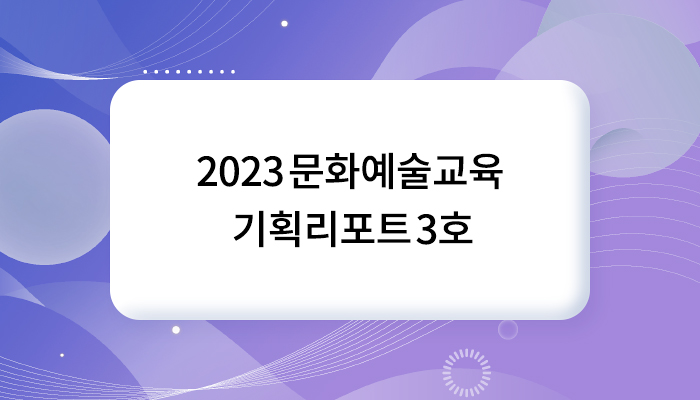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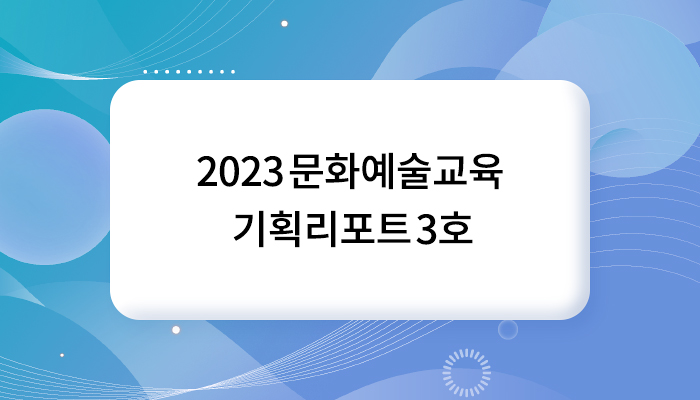



즐기는 예술교육이란 말이 와닿네요.
감동적입니다~저소득층에대한 지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것 같아요
작년 12월 예술의전당 공연때, 무대를 꽉 채운 단원들이 기억나네요! 풍부한 소리와 에너지에 정말 흥분됐었는데!!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음악이 결국은 신동으로 탄생하는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에 음악의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행복을 주는 의미에서 더 크고 중요한 지원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중학교 때 학교 숙제로 우연히 관람하게 된 작은 한 지역 오케스트라의 무대에도 큰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는 한 사람의 경험과, 더불어 창의성-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데에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 교육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교직에 있는 저로서도 항상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전 실력이 안되서 제 힘 닿는데까지 예술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 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만이라도 주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명의 아이라도 그로 인해 평생좀 더 행복해 질 수 있다면
엘 시스테마에 대해 듣고는 한국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다른방향으로 세어나가지 않고 정직한 방향으로, 즐거움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장한나씨 인터뷰에서도 어릴적부터 첼로연주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음악에 빠져들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네요. 부모님도 연주를 잘하기보다는 딸이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독려했다고 하구요. 많은 사람이 음악을 즐기고, 그 중에 숨겨진 천재적 재능을 발견해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100% 동감입니다. 이 세상이 신동으로 가득 넘쳐날 이유는 없죠^^
음악은 느끼고 즐기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모두 훌륭한 연주자가 될 필요는 없겠지요.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도 소수를 위한 영재교육으로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음악교육을 확대하다 보면 신동은 저절로나타날 것 같은데요…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잘 전달해주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공부로 다가서는 음악이 아닌, 생활안에서의 음악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엘리트 교육만이 답은 아니지요…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동감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이 영재교육, 신동교육만을 의미하는게 아닌데 말이죠…
현직교사로 엘리트 교육은 문제가 있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엘리트 교육은 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겠지만, 평생교육, 사회교육은 개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해답을 학교교육에서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감이요.. 아직도 학교뿐만 아니라 외딴섬마을,도서지역에는 문화예술을 젹셔보지 못한 청소년이 많습니다.
경쟁속에서의 음악이 아니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되겠지요
우리사회는 너무 경쟁을 부축이고 또 조장하고 있는데 음악을 통해서라도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고 느긋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것이 어른들 몫이겠죠
이런 다양한 문화생활 기회가 생기면 좋은것 같아요
공감가는 이야기네요. 예술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즐길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굳이 음악만이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한국의 교육이 그러하죠 어디 고등학교 진학 대학교진학 취업률…이는 단순히 음악에만 치중된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