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있었던 변화들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술가의 말년의 작품, ‘말년의 양식(Late Style)’을 통해서 나이 듦에 따른 예술가의 삶에 대한 양식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정수경 미술이론학자와 함께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3부작에서 드러나는 양식의 변화를 통해 인생과 예술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생각을 들여다봅니다.
연말이다. ‘末’이라는 말에는 묘한 정서를 자아내는 힘이 있다. 연말, 세기말, 인류 종말, 그리고 말년의 양식. 이런 말들을 들으면 왠지 조금은 쓸쓸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된다. 지난 일 년을, 그리고 지나간 인생 전체를.
에드워드 사이드는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에서 여러 예술가들의 말년의 양식을 성찰했다. ‘말년의 양식’을 따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나이 듦이 누군가의 예술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봄을 뜻할 것이다. 나이 듦에 따른 양식의 변화를 그 누구보다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미술가로 나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를 꼽고 싶다. 그의 전반적인 양식 변화를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다만 그의 <피에타> 3부작에서 드러나는 양식의 변화를 통해 인생에 대한, 또 예술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생각의 편린을 살짝 들여다보려는 것일 뿐이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1498년 약관 스물셋의 나이에 만든 로마 성 베드로성당의 <피에타>가 가장 유명하지만, 원석이 유난스레 까다로워 천하의 미켈란젤로가 몇 차례나 끌을 미끄러뜨렸다는 전설이 남아 있는 1547~1555년 작 피렌체대성당의 <피에타>, 그리고 죽기 4일 전까지 제작하다가 미완으로 남겼다는 밀라노 스포르체스코성의 <론다니니 피에타>도 그에 못지않게 유명하다.
우선 ‘피에타’pieta라는 제목에서 시작해보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시신을 안고 슬퍼하는 마리아를 형상화한 기독교 미술의 작품 유형을 가리키기도 하는 이 말의 뜻은 ‘슬픔’, ‘비탄’이다. 수많은 미술가들이 피에타를 만들었고, 각각의 피에타는 나름의 방식으로 슬픔을 형상화하면서 슬픔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드러낸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3부작에서 보이는 양식의 변화 또한 단순한 양식의 변화를 넘어, 슬픔에 대한 그의 생각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는 그 어떤 흠결도 찾을 수 없으리만치 완벽한 조형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정삼각형에 근접하는 구도는 안정적이며, 예수의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자세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이다. 두 무릎과 한 팔만으로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을 편안히 받쳐 안고 있으며,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 있는 왼손은 이 작품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당장 승천해도 좋을 느낌. 대리석의 육중한 느낌은 탁월한 세부 묘사와 부드러운 곡선, 예수 시신의 탄력 있는 양감으로 인해 지워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표정이다. 지극한 평정의 느낌. 자식을 잃은 단장의 슬픔은 경건하고도 굳센 믿음에 의해 승화되어, 더 이상 마리아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듯하다. 슬픔은 마리아도, 미켈란젤로도, 관람객도 사로잡지 않는다. 모두를 사로잡는 것은 경건하고 벅찬 감동, 숭고의 느낌이다.
그에 비해 피렌체대성당의 <피에타>는 보는 첫 순간부터 그것이 성 베드로성당의 <피에타>를 만든 바로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운 현격한 차이들을 드러낸다. 혹자는 이 작품을 미완성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완성, 미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양식의 변화다. 먼저 전작의 안정적인 수평적 구도가 이 작품에 와서는 불안정한 수직적 구조로 변화했다. 가장 눈을 잡아끄는 것은 예수의 시신이다. 그저 잠든 사람처럼 보였던 전작의 탄력 있고 부드러운 예수의 몸이 이 작품에서는 무척이나 경직된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뒤틀리고 꺾인 몸은 장정 한 사람을 포함한 세 사람이 떠받치고도 감당을 못해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다. 하늘 대신 바닥을 향한 하강의 느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의 고통의 무게감이 극대화되어 있다. 역대 그 어떤 피에타가 이처럼 탈승화되어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쳤을까. 흥미로운 것은 예수의 시신을 떠받치고 있는 중심인물이 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이다. 통상 니고데모라고 알려진 예수 뒤의 남성의 얼굴은 미켈란젤로 자신의 것이다. 예수의 지극한 고통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자화상. 칠순을 넘긴 그 무렵, 미켈란젤로는 삶의 고통과 무게감에 압도당해 있었던 것일까?
아흔에 이른 노거장이 죽기 직전까지 붙들고 있던 작품이 <론다니니 피에타>라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당신이 다가온 죽음을 직감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못한 그것이 필생의 주제 아닐까? 더욱 수직적으로 변한 구도에, 예수의 다리 역시 여전히 꺾여있다. 피렌체 <피에타>와 <론다니니 피에타>에서 예수는 신성이 아니라 고통 받는 인간성을 표상하는 듯하다. 예수의, 인간의 고통은 여전하지만, 기묘하게도 이 작품은 전작에 비해 한결 편안한 느낌, 위로의 느낌을 전한다. 어찌된 일일까? 작품의 병렬적 구조 때문인 듯하다. 전작의 구도가 3인이 예수의 시신을 힘겹게 겨우겨우 받치고 있는 양상이었다면, 이 작품의 구도는 나란히 선 뒤의 인물이 예수를 따뜻하게 끌어안고 보듬는 형상이다. 인간의 실존은 고통, 슬픔이지만, 그것에 허덕이는 대신 품에 안고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란 뜻일까?
성 베드로 성당 <피에타>의 영롱한 아름다움보다도, 피렌체 대성당 <피에타>의 가슴 치는 비탄보다도 밀라노 <론다니니 피에타>의 덤덤함이 마음을 더 울리는 까닭은 삶을 바라보는 그 말년의 눈길 때문 아닐까. 그러나 피렌체 대성당의 <피에타>가 아니었다면, <론다니니 피에타>의 울림은 절반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름다움은 작품의 조형에서 보는 이의 마음속으로 옮겨 앉았다. 이 연말, 지난 한 해의 다사다난도 그렇게 덤덤히 품어지면 참 좋겠다.

글쓴이_ 정수경 (미술이론학자)
서울대학교 미학과에서 미학과 미술이론을 전공했다. 우리의 삶에서 미술이 무엇이었고, 무엇이며, 또 무엇이면 좋을지에 대해 미술현장과 이론을 오가며 고민하고 있으며, 고민의 결과를 글과 강의로 풀어내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동시대 미술에 관심이 많으며, 최근에는 국내의 젊은 작가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댓글 남기기
비밀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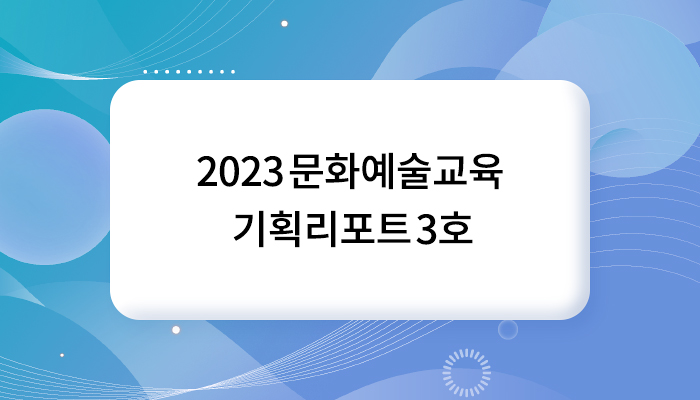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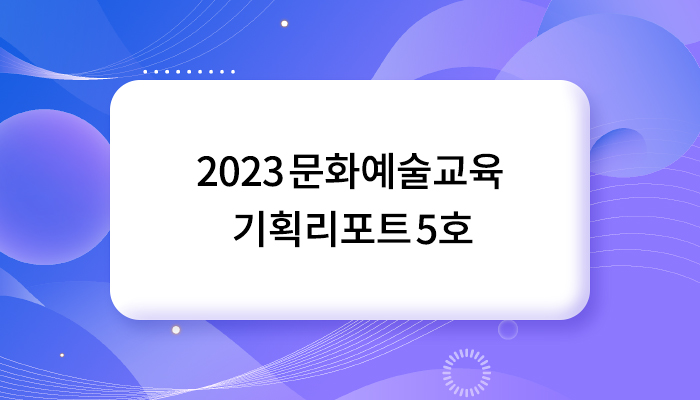



피에타 영화가 나왔다는것만 알았지. 의미는 이제사 알았습니다:) 웬지 단어자체는 세련되고 예쁜 느낌이라 그런 뜻일줄 알았는데, 슬픔 ,비탄의 의미였군요.
저는 성 베드로 성당의 를 통해 아름다움과 평화로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술작품은 만든이의 삶, 시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를 통해 미켈란젤로라는 예술가를 다시 볼 수 있었던 것 같구요 ^^